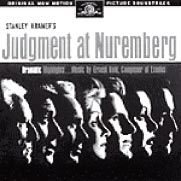
1960년에 만들어진 영화 ‘뉘른베르크 재판’(사진)은 법정영화의 진수라고 할 정도로 쌍방간의 치열한 논리적 공방과 심리묘사를 탁월하게 묘사했다는 평을 받는 작품이다. 피고인 22명 중 12명에 대한 사형선고를 얻어낸 재판 결과는 원고인 연합국 측의 승리였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영화는 승리가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불법적 침략전쟁에다 수백만명의 유대인 학살 등 너무도 명백해 보이는 나치의 과오에 대한 심판이니만큼 원고 측의 일방적 단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애초의 예상이었다. 그러나 ‘절차적 적법성’을 내세워 자신들 행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피고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두려움과 무기력 속에 흐트러지려는 피고 측의 전열을 정비하고 강력한 통솔력을 발휘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헤르만 괴링이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굳은 신념을 뛰어난 화술로 역설하면서 재판 초반부를 압도했다. 재판이 아니라 나치의 정치선전장이 된 듯한 분위기였다. 재판이 벌어진 장소가 뉘른베르크라는 점도 아이로니컬한 대목이다.
뉘른베르크는 나치들에겐 ‘정치적 고향’과도 같은 곳. 나치가 자신들의 존재를 세계에 본격적으로 알린 1934년 전당대회의 개최지가 바로 뉘른베르크다. 다큐멘터리 영화의 명장인 레니 리펜슈탈의 ‘의지의 승리’라는 작품은 바로 이 전당대회를 현란한 화면에 담은 것이었다. 괴링의 강변은 처음에는 제대로 준비 안 된 원고 측을 당황케 했으나 사진 등 자료들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전세는 역전된다. 결국 괴링은 사형선고를 받지만 사형집행 전 스스로 청산가리를 먹고 목숨을 끊음으로써 재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한다.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것은 차라리 쉽다. 그러나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 또 책임을 묻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유대인 학살이라는 인류사의 만행만으로 결과가 뻔한 것으로 예측된 재판에서도 어느 한쪽이 완승을 거두지는 못했음을 영화는 얘기하고 있다. 영화 ‘뉘른베르크 재판’이 걸작이 된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같은 복합적인 시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피고 측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조직의 명령을 따른 행위에 한 인간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나치의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독일의 법관들을 변호할 때는 “그렇다면 나치의 군비 증강과 이웃나라 침공을 묵인한 연합국들도 공범이 아니냐”고 반박한다. 변호사 역을 맡은 배우 막시밀리언 셀은 공교롭게도 독일 출신 배우였다. 그가 이 역으로 이듬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것은 열연하기도 했지만, 성찰적 질문자라는 역 자체의 덕도 많이 봤던 듯하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거냐?” 후세인을 재판정에 세운 이들은 이 ‘이유 있는 항변’에 제대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을까.
이명재/ 자유기고가 minho1627@korne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