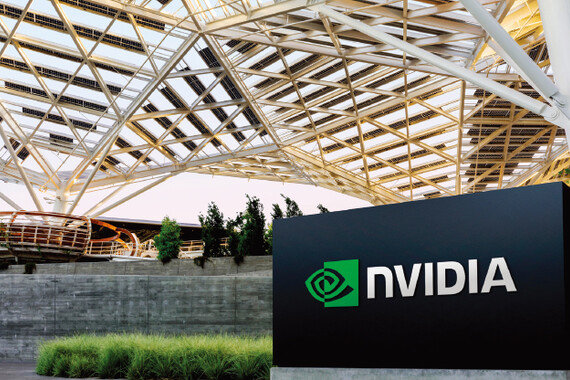“인류 역사에서 맥주, 와인, 증류주, 커피, 차, 코카콜라 등 여섯 가지 음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것은 문명을 발전시킨 촉매제였고, 찬란한 문화와 더불어 지구촌의 갈증을 씻어준 마법의 물이었다.
후끈 달아오른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는 한 잔의 맥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은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최초로 등장한 맥주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초기 문명의 중요 자원이었다. 맥주는 신에게 바치는 성스러운 물인 동시에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급료로도 지불됐다.
와인은 또 어떤가. 와인의 인기는 요즘도 좀처럼 식지 않는다.
와인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원동력이었다. 모든 포도는 로마로 통했다. 로마 귀족들은 가장 좋은 1등급 와인은 자신과 친구들이 나누어 먹고, 2등급 와인은 손님에게 제공했으며, 3등급 와인은 이전에 노예 신분이었다가 자유로운 상태가 된 예속 평민에게 나눠주었다고 한다.
로마제국의 영향력이 미쳤던 지역에는 식사 중에 와인을 마시는 풍습이 강하게 남아 있다. 와인의 주요 생산지이자 소비국인 남부 유럽이 그런 곳이다. 북부 유럽에서는 와인을 음식과 함께 마시지 않으며, 맥주가 훨씬 일반적이다. 로마인들은 맥주를 마시는 국가를 야만족이 사는 영역으로 간주했다.
브랜디나 럼, 위스키 같은 증류주는 증류된 와인을 삼킨 뒤 목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감각을 뜻하는 ‘불타는 물’로 불렀다. 1300년대 증류주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음료 이외에도 신체 감염 부위의 외상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사람들은 알코올 성분을 많이 함유한 증류주가 젊음을 유지해주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문명퇴치와 언어장애, 마비 증세를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역병까지 막아줄 수 있다고 믿었다. 브랜디는 오랜 시간 항해하는 선원들의 친구이자 애인이었다. 종종 노예들과 교환되는 물품으로, 노예무역을 부추기는 역할도 담당했다.
커피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탁월한 각성제인 커피는 이성의 시대를 대표한다. 애초에 예멘에서 종교의식에 사용된 커피는 이후 아랍세계로 퍼져나간 뒤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다. 커피는 알코올 음료에 대한 대안음료로, 주로 지식인과 비즈니스맨들이 선호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됐다.
이 새로운 음료는 그것이 소비되는 방법적인 면에서도 가히 혁명적이었다. 커피만큼이나 대화가 오고 가는 커피하우스의 등장이 그것. 커피하우스는 사교적, 지적, 상업적, 그리고 정치적인 교류 장소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냈다.
중국인들이 처음 마시기 시작한 차는 영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18세기 대영제국의 해외정책을 쥐고 흔들었다. 또한 코카콜라는 세계화의 상징으로서 20세기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간편하게 자판기에서 뽑아 마실 수 있는 커피와 시원한 맥주 한 잔에는 단순히 알코올이나 카페인 성분만 녹아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인류의 역사와 문명이 담겨 있다.
톰 스탠디지 지음/ 차재호 옮김/ 세종서적 펴냄/ 372쪽/ 1만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