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산촌유학</B><BR>고쿠분 히로코 지음/ 손성애 옮김/ 이후 펴냄/ 280쪽/ 1만2000원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일본의 산촌유학은 이미 1976년 시작된 것으로 3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한다. 유학생, 즉 초중고생 아이들은 1년 이상 농어촌과 산촌에 머물며 생활하게 된다. 자신이 사는 농가의 아저씨, 아주머니를 “엄마, 아빠”라 부르고 함께 유학 온 친구들과 농가의 자녀들은 “형제, 자매”가 된다. 학교에 가기 위해 초등학생은 4km, 중학생은 8km나 되는 험한 산길을 걸어야 한다. 직접 농사도 짓는다. 버섯 재배와 벌목 체험, 토끼몰이도 한다. 심지어 사냥 후 요리를 해먹기도 한다. 겨울에는 상상도 못할 폭설과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인내를 배운다.
친부모와의 이별, 갑작스런 단체생활, 칼날 같은 추위 속에서 외아들, 외딸로 사랑만 받고 자라온 아이들은 어려움을 맞기도 한다. 하지만 사계절의 섬세한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마을 곳곳을 탐험하며 각종 나무의 열매가 숨어 있는 비밀 장소를 찾아내는 등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재미를 발견하게 된다. 겨울엔 스키와 눈썰매, 얼음낚시가 이들을 맞이한다.
이 모든 것이 도시에서는 하려고 하지도, 할 수도 없는 일들이다. 신경을 쓰고 일부러 봐야 계절의 변화를 눈치 챌 수 있는 도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저자가 “엄마의 지나친 욕심”이라는 비판과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아이를 유학 보낸 이유일 것이다. 산촌유학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시 속에서 에너지를 마음껏 소비하지 못하고,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나 저자 역시 엄마가 아닌가. 아이를 떠나보낸 직후 걱정이 앞선다. 아이가 울었다는 편지가 온다. 따돌림을 당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폭설이 내릴 때마다 산촌유학 보낸 것을 후회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저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다. 아이는 어느 곳에서나 적응을 잘하건만 부모는 언제나 걱정부터 앞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이는 매년 “1년만 더 있고 싶다”고 말했고, 엄마의 “제발 와달라”는 부탁을 듣고서야 3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도시로 돌아온다.
산촌유학은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의 장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곳은 부모를 위한 반성의 장이자 배움의 터다.
방학을 맞아 잠시 도시에 돌아온 아이의 모습은 이전과 전혀 다르다. 식사 후 스스로 그릇을 치우고, 말하지 않아도 기상 후 이불을 정리한다. 컴퓨터 게임만이 낙이고 자기 책가방도 들기 싫어 엄마에게 미루던 아이가 버스 정류장 2~3개는 아무렇지도 않게 걸을 줄 알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자신만이 잘난 줄 알던 아이는 따돌림도 당해보고, 또 화해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며 보살피는 마음을 배우게 된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됐다.
사실 변화한 아이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이다. 하지만 형제 자매가 없는 아이들, 자연을 체험할 기회가 없는 아이들은 이기적으로 자라기 쉽고, 계속 부모에게 의지하려 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기 쉽다.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아이들의 발랄한 변화에 웃으면서도 반성이 됐다. “집안일을 돕지 말라” 하고, 등·하굣길은 부모가 차로 데려다주는 등 아이들을 귀하게만 키우려 한 것은 바로 부모들이 아닌가? 또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모든 것을 해주는 대신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양육한 것도 부모들이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원하는 아이의 모습과는 정반대 모습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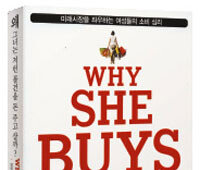















![[영상] 새벽 5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헬멧 쓴 출근 근로자 8열 종대로 500m](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b1/2f/08/69b12f0800eaa0a0a0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