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2년 11월24일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박찬종 전 대통령 후보.
“내년 선거에 꼭 출마하세요.”
박 전 의원의 얼굴에 작은 웃음이 번졌다. 측근이 말을 보탰다.
“가는 곳마다 그런 인사를 듣습니다.”
그가 여전히 국민의 마음 한구석에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박찬종은 한국 정치사의 ‘원조’ 잠룡이다. 바바리코트를 휘날리며 뛰어든 1992년 대선에서 그는 150만 표를 얻는 대박을 터뜨렸다. 이로 인해 그는 3김을 뛰어넘을 대표주자로 각인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96년 말 한나라당에 가입한 뒤에도 인기(?)는 식을 줄 몰랐다.
측근들 광화문에 사무실 내고 대외활동 요청
그러나 이것이 독약이었다. 자신감이 넘쳐서 당내에서는 독불장군이란 비판이 비등했다. 그래도 그는 자기 길을 갔다. 그런 그를 현역들이 멀리했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도 부담스러워했다. 그 결과 당내 경선에서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주저앉았다. 박 전 의원은 후일 “조직(당)이 자신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조직’을 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까.
측근은 “지금처럼 오픈 프라이머리나 인터넷이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세력이 없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로 국민경선과 인터넷을 통해 대권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정치에 대한 박 전 의원의 열정은 1997년을 기점으로 하강곡선을 그렸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후배 잠룡들이 그가 걸었던 길을 더듬고 있다. 그들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거론하고 인터넷 선거를 준비한다. 이를 지켜보는 박 전 의원의 심정은 어떨까. 잃어버린 10년, 사라져버린 대권의 꿈에 대한 회한은 없을까.
두 병이 넘는 ‘청하’를 비울 때쯤 넌지시 의중을 물었다.
“활동을 재개할 생각은…?”
“지금 내가 무슨….”
“후배 잠룡들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는 부탁에도 손사래를 쳤다. ‘자기 몫’이 아니라는 투다.
그런 그가 가끔씩 열정을 토로했다. 정치 현실과 외교 현안에 대한 그의 지적은 대단히 날카로웠다.
“나라가 걱정이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드물어.”
현실 정치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다. 정치를 떠난 박 전 의원의 일상은 한가로운 듯하다. 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복스럽게 생긴 손주 사진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그다.
그런 박 전 의원의 주변에서 요즘 작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측근들이 광화문에 사무실을 내고 나라를 개조하는 국민개혁운동본부를 구성하자는 요청을 해왔기 때문이다. 조만간 무슨 일이든 할 것 같은 분위기지만, 박 전 의원은 듣고만 있을 뿐 말이 없다.
장강(長江)의 앞물은 뒷물에 의해 밀려난다. 밀려난 물은 밀어낸 물을 탓하지 않는다. 그저 유유히 흘러갈 뿐이다. 박 전 의원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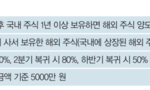












![[영상] 멸종위기 야생 독수리에게 밥을… <br>파주 ‘독수리 식당’](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5c/75/cc/695c75cc0d36a0a0a0a.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