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은 다 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원칙 가운데 하나가 ‘자기 소신이 강하고 대안제시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중용한다’라는 사실을. 6월1일 정책임명장을 받은 윤대희 대통령 경제정책수석비서관은 전형적으로 이런 기준에 따라 발탁된 인물로 평가된다.
재정경제부 출신인 그는 참여정부 초기에 열린우리당의 경제전문위원을 지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정통 관료답지 않게 사고가 대단히 유연했다”고 기억한다. 그 뒤 대통령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입성한 그는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는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응한 국내 산업의 분야별 대책을 총괄한 것도 그였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해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내는 게 ‘윤대희 스타일’.
윤 수석은 적극적이다. 그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서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챙겨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인이 아닌 경제관료가 이런 발언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의 적극성은 때때로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진다. 지난해 4월의 일이다. 한 언론이 ‘작은 정부론 무색’이란 기사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참여정부가 알고 보니 큰 정부를 흉내내고 있다”며 비판했다. 윤 수석은 즉각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기사는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왜곡보도”라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10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각 언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례 한국경제보고서를 다루면서 ‘한국이 선진국 되기도 전에 주저앉는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 윤 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보고서 원문을 아무리 훑어봐도 그런 표현을 찾을 수 없었다”며 언론과의 갈등을 마다하지 않았다.
집권 후반기 윤 수석이 맡아야 할 소임은 ‘양극화 극복 및 동반 성장 전략의 중단 없는 추진’이다. 그의 소임에 따라 참여정부 후반기 어젠다의 성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건은 너무 어려워 보인다. 지방선거 참패로 열린우리당은 개혁과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할 동력을 잃었고, 그 여파가 청와대로 날아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언론은 벌써부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일대 변화가 올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그의 뒤에 노 대통령이 있다지만, 과거처럼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듯 하다. 그가 이 난관을 뚫고 일관된 경제정책을 밀고 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제물포고, 서울대 졸. 재경부 국민생활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 행정고시 17회.
재정경제부 출신인 그는 참여정부 초기에 열린우리당의 경제전문위원을 지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정통 관료답지 않게 사고가 대단히 유연했다”고 기억한다. 그 뒤 대통령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입성한 그는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는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응한 국내 산업의 분야별 대책을 총괄한 것도 그였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해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내는 게 ‘윤대희 스타일’.
윤 수석은 적극적이다. 그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서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챙겨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인이 아닌 경제관료가 이런 발언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의 적극성은 때때로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진다. 지난해 4월의 일이다. 한 언론이 ‘작은 정부론 무색’이란 기사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참여정부가 알고 보니 큰 정부를 흉내내고 있다”며 비판했다. 윤 수석은 즉각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기사는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왜곡보도”라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10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각 언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례 한국경제보고서를 다루면서 ‘한국이 선진국 되기도 전에 주저앉는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 윤 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보고서 원문을 아무리 훑어봐도 그런 표현을 찾을 수 없었다”며 언론과의 갈등을 마다하지 않았다.
집권 후반기 윤 수석이 맡아야 할 소임은 ‘양극화 극복 및 동반 성장 전략의 중단 없는 추진’이다. 그의 소임에 따라 참여정부 후반기 어젠다의 성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건은 너무 어려워 보인다. 지방선거 참패로 열린우리당은 개혁과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할 동력을 잃었고, 그 여파가 청와대로 날아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언론은 벌써부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일대 변화가 올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그의 뒤에 노 대통령이 있다지만, 과거처럼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듯 하다. 그가 이 난관을 뚫고 일관된 경제정책을 밀고 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제물포고, 서울대 졸. 재경부 국민생활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 행정고시 17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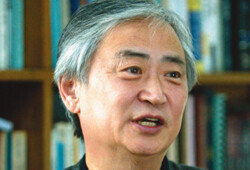













![[영상] ‘자연의 맛’ 간직한 사찰 음식, MZ 기자가 만들어봤어요](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82/99/38/698299380ae5a0a0a0a.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