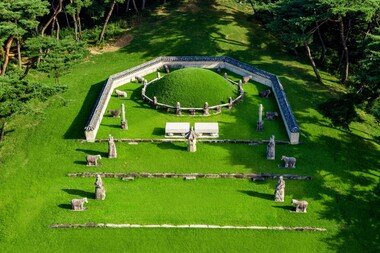미래의 컴퓨터는 어떻게 진화할까? 학생들은 이런저런 답변을 내놓는다. 그러나 여간해서는 바뀌지 않는 답변 중 한 가지는, 컴퓨터는 항상 책상 위에 놓여 있거나 들고 다녀야 하는 물건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답변은 자신의 사고 폭이 좁다는 것을 광고하는 일밖에 안 된다. 학생들은 컴퓨터에 대한 기존 고정관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답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책상 위의 컴퓨터에서 옷처럼 ‘입는’ 컴퓨터로 생각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다음 글은 ‘입는 컴퓨터’의 미래상을 묘사하고 있다.
컴퓨터가 인간의 상태를 스스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훗날 이런 컴퓨터가 등장하면 의사와 환자의 관계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지 모른다. 즉,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던 방식에서 반대로 의사가 환자를 부르는 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식의 발상에서 창의성은 태어난다.
학생들도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바꿔보겠다는 과감성이 필요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바뀌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사물의 기능은 사회 변화의 요구에 의해, 그리고 사회 변화를 위해 항상 바뀌어왔다.
 예컨대 사람의 다리는 걷는 기능을 수행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 말에 반박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답은 재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여자의 다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능을 한다고. 누구나 아름다운 다리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는 자동차가 인간의 걷는 기능을 상당 부분 대신하게 됨으로써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개방성에 따라 변화된 인간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사람의 다리는 걷는 기능을 수행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 말에 반박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답은 재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여자의 다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능을 한다고. 누구나 아름다운 다리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는 자동차가 인간의 걷는 기능을 상당 부분 대신하게 됨으로써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개방성에 따라 변화된 인간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옷의 전통적인 기능은 신체를 보호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답변 또한 너무나 진부하다. 차라리 ‘벗기 위해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옷에 대한 역발상적 접근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설명도 덧붙일 수 있지 않겠는가.
모 제약회사는 그동안 상식처럼 돼 있던 ‘알약으로 먹는 비타민제’를 ‘마시는 비타민제’로 발상을 바꾼 제품을 내놓아 큰 성공을 거뒀다. 여기서 우리는 ‘비타민제는 알약’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린 창의적 발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주목을 받는 제품의 개발이나 기발한 마케팅 전략의 뒤에는 항상 창의적인 역발상이 자리 잡고 있는 예가 허다하다.
미래의 TV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단순히 TV의 기능이 확대된다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먼저 시청자라는 말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시청자라는 말은 기존 개념을 규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TV에서 시청자는 간접적인 출연자가 된다’고 대답하면 어떨까? 월드컵 경기를 시청할 때 일부 관중이 멀티비전에 등장하는 것이 한 가지 예가 될 것이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진보하면, 안방의 시청자가 동시에 간접적인 출연자가 되는 TV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찌 됐든 TV가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창의성인 것이다.
논술 답안 쓰기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관점에 새로운 발상을 덧붙일 때 참신하고 독창적인 사고를 얻을 수 있다. 설령 논리는 조금 치밀하지 못해도 독창성이 뛰어난 답안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명심해야 한다.
|
컴퓨터가 인간의 상태를 스스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훗날 이런 컴퓨터가 등장하면 의사와 환자의 관계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지 모른다. 즉,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던 방식에서 반대로 의사가 환자를 부르는 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식의 발상에서 창의성은 태어난다.
학생들도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바꿔보겠다는 과감성이 필요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바뀌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사물의 기능은 사회 변화의 요구에 의해, 그리고 사회 변화를 위해 항상 바뀌어왔다.

옷의 전통적인 기능은 신체를 보호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답변 또한 너무나 진부하다. 차라리 ‘벗기 위해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옷에 대한 역발상적 접근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설명도 덧붙일 수 있지 않겠는가.
모 제약회사는 그동안 상식처럼 돼 있던 ‘알약으로 먹는 비타민제’를 ‘마시는 비타민제’로 발상을 바꾼 제품을 내놓아 큰 성공을 거뒀다. 여기서 우리는 ‘비타민제는 알약’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린 창의적 발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주목을 받는 제품의 개발이나 기발한 마케팅 전략의 뒤에는 항상 창의적인 역발상이 자리 잡고 있는 예가 허다하다.
미래의 TV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단순히 TV의 기능이 확대된다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먼저 시청자라는 말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시청자라는 말은 기존 개념을 규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TV에서 시청자는 간접적인 출연자가 된다’고 대답하면 어떨까? 월드컵 경기를 시청할 때 일부 관중이 멀티비전에 등장하는 것이 한 가지 예가 될 것이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진보하면, 안방의 시청자가 동시에 간접적인 출연자가 되는 TV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찌 됐든 TV가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창의성인 것이다.
논술 답안 쓰기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관점에 새로운 발상을 덧붙일 때 참신하고 독창적인 사고를 얻을 수 있다. 설령 논리는 조금 치밀하지 못해도 독창성이 뛰어난 답안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