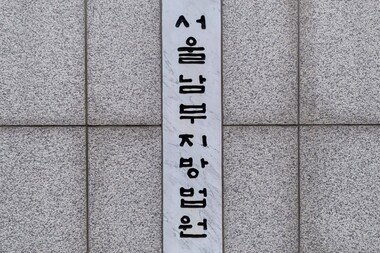1950년대 영국 프리 시네마 태동기에 영화를 시작해 이제 일흔을 바라보는 이 노감독은 언제나 노동자의 편에서 노동자를 다룬 영화를 찍어왔고, 사회적 리얼리즘을 미학적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는 보기 드문 사람이다. 그의 명성이 만개한 것은 90년대 들어서다. 북아일랜드 문제를 논쟁적으로 다룬 ‘숨겨진 비망록’, 대처리즘의 결과를 그린 ‘리프 래프’, 영국의 사회복지 제도를 비판한 ‘레이디버드, 레이디버드’, 딸에게 성찬식용 드레스를 사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난한 노동자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 ‘레이닝 스톤’은 모두 세계 영화계의 상찬을 받으며 켄 로치를 세계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거의 유일한’ 감독으로 인식시켰다.

켄 로치가 생애 처음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만든 영화 ‘빵과 장미’는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가난한 라틴계 불법 이민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이들의 노동운동사를 다룬다. 로스앤젤레스 인구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면서도 경제적 지위는 가장 낮은 라틴계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청소부, 가정부 등 허드레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초저임금에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들이 낯선 땅에서 겪는 고단한 현실과 힘겨운 싸움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도심 빌딩숲 어느 구석의 먼지 나는 쓰레기더미 속에서, 내일의 행복을 위해 눈물을 훔치는 우리 주변인들의 그늘진 모습으로 생생하게 살아 있다.
여기에 관객을 웃기다 또 울리기도 하는 흡인력 있는 내러티브와 친근하게 다가오는 캐릭터들이 풍성한 사실감을 전달하면서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게 한다. 가난한 불법 이민자 신분의 빌딩 청소부들이 마침내 화이트칼라의 파티장을 급습하고, 가두 시위를 벌이면서 “우리는 빵만이 아니라, 장미도 원한다”고 외칠 때 우리에게도 이들 못지않은 아픈 현실이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된다. 이 땅에도 학대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 그들은 ‘장미’는커녕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의 이민자들보다 더 힘겨운 삶을 견뎌내고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