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냉장고를 바꿨다. 시집갈 때 혼수로 바꾸겠다고 매년 미루다가 반짝거리는 뭔가가 박힌 와인 색의 냉장고를 들여놨다. 계속 “내년에, 내년에” 하다가는 평생 못 바꿀 수 있겠다 싶기도 했지만 진짜 이유는 더 넓은 자석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야 매번 식구가 늘어나는 그 녀석들을 함께 옹기종기 붙여놓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렇다. 이번 주 별★걸 다 모으는 여행의 주인공은 마그네틱이다. 유치하다고? 없어 보인다고? 그런 것쯤 나도 모은다고? 맞다. 마그네틱은 기념품계 ‘만인의 연인’이다. 세계 어디를 여행해도 웬만한 곳에서는 마그네틱을 발견할 수 있다. 게다가 값도 ‘착해서’ 마음 가는 대로 부담 없이 집을 수 있다.
특히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해야 할 때, 마그네틱만한 해결사가 없다. 열쇠고리와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열쇠고리를 사다 주면 “차라리 마그네틱을 사다 주지”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지만, 반대의 경우는 열에 아홉은 그런 반응을 들을 일이 없다.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적다는 말씀.
마그네틱을 모으는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함에 있다.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붙여놓기만 하면 뿌듯함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뭔가를 모을 때는 스크랩을 하거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파일을 정리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마그네틱은 ‘산다’와 ‘붙인다’ 이 두 가지 작업이면 끝이다.
게다가 다른 컬렉션은 계속 모아둬야 할 공간이 필요하지만 마그네틱은 따로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자석이 있는 벽, 그러니까 냉장고 옆이나 컴퓨터 본체, 사무실 파티션에 예쁘게 ‘톡’ 자리만 잡아주면 되는 것이다.
냉장고 자석과 그 나라의 관광산업을 연결한다는 것이 억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돌아본 경험으로 보면 마그네틱은 관광산업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여행이 발달한 도시일수록 마그네틱이 다양하다.
대표적인 곳이 라스베이거스. 그곳에 가면 마그네틱만 파는 숍들이 즐비하다. 게다가 보통 기념품 숍도 한쪽 벽면은 마그네틱으로 채워놓을 만큼 여러 종류의 마그네틱을 자랑한다.
대부분 마그네틱은 나라나 도시, 각 관광지를 표현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그 지역의 특산품 이미지를 안고 있다. 기억에 남는 마그네틱 중 하나는 과테말라에서 산 ‘치킨버스’ 마그네틱이다. 과테말라의 버스는 항상 만원이어서 사람들이 ‘치킨버스’라 부르는데, 이 마그네틱은 그러한 분위기를 잘 살려주고 있다. 버스 지붕 위에는 각종 물건들이 쌓여 있고, 버스에는 큰 커피 포대가 달려 있다.
여행 발달한 도시일수록 다양한 제품 … 한 국가 관광산업 척도
이스터 섬에서 산 석상 마그네틱도 아끼는 마그네틱 중 하나다. 이스터에 갔을 때 석상들을 보면서 애잔한 마음이 들어 하나쯤 집에 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쳤던 것이 이스터 섬 석상을 형상화한 마그네틱이었다. 재질도 다르고 느낌도 상이하지만, 해가 떠오를 무렵 하늘이 까만색에서 오렌지 색으로 변하면서 비장하게 드러나는 이스터 섬의 그 추억과 아련함을 떠오르게 해준다.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산 아랍어가 적힌 마그네틱도 특별하다. 지금은 스페인 사람들이 그라나다에 자리잡고 있지만 732년부터 1492년까지는 이슬람 문명이 이 지역을 지배했다. 그라나다에는 지금도 이슬람의 향취가 배어 있다. 그라나다에서 만난 그 마그네틱은 꽤 의외였다. 이슬람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독특한 글씨와 기하학 무늬.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는 오히려 그런 기념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가 한글을 가지고 기념품을 만들지 않은 것처럼, 현재 이슬람 문화권에 사는 이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마그네틱으로 만들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올 가을 여행했던 이탈리아에서 사온 마그네틱 속에는 까만색 수탉이 한가운데 박혀 있었다. 이탈리아 와인의 수도라 불리는 키안티 지역에서 산 것인데 까만색 수탉이 그 지역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유래가 재미있는데, 그 이야기는 피렌체와 시에나가 도시국가였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화를 사랑하는 이 두 나라는 아침에 닭이 먼저 우는 나라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전투를 하기로 했다. 이 싸움에서 시에나는 닭을 잘 먹이면 잘 울 것이라고 생각한 데 반해, 피렌체는 닭을 굶기면 배가 고파서 일찍 일어나 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과는 키안티 땅이 있는 피렌체의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그때부터 키안티의 상징적인 문장으로 쓰인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알고 까만 수탉이 그려진 마그네틱을 사는 맛은 좀 다르다.
유독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마그네틱도 있다. 바로 터키에서 사온 세라믹 마그네틱이다. 알록달록한 색으로 이뤄진 세라믹 마그네틱은 부모님이 엄지손가락을 올리시는 마그네틱이다. 작은 접시 안에 꽃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문양과 다양한 컬러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만하다. 친구들에게 반응이 가장 좋았던 마그네틱은 호주에서 사온 코알라, 캥거루가 들어 있는 표지판 마그네틱과 모로코에서 산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올 법한 뾰족한 신발이었다.
이쯤 해서 ‘그 많은 마그네틱을 다 모으냐’는 질문이 나올 법도 하다. 그렇지는 않다. 만약 그러려면 냉장고 두 대는 더 놔야 할지도 모른다. 일반적인 마그네틱은 따로 모으지 않는다. 반드시 그곳의 냄새가 풍겨야 한다.
한 가지 더. 꼭 마그네틱을 사 모으는 곳이 있다. 살짝 귀띔해준다면, 그곳은 박물관과 미술관이다. 웬만한 미술관에서는 대표 작품들을 가지고 마그네틱을 만들어놓는다. 멕시코의 프리다 칼로, 마드리드의 프라다 박물관, 바르셀로나의 미로 박물관 등에서 가지고 온 마그네틱들은 지금도 나의 냉장고 위에서 하나의 ‘예술작품’군을 이루며 뽐내고 있다.
그렇다. 이번 주 별★걸 다 모으는 여행의 주인공은 마그네틱이다. 유치하다고? 없어 보인다고? 그런 것쯤 나도 모은다고? 맞다. 마그네틱은 기념품계 ‘만인의 연인’이다. 세계 어디를 여행해도 웬만한 곳에서는 마그네틱을 발견할 수 있다. 게다가 값도 ‘착해서’ 마음 가는 대로 부담 없이 집을 수 있다.
특히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해야 할 때, 마그네틱만한 해결사가 없다. 열쇠고리와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열쇠고리를 사다 주면 “차라리 마그네틱을 사다 주지”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지만, 반대의 경우는 열에 아홉은 그런 반응을 들을 일이 없다.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적다는 말씀.
마그네틱을 모으는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함에 있다.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붙여놓기만 하면 뿌듯함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뭔가를 모을 때는 스크랩을 하거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파일을 정리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마그네틱은 ‘산다’와 ‘붙인다’ 이 두 가지 작업이면 끝이다.
게다가 다른 컬렉션은 계속 모아둬야 할 공간이 필요하지만 마그네틱은 따로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자석이 있는 벽, 그러니까 냉장고 옆이나 컴퓨터 본체, 사무실 파티션에 예쁘게 ‘톡’ 자리만 잡아주면 되는 것이다.
냉장고 자석과 그 나라의 관광산업을 연결한다는 것이 억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돌아본 경험으로 보면 마그네틱은 관광산업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여행이 발달한 도시일수록 마그네틱이 다양하다.
대표적인 곳이 라스베이거스. 그곳에 가면 마그네틱만 파는 숍들이 즐비하다. 게다가 보통 기념품 숍도 한쪽 벽면은 마그네틱으로 채워놓을 만큼 여러 종류의 마그네틱을 자랑한다.
대부분 마그네틱은 나라나 도시, 각 관광지를 표현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그 지역의 특산품 이미지를 안고 있다. 기억에 남는 마그네틱 중 하나는 과테말라에서 산 ‘치킨버스’ 마그네틱이다. 과테말라의 버스는 항상 만원이어서 사람들이 ‘치킨버스’라 부르는데, 이 마그네틱은 그러한 분위기를 잘 살려주고 있다. 버스 지붕 위에는 각종 물건들이 쌓여 있고, 버스에는 큰 커피 포대가 달려 있다.
여행 발달한 도시일수록 다양한 제품 … 한 국가 관광산업 척도
이스터 섬에서 산 석상 마그네틱도 아끼는 마그네틱 중 하나다. 이스터에 갔을 때 석상들을 보면서 애잔한 마음이 들어 하나쯤 집에 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쳤던 것이 이스터 섬 석상을 형상화한 마그네틱이었다. 재질도 다르고 느낌도 상이하지만, 해가 떠오를 무렵 하늘이 까만색에서 오렌지 색으로 변하면서 비장하게 드러나는 이스터 섬의 그 추억과 아련함을 떠오르게 해준다.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산 아랍어가 적힌 마그네틱도 특별하다. 지금은 스페인 사람들이 그라나다에 자리잡고 있지만 732년부터 1492년까지는 이슬람 문명이 이 지역을 지배했다. 그라나다에는 지금도 이슬람의 향취가 배어 있다. 그라나다에서 만난 그 마그네틱은 꽤 의외였다. 이슬람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독특한 글씨와 기하학 무늬.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는 오히려 그런 기념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가 한글을 가지고 기념품을 만들지 않은 것처럼, 현재 이슬람 문화권에 사는 이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마그네틱으로 만들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올 가을 여행했던 이탈리아에서 사온 마그네틱 속에는 까만색 수탉이 한가운데 박혀 있었다. 이탈리아 와인의 수도라 불리는 키안티 지역에서 산 것인데 까만색 수탉이 그 지역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유래가 재미있는데, 그 이야기는 피렌체와 시에나가 도시국가였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화를 사랑하는 이 두 나라는 아침에 닭이 먼저 우는 나라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전투를 하기로 했다. 이 싸움에서 시에나는 닭을 잘 먹이면 잘 울 것이라고 생각한 데 반해, 피렌체는 닭을 굶기면 배가 고파서 일찍 일어나 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과는 키안티 땅이 있는 피렌체의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그때부터 키안티의 상징적인 문장으로 쓰인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알고 까만 수탉이 그려진 마그네틱을 사는 맛은 좀 다르다.
유독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마그네틱도 있다. 바로 터키에서 사온 세라믹 마그네틱이다. 알록달록한 색으로 이뤄진 세라믹 마그네틱은 부모님이 엄지손가락을 올리시는 마그네틱이다. 작은 접시 안에 꽃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문양과 다양한 컬러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만하다. 친구들에게 반응이 가장 좋았던 마그네틱은 호주에서 사온 코알라, 캥거루가 들어 있는 표지판 마그네틱과 모로코에서 산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올 법한 뾰족한 신발이었다.
이쯤 해서 ‘그 많은 마그네틱을 다 모으냐’는 질문이 나올 법도 하다. 그렇지는 않다. 만약 그러려면 냉장고 두 대는 더 놔야 할지도 모른다. 일반적인 마그네틱은 따로 모으지 않는다. 반드시 그곳의 냄새가 풍겨야 한다.
한 가지 더. 꼭 마그네틱을 사 모으는 곳이 있다. 살짝 귀띔해준다면, 그곳은 박물관과 미술관이다. 웬만한 미술관에서는 대표 작품들을 가지고 마그네틱을 만들어놓는다. 멕시코의 프리다 칼로, 마드리드의 프라다 박물관, 바르셀로나의 미로 박물관 등에서 가지고 온 마그네틱들은 지금도 나의 냉장고 위에서 하나의 ‘예술작품’군을 이루며 뽐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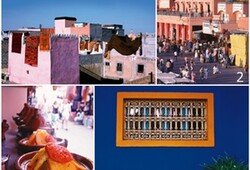















![[영상] 새벽 5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헬멧 쓴 출근 근로자 8열 종대로 500m](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b1/2f/08/69b12f0800eaa0a0a0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