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블레의 ‘팡타그뤼엘’과 ‘가르강튀아’에 나오는 그로테스크한 삽화.
풍자와 해학
대학가에 한창 탈춤이 유행할 때, 탈춤에는 지배계급인 양반에 대한 민중의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고 배웠다. 실제로 봉산탈춤에 말뚝이가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라며 양반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온다. 조선 후기의 민중들에게 자연발생적인 민중의식 같은 것은 있었을지 모르나, 그것이 문화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강조하던 계급의식의 수준이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런 의미의 계급의식은 실은 19세기의 구성물, 즉 진보사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과음한 여인이 구역질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프레스코화. 그녀 손에 들린 시든 꽃은 시련을 겪은 감정의 표시다.
샹플뢰리의 ‘풍자예술의 역사’는 이 희극 원현상을 찾아 아득한 고대로 돌아간다. 앞에서 ‘왕의 남자’ 얘기를 장황하게 한 것은 이 책의 잘못 번역된 제목 때문이다. 책의 원제는 ‘캐리커처의 역사’인데, 역자는 이를 ‘풍자의 역사’로 번역했다. 인물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묘사하는 캐리커처에 원래부터 그런 공격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캐리커처’가 왜곡과 과장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정치풍자나 사회풍자와 동의어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캐리커처는 사회학이 아니라 우주론에 속하는 현상이다.

도주하는 아이네이아스(1760년 그라냐노에서 발견된 프레스코). 아이네이아스는 안키세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난 트로이의 왕자다.
그리스인들은? 우리는 그들이 희극을 지었으며 그것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기까지 했음을 알고 있다. 가령 시학의 2부로 희극론을 쓴 아리스토텔레스를 생각해보라. 하지만 헤겔에 따르면 그리스 예술의 정신은 대리석 조각을 통해 드러나는 유기적인 ‘아름다움’에 있었다. 그런데 미적 범주의 표 속에서 ‘희극성’은 ‘추’에 가깝기에 그리스 조각에서도 희극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그 시기에도 인간을 우습게 묘사하는 파우손과 같은 고약한 풍자화가가 있었으나, 희극의 의의를 평가할 줄 알았던 아리스토텔레스도 파우손의 풍자정신은 몰취향으로 보고 적대감을 표출했다.
중세인들은? 우리는 성스러운 중세 성당의 한쪽 구석에 온갖 우스꽝스런 형상이 버젓이 조각되어 있음을 안다. 가령 므와삭의 생피에르 수도원의 기둥을 보고 성 베르나르가 늘어놓은 비난은 이미 미술사의 고전적 인용의 대상이 되었다. “수도원 경내에 형제의 눈앞에 또 그들이 경건히 독서하는 동안 이 어리석은 괴물들, 이 아름다운 왜곡이니 기형미의 극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여기를 보면 머리 하나에 몸뚱이가 여럿이 붙었소. 그런데 저기를 보면 몸통 하나에 머리가 여럿이오. 네발짐승이 뱀꼬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네발짐승의 머리가 물고기 머리 위에 붙어 있지를 않소.”
그로테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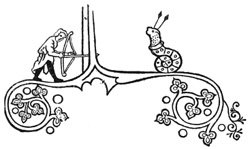
제국 도서관의 13세기 수사본에 수록된 드 바스타르의 데생.
저자는 이 기괴한 형상들에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는 당대의 ‘상징주의’ 미술사가들의 견해를 반박한다.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징주의적 해석은 성스러운 교회에 버젓이 자리 잡은 이 남우세스런 형상들에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 그것들을 신학과 화해시키려 한다. 가령 거대한 달팽이에 화살을 쏘는 사람의 형상이 “예수그리스도를 위해 맨 처음 죽은 자의 승리와 순교자의 상징”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신학적 편견에 불과하다. “석공들의 예술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그것은 무의식적이며 순진한 예술이고, 공중 앞에서 윗도리를 들어올리는 어린아이처럼 무구하다.”

생브누아쉬르루아르 수도원의 기둥머리 장식(11세기).
실레노스
저자의 혜안이 빛나는 것은 역시 구체적인 논증에서다. 당시 미술사학자들 사이에는 우리에게 소크라테스의 것으로 알려진 못생긴 얼굴이 실은 실레노스나 바쿠스의 상이라는 주장이 있었던 모양이다. 저자는 이 견해를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알키비아데스의 말을 들어 반박한다. “소크라테스는 입상들의 공방에 전시된 실레노스와 너무 닮았다.” 한마디로 조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소크라테스의 못생긴 얼굴은 실물의 초상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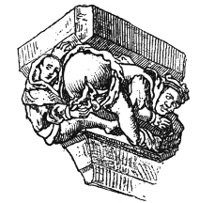
누아용 시청사의 기둥 장식(15세기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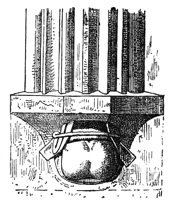
부르주 지하 대성당의 조각(유적 복원 책임 건축가 바이이가 알려준 데생의 모사화).
풍자의 윤리
기괴한 형상의 역사는 물론 고대와 중세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고대의 난쟁이 피그미족, 그릴레스, 키메라, 중세의 ‘악마’ ‘죽음의 무도’ ‘여우’에 이어 르네상스에도 온갖 기괴한 형상으로 가득 찬 히에로니무스 보슈의 그로테스크한 그림이 존재했다. 일찍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로테스크한 인물들의 스케치를 남긴 바 있다. 보는 이의 웃음을 자아내는 페터 브뤼겔의 풍속화도 빼놓을 수 없다. 문학에서는 그 유명한 에라스무스의 ‘광우예찬’, 당대의 베스트셀러였던 세바스찬 브란트의 ‘바보들의 배’가 있다.

블루아 성 창문의 홍예 밑.
“책보다는 그림, 인쇄보다는 회화에서 더 깊은 인상을 받는 특이한 기질의 사람”이라는 샹플뢰리. 그는 기괴한 형상들을 통해 민중의 숨결을 느껴보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캐리커처가 정치적 공격의 무기가 된 오늘날, 치열한 이미지 전쟁터 속에서 저자가 던지는 한마디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풍자화란 다수의 손에서는 비열하다. 그 쓴맛은 그것이 소수를 위해 싸울 때 제거된다.” 여기서 ‘소수’란 물론 실제로는 다수이나 늘 사회적 소수로 지내야 하는 민중이라는 이름의 난쟁이들을 가리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