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 시내버스 노동조합지부는 6월22일부터 7월3일까지 전면 파업했다. 파업기간 중 대전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조속한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노조원들.
오전 11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박성효 시장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전날 새벽 대전시내버스노동조합의 파업철회를 이끌어낸 데 대한 성과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대전시와 노조의 협상 결과는 시측의 ‘완승’이었다. 10.4% 임금인상을 요구하던 노조를 상대로 대전시는 최초 제시한 3% 인상안을 관철했다. 박 시장은 이를 대전시민의 승리로 돌렸다.
파업 11일 만에 3% 인상안 타결, 시측 완승
“불편을 참으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대전)시민들이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파업 과정에서 불편함을 참을 테니 (노조에) 밀리지 말라고 주문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뜻에 따른 결과입니다.”
실제 파업기간 중 대전시민의 모습은 과거와 크게 달랐다. 파업을 강행한 노조에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반대로 노조와 파업철회 협상을 벌이던 시에 대해서는 옹호론이 대세를 이뤘다.
대전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2001년에도 파업을 한 적이 있다. 시민들은 당시에도 파업으로 인한 불만이 컸지만, 이번처럼 노조에 일방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쏘지는 않았다. 오히려 고용자인 회사 측이나 조정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시측에 불만이 많았다. 사회적 약자였던 노조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시민들의 태도가 이처럼 급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하 서민이나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11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운행을 재개한 대전 시내버스가 도로 한가운데서 승객들을 태우고 있다. ‘친절’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시에서 제공해준 관광버스가 더 좋던데요. 깨끗하고 친절하지, 시내버스 다닐 때보다 (버스를) 조금 더 기다렸을 뿐 큰 불편은 없었어요. 원래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은 약자 편이에요. 그런데 운전사들은 없는 사람들을 볼모로 파업을 벌인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자가용 타고 다니지 버스 타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시 쪽에 그 사람들 월급 올려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준)공영제도도 폐지하고 버스업체끼리 경쟁을 붙여야 해요.”
신씨는 운전사들이 준공영제를 통해 시로부터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전시는 2005년 7월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버스회사에 대해 일정 수익과 운전사 인건비 등 각종 지출비용을 시 예산에서 100% 보장해주는 대신 회사의 재정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행사하기로 한 것.
이는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승강장 무정차 등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고치기 위한 방편이었다. 또한 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능한 한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교통시스템 개선을 위한 수단이었다.
덕분에 운전사들은 여러 혜택을 입었다. 고용을 보장받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수입금이나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운전하지 않아도 됐다. 예전엔 시내버스 회사들이 운전사 구하기가 힘들었지만, 요즘은 지원자들로 넘쳐나 자리가 없다.
신씨가 운전사들에게 더욱 반감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는 대전시가 공개한 운전기사들의 월급 액수 때문. 시는 파업 초기 7년차 운전사의 월급을 320만원으로 발표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시가 퇴직정산금과 4대 보험료 등 실제 받는 월급이 아닌 부분까지 부풀린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돌아선 민심을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신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세금 더 걷어야 하는데, 다 배불러서 그런 거지…”
“요즘 대전시내에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만큼 받았으며 됐지…. 나도 한 달 수입이라고 해봤자 200만원이 채 안 돼요.”
중앙시장에서 10년째 노점상을 하는 한 할머니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할머니에게 시내버스는 생계 수단이다. 파업기간 시에서 제공한 관광버스는 이 할머니에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큰 봇짐을 싣고 내리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았던 것. 하루 수입이 2만~3만원이라는 할머니는 버스요금이 앞으로 더 오를 게 걱정이었다.
“월급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하니까 요금도 올릴 것 아닌가. 버스운전사가 문제지.”

6월2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행복도시울산만들기시민협의회 회원들이 현대자동차 노조의 정치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직도 난폭운전이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 전 예쁜 유리컵을 샀는데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떨어뜨려 깨진 적이 있어요. 정말 속상했어요. 한번은 주말에 사복 입고 버스를 탔는데 잔돈을 안 거슬러주는 거예요. 학생이라고 했더니 ‘네가 학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면서 핀잔하더라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학생증 보여달라고 하면 될 걸.”
대전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은 이처럼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전시민이 보기엔 명분도 이유도 자격도 없는 파업이었던 셈이다. 시민들은 특히 이번 파업으로 그동안 몰랐던 준공영제에 대해 알게 됐고, 운전사의 임금인상을 세금인상으로 인식하면서 노조에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명분 없는 파업에 시민들이 반기를 든 경우는 비단 대전시뿐이 아니다. 울산시민들은 6월28일과 29일 양일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반대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 대해 거센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울산지역 시민사회와 경제단체 140개 단체로 결성된 ‘행복도시울산만들기시민협의회’(이하 행울협)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에 앞서 파업 반대시위를 벌였다.
시민들이 이처럼 현대차 노조에 등을 돌린 이유도 역시 명분 없는 파업이었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다. 또 노사관계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FTA 체결을 반대하기 위해 파업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노조 민심이반 모르고 남 탓으로만 돌려
최근 전국적으로 현대차 불매운동이 시작된 것도 울산시민들을 긴장시키는 이유다. 파업과 불매운동이 이어지면 울산지역의 경제침체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원칙을 요구하거나 노조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파업에 저항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연세대 황상민 교수(심리학)는 “노동계에서도 자인했듯 국내 노동운동은 명분을 잃고 대중성을 상실하면서 사실상 실패했다”고 전제하며, 노동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과거에는 노동자라면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요즘엔 노동운동을 한다면 대기업에 다니는, 선택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황 교수의 이야기다.
황 교수는 또 “시민의식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분명한데,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시민들이 어떤 원칙이나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에 더 민감해진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운동계는 어떤가. 민심이반의 원인을 분석하고 방향을 수정하기보다는 남 탓으로 돌리는 게 체질화되다시피 했다. 정부와 언론, 사측이 자신들의 순수한 가치와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항변하기도 한다. 울산 현대차 노조나 대전 시내버스 노조나 모두 마찬가지다.
현대차 노조는 행울협이 울산상공회의소, 6·25 참전용사회 등 보수단체와 경제단체가 주축이 돼 움직이고 시위 인원 동원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울산시민의 밑바닥 정서가 자신들에게 등 돌렸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 최근 현대차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가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대전 시내버스 노조 한 관계자는 “대전시가 발표한 월급액수는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왜곡한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왜곡된 정보에 속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과연 시민들이 노조에 등 돌린 이유가 그것뿐일까.
대전역 앞 중앙시장 입구 버스정류장에는 수많은 시내버스가 오가고, 수많은 시민이 타고 내린다. 7월5일 오후 5~6시, 20분 사이에 10여 대의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갔지만 승객을 배려해 인도변에 정차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었다. 버스들은 3차선 도로의 중간인 2차선에 잠깐 섰다가 출발하곤 했다. 그 버스를 쫓아 시민들은 도로 한복판을 뛰어다녔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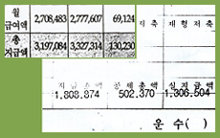
















![[영상] 새벽 5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헬멧 쓴 출근 근로자 8열 종대로 500m](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b1/2f/08/69b12f0800eaa0a0a0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