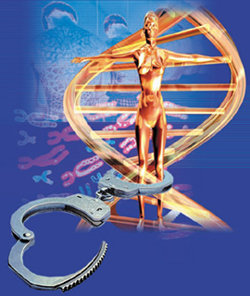
이 판결 이후 범죄 현장에 남겨진 유전자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범죄 현장의 유전자 증거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에 의뢰된 유전자 분석 건수는 2002년 1만2621건에서 2005년 3만1704건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영·미 유전자 정보 활용 후 범죄 해결률 쑥쑥
좀더 효율적인 유전자 증거 활용을 위해 빠르면 2007년 상반기에 강력범죄자에 대한 ‘유전자은행’이 설립될 예정이다.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조속한 범인 검거를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7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11개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범죄는 △살인 △방화·실화 △폭행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간·추행 △절도·강도 △성폭력 △마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 행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 범죄자들이다.
이들 범죄의 재범률은 매우 높은 편으로 범죄자에게 전과가 있는 비율은 살인범 63%, 강도범 65%, 방화범 70% 등이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송호림 경정은 “특히 성폭력범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70%로 가장 높다”며 “유전자은행은 성폭력범의 조속한 검거와 성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은행 도입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 영국은 1990년대 중반에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 자료는 실제 범죄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 영국에서는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범죄 해결률이 26%인 데 비해 유전자 정보를 활용할 경우 범죄 해결률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경찰대 박현호 교수는 “특히 차량침입절도의 경우 유전자 정보를 활용할 경우 범죄 해결률이 63%로, 활용하지 않았을 때의 8%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다”고 전했다.
강력범 유전자은행이 설립된다면 범죄자들의 유전자 정보는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될까? 우선 유전자 정보는 △수형자 △피의자 △범죄 현장 세 종류로 분류돼 수집된다. 수형자는 검찰이, 피의자와 범죄 현장은 경찰이 맡는다. 수형자는 의무적으로 유전자 시료 채취에 응해야 하며, 피의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발부에 의해 유전자 시료 채취가 실시된다. 면봉으로 입 안 점막을 떼어내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료 채취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법안은, 유전자 정보가 입력되고 나면 시료를 바로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채취한 유전자 시료는 국과수 법의학부 유전자분석과가 정보를 분석, 보관하게 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실에서 한 연구자가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 정보가 개인 식별에만 사용되지 않고 개인의 질병이나 신체적 특징 등의 정보를 노출시킬 위험성도 높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과수의 의견. 한면수 유전자분석과장은 “개개인마다 모양이 약간씩 다른 DNA 마커에 숫자를 부여하고, 그 숫자만을 유전자 정보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개인의 유전자적 특질을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배 논란
한편 범죄 현장에서나 유전자 분석 실험실에서 ‘유전자 오염사고’가 아주 드물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 감식요원이나 국과수 분석요원의 유전자가 섞여 들어가는 것. 이 같은 오염사고로 인한 오판을 막기 위해 국과수는 2004년 전국 600여 명의 경찰 감식요원과 30여 명의 국과수 분석요원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두었다. 한면수 과장은 “실험실에서 생길 수 있는 실수는 철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극복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도 강력범 유전자은행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피의자의 경우에도 유전자를 채취한다는 점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수형자만을 대상으로 유전자 정보를 구축할 경우 유전자은행이 실제 범죄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호림 경정은 “피의자 신분이 수형자 신분으로 바뀌는 경우는 30% 수준, 특히 성 범죄자의 경우는 18.9%에 불과하다”며 “벌금, 보석,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 단계에서의 유전자 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호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유전자 정보가 범죄자의 신체적 특질을 노출시킨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며 “유전자은행을 우려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사회 안전 추구를 위한 사법적 실험으로 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