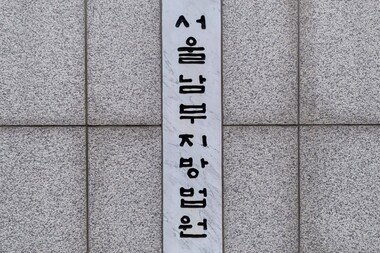국가산업단지(이하 산단)란 1960년대부터 공업 생산기반과 경제성장 거점 확보를 위한 중화학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규모 산업단지.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함께 본격적으로 건설된 전국 25개 국가산단은 그 계획 수립과 설치, 관리와 환경 감시권을 중앙 정부가 갖고 있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 정책은 본격 개발 30년을 넘기면서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잇따라 발생하는 환경·산업 재해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심하고 물도 못 마신다”

1967년 당시 의욕적인 중화학공업 육성계획과 함께 호남정유가 들어서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여수산단의 옛 이름은 여천공단. 1998년 여천시·군이 여수시로 통합·흡수되면서 개명됐다. LG-Caltex, 남해화학 등 85개사가 입주해 1만27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국내 최대 화학공업단지다.

쉴새없이 터지는 사고도 피할 수 없는 위협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씨프린스호·사파이어호 기름유출 사고 등 이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환경재해만 줄잡아 10여건. 공단 가동 30년을 넘기면서 노후시설의 폭발사고도 줄을 잇고 있다. 70년대 7건에 불과한 폭발사고가 90년대 103건으로 14배 이상 증가했고 이로 인한 직접 피해자만도 200명을 넘어섰다.

조씨에 따르면 임금이 높은 입주업체 직원들은 대부분 외지 사람 인데 비해 지역 주민들은 시설관리나 정비 등을 맡는 저임금의 하청업체에 고용된다. 당연히 안전사고 희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직원들일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한 해 여수산단에서 일어난 3건의 폭발사고 사상자 7명 중 5명이 하청업체 소속 지역 주민이었다.
여수에서 200여km 떨어진 울산국가산업단지도 사정은 비슷하다. 1962년 유공이 입주하면서 개발이 시작된 울산산단에는 6개 권역에 걸쳐 700개 이상의 제조업체들이 매년 250만톤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고 하루 82만톤의 하수를 배출하고 있다.

울산산단의 안전문제에 적신호를 보이는 가장 큰 요소는 곳곳에 깔린 낡은 배관들. 한 기술직 간부는 배관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60~70년대 개발 초기 건설된 공장들은 배관을 대충 파묻고 제대로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한 군데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불길이 관로를 타고 공단 전체로 번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전체 고압가스 배관 447.53km 가운데 40% 가량이 부식 상태여서 가스누설 사고 위험이 심각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국가산단이 아닌 지역의 공업시설 설치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수적인 데 반해, 산단의 경우 국가가 전권을 갖고 있어 지자체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환경관련 단속권 역시 지자체 환경부서가 아닌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이 담당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서주원 사무처장은 “산단에 대해 지역 주민의 발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대 류석환 교수(생명화학부)는 “10여명 내외의 지방환경청 출장소 단속 인원이 여러 개의 산단을 함께 감독하는 현 체제에서는 효율적인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매연이나 악취 등의 오염사고가 발생해도 단속 인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잦다는 것. 환경부 규제가 월평균, 연평균 수치를 기준 삼아 개별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장이 밀집한 산단의 경우 지역별 총량 규제도 어렵다.
국가산단 입주 기업은 환경규제에서도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울산의 경우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존(O3)경보제 등 대기오염 경보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택시가 공단지역을 벗어나 공항에 가까워지자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린다. 어느새 코끝을 맴돌던 시큼한 화학약품 냄새가 한결 가셨다. “그래도 오늘은 괜찮은 편이에요. 그 정도 갖고는 냄새 난다고도 말 못합니다.” 택시 기사의 말이다.
“옛날에는 공장 굴뚝을 보며 흐뭇해했다지만 요새는 어디 그런가요?” 울산에서 나고 자랐다는 기사는 “이 도시를 사랑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