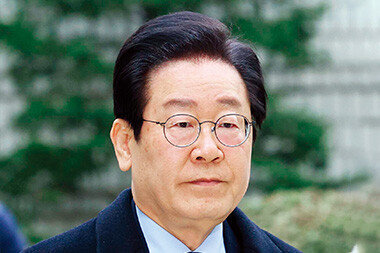열린우리당 정동영, 김근태 두 전·현직 의장이 1월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열린 한 정치 행사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2006년 8월6일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면전에서 이른바 ‘외부 선장론’을 언급했다.
10월1일 독일에서 귀국하는 정동영 전 의장은 김 의장에 비해선 노 대통령과 그리 부딪친 적이 없다. 장관 재직 때나 장관 직에서 물러나 당으로 복귀했을 때 노 대통령은 정 전 의장에게 ‘프리핸드’를 줬다는 게 정치권 주변의 대체적인 얘기다. 정 전 의장은 이해찬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 때도 이 전 총리의 교체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정 전 의장이 ‘의기투합’한 사이라고 보긴 힘들며 단지 정치적으로 동거(同居)하는 사이라는 게 정치권 주변의 대체적인 얘기다. 이처럼 노 대통령과 이들 두 사람 간에는 성격이 좀 다르긴 해도 ‘정서적 간극’이 존재한다. 이는 두 사람이 장차 노 대통령과 이별하는 데 부담이 없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지지율이 5%를 밑도는 두 사람의 앞날은 어둡다. 김 의장은 의장 취임 후 ‘뉴딜정책’ 등 친(親)기업적 행보를 보이며 당과 자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지지율은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지율 반등 없인 대선 조연 불 보듯
정 전 의장은 한때 지지율 10%를 넘긴 적도 있지만 5·31 지방선거 후 바닥을 헤매고 있다. 양 진영은 “열린우리당 간판으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는 진단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 노 대통령의 어두운 그림자를 확실하게 걷어낼 방법이 무엇인지가 해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계개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김 의장이 “12월 초가 되면 한나라당의 수구보수대연합에 대응하는 민주개혁대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정계개편의 필요성을 공개 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참모는 “내년 2월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2개월 동안 독일에 체류한 정 전 의장이 귀국하기로 한 이유도 국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원외’라는 핸디캡을 가진 정 전 의장의 경우엔 귀국하더라도 국정감사 기간인 데다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행동반경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외국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낼 수도 없는 처지다.
두 사람은 현재의 대권 구도를 깨야만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당내에서 기득권을 유지한 채 외부 인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공정 경선을 치르겠다고 해봤자 국민적 호응을 얻기 힘들다. 현재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두 사람은 지지율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내년 대선 국면에서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
당내에선 이미 친노직계 세력이 정계개편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는 중이다. 자칫 이들에게 기선을 제압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둘 다 그런 상상은 하기도 싫은 듯하다. 두 사람 중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선수를 치고 나올지가 범여권 내에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