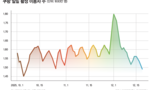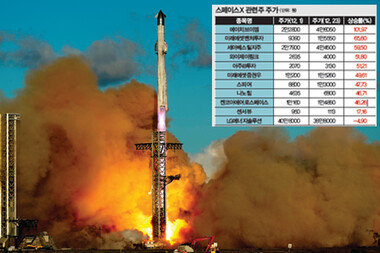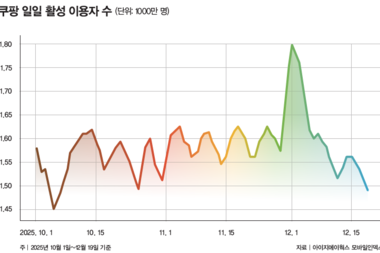615호 ‘주간동아’를 구하려고 여러 서점을 전전했다. 엄청난 기사 때문에 절판이라도 됐나 궁금했다. 궁금증은 책을 손에 쥐고서야 풀렸다. ‘비행기값 건지는 해외쇼핑 완벽 가이드’라는 별책부록이 특별했다. 이 부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을 것이다. 소비망국이라고 한탄하는 분은 ‘주목! 대선 3대 변수’라는 기사에 만족했을 것이다. 한 방이면 날아간다는 후보가 수십 방에도 건재하다 보니 다른 변수를 만들고 싶었나 보다. 연령, 지역, 이념의 기준은 정말 더 이상 깜도 안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심심해서 다시 꺼내본 것 같다. 여론조사, 대선을 걱정하는 이야기, 통계적으로 한번 풀어본 내용은 사족이지만 깔끔한 마무리였다.
보여줄 것 없는 대선의 백미는 이미지 전쟁이다. ‘유권자의 감성’을 자극하거나 유권자의 마음을 잡고 싶은 광고에 대한 분석은 흥미로웠다. 단지, 이런 광고 이미지가 국민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즉 이미지 수용자에 대한 반응도 함께 실렸다면 답답한 대선판의 청량제 구실을 하는 기사가 됐을 것이다.
‘거대 공룡 농협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기사는 이번 호의 핵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 천하지소본(天下之小本)으로 변한 이유를 여실히 보여줬다. 망쳐먹은 인간들이 줄줄이 있을 때 그 동네가 망하는 것은 천하의 이치다. 농업이 망할지, 나라가 망할지 알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근사한 연말파티 만들기’나 ‘침 성형’ 같은 기사들은 별책부록 쇼핑책자를 반가워했을 독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알려줬다. 집에서 모이면 남성과 여성은 따로 먹고 노느라 바쁘다. 이런 모임이 파티로 진화된 것은 분명 새로운 삶의 모습이다. 여기에 작은 가슴과 얼굴 주름을 침으로 고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삶의 모습이 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대머리 치료 이야기는 왜 빠졌을까?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흐름은 영화 ‘싸움’의 김태희 기사로 연결됐다. ‘인형공주의 연기 재발견’이라는 기사는 분명 홍보성이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봐줄 수 있다. 한국 영화의 관객이 20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다. ‘흥행 빙하기 충무로 100만명이면 대박’이라는 기사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들만 기억하는 소비자에겐 사뭇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색, 계’라는 영화가 예상하지 못한 대박을 쳤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젠 정치나 대중문화에서 대중의 라이프스타일이 사회 변화를 알려주는 주요 기준이 된 듯하다. 삶이나 사회의 주요 변수는 지역, 연령, 이념이 아니다. 어떻게 먹고살고, 어떤 문화를 즐기느냐의 문제다.
이젠 정치나 대중문화에서 대중의 라이프스타일이 사회 변화를 알려주는 주요 기준이 된 듯하다. 삶이나 사회의 주요 변수는 지역, 연령, 이념이 아니다. 어떻게 먹고살고, 어떤 문화를 즐기느냐의 문제다.
황상민 연세대 교수·심리학
보여줄 것 없는 대선의 백미는 이미지 전쟁이다. ‘유권자의 감성’을 자극하거나 유권자의 마음을 잡고 싶은 광고에 대한 분석은 흥미로웠다. 단지, 이런 광고 이미지가 국민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즉 이미지 수용자에 대한 반응도 함께 실렸다면 답답한 대선판의 청량제 구실을 하는 기사가 됐을 것이다.
‘거대 공룡 농협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기사는 이번 호의 핵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 천하지소본(天下之小本)으로 변한 이유를 여실히 보여줬다. 망쳐먹은 인간들이 줄줄이 있을 때 그 동네가 망하는 것은 천하의 이치다. 농업이 망할지, 나라가 망할지 알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근사한 연말파티 만들기’나 ‘침 성형’ 같은 기사들은 별책부록 쇼핑책자를 반가워했을 독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알려줬다. 집에서 모이면 남성과 여성은 따로 먹고 노느라 바쁘다. 이런 모임이 파티로 진화된 것은 분명 새로운 삶의 모습이다. 여기에 작은 가슴과 얼굴 주름을 침으로 고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삶의 모습이 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대머리 치료 이야기는 왜 빠졌을까?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흐름은 영화 ‘싸움’의 김태희 기사로 연결됐다. ‘인형공주의 연기 재발견’이라는 기사는 분명 홍보성이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봐줄 수 있다. 한국 영화의 관객이 20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다. ‘흥행 빙하기 충무로 100만명이면 대박’이라는 기사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들만 기억하는 소비자에겐 사뭇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색, 계’라는 영화가 예상하지 못한 대박을 쳤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황상민 연세대 교수·심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