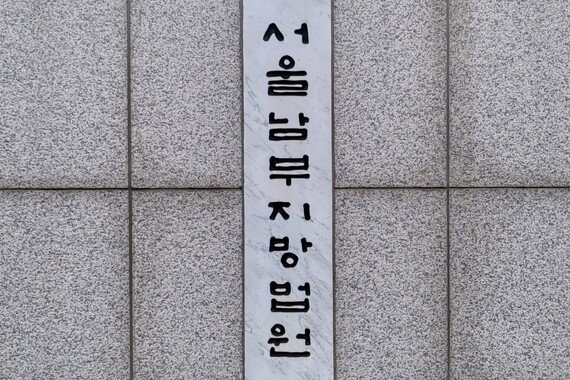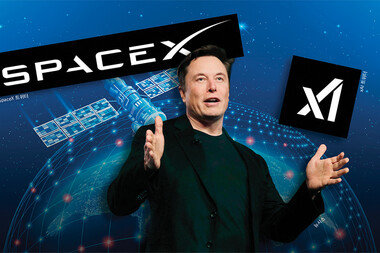며느리 최모씨(30)는 “중국에서 아버지의 중풍을 고친 친구가 브로커(베이징 유학생)를 소개해 주기에 그 사람 말만 믿고 중국에 갔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잘못을 빌었지만 시어머니의 화는 쉬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대 중국의 명의 화타나 편작의 ‘비방’과 ‘비술’을 기대했던 시어머니로서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외유성 미국 원정 진료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가운데 난치병 치료를 위해 중국의 중의원(中醫院, 병원급)을 찾는 사람이 급속히 늘고 있다. 중국의 병원을 다녀온 환자나 그 가족이 전하는 현지 상황은 그저 돈 많은 환자 몇 명이 찾는 정도가 아니다. 베이징의 유명 중의원마다 매일 10~15명의 한국 사람이 치료받고 있으며, 심지어 옌볜과 헤이룽장성 등 조선족 밀집지역의 중의원에도 한국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중의학이 국내에서 조명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7년 3월 뇌졸중으로 쓰러져 독일의 마인츠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당시 신한국당 최형우 고문이 중국 베이징의 301병원으로 옮긴 뒤 불과 3개월 만에 극적으로 언어 기능을 회복하면서부터. 이때부터 국내 언론은 중의학에 대한 기획물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뇌출혈로 쓰러진 한라그룹 정일영 회장 등 정·재계 인사의 중국 원정 진료가 이어졌다.
이후 조선족이나 중국 유학생 출신 브로커들에 의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중국 원정 진료는 난치병 환자뿐 아니라 일부 부유층 인사들의 관광코스에 편입될 만큼 공공연한 일이 되었다. 최근에는 중국 원정 진료를 공식적으로 상품화한 관광업체까지 등장했다. 이제 ‘침 맞고 한약(漢藥) 지으러’ 중국 가는 것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닌 시대가 된 셈.
문제는 브로커 말에 속아 사기당하거나, 김씨의 남편처럼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 올 1월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베이징에 간 최모씨(48)도 그 같은 경우. 지난해 11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최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이징에 갔으나 한 달 후 입국할 때는 들것에 실려 돌아올 만큼 상태가 악화되었다.

조선족 브로커 김모씨는 “통역료와 진료비만 1500만원이라고 했지 다른 부분은 모르는 일이다. 체질이 안 맞아 그런 걸 어떡하느냐”고 오히려 무턱대고 베이징에 온 최씨를 탓했다.

5년 전부터 류머티스성 관절염으로 온몸이 아프고,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하기도 힘들었던 이모씨(여·27)도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의 한 중의원에 입원해 약을 세 달간 복용한 후 관절통과 아침에 손이 굳어지는 증세가 말끔히 사라져 현재는 관절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베이징대학에서 6년간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한의사 김재철씨(40)는 “특정 질병을 중의학으로만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천년 내려온 한(漢)의학을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집대성하고, 거기에 양방을 접목하면서 중의학 수준이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똑같이 중국에서 치료받았는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중국 유명 중의원과 국내 병원을 연결하는 중의학 서비스 대행업체 ㈜나인인터내셔날을 개업한 반재용씨(35)는 “중국에만 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환상과 중국의 독특한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이런 결과를 낳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의사는 우리처럼 한의사와 양의사(西醫)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대에서 양방과 중의학을 함께 배우기 때문에 양약과 한약(漢藥)을 동시에 처방하며, 검사도 진맥법과 양방의 첨단기계 검사법을 모두 사용한다는 것. 따라서 한국에서의 진료 자료를 미리 가져가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국에 가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이라는 게 반씨의 주장이다.
중국에 다녀온 환자들의 충고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 “중의원 안에도 부인과, 노인과, 내과, 침구과, 소아과, 외과 등 과가 세분화되어 있고, 분야별로 명의와 명의원이 따로 있어 브로커의 설명을 듣고 무턱대고 중국에 갔다가는 돌팔이 의사를 만나 돈만 뜯길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
중의학 서비스 대행업체인 ㈜나인인터내셔날은 이런 점에 착안, 국내 병원에서 1, 2차 검사를 마친 환자를 중국 내 협력 중의원에 보내고 치료기간 동안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관광 패키지 상품을 개발, 개업 후 5개월여 동안 베이징 최고급 중의원 세 곳에 100여명의 환자를 보냈다.
하지만 이런 중의원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를 “민족의학인 한의학의 자존심을 허물고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매국적 처사”라고 비판한다. 한의사협회 강동철 홍보이사는 “국내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의원 도우미 서비스는 조선족 브로커와 다를 게 전혀 없다. 이는 의료법상의 환자 알선 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범법 행위지만, 현재까지는 피해당한 환자의 직접 고발이 없기 때문에 추세를 관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의 한 관계자도 “환자가 자신이 선택한 일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목적이 관광인지 진료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의학을 사랑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환자가 우리 한의원을 박차고 외국으로 나가는 현실에 대해 한의학계와 정부의 책임이 조금도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한의학계와 정부의 심기일전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