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컵 개막이 코앞인데 이런 원론적인 질문에서 헤맬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어차피 우리의 당면 목표는 16강 진출이다. 하지만 16강이라는 목표는 있으되,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야 16강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솔직히 우리의 정서는 “죽을 힘을 다해 뛰어라. 그래도 안 되면 말고”에 가깝다.
김화성의 ‘한국은 축구다’는 앞서 던진 질문에 꼼꼼히 대답한 책이다. 축구를 축구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싫든 좋든 용광로처럼 녹아 있는 한국 사회를 읽어낸다. 그러니까 “한국 축구 정말 짜증나게 못한다”는 말은 누워서 침 뱉기란 것이다. 먼저 그 답을 책의 3장 ‘축구는 국민성이다’에서 찾아보자. 나란히 월드컵 본선에 오른 한국 중국 일본의 축구를 각자의 국민성과 비교해 기술한 대목들이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세계 최강 브라질도 이기는가 하면 삼류팀인 태국(그것도 한국은 11명, 태국은 9명이 뛰었다)에도 어이없이 무너지는 한국 축구를 저자는 ‘우지끈 딱’이라 했다. ‘끈적끈적’이라는 표현도 썼다. 밖에서 보면 단순한데 막상 부딪쳐 보면 만만치 않은, 어디서 불어올지 가늠하기 어려운 바람이 한국 축구의 특징이다. 그런데 그 바람은 상대를 당황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한국 축구는 승리에 대한 집착 대신 축구를 즐기는 여유가 필요하다. 반면 깔끔하고 아기자기한 일본 축구는 요즘 투지까지 붙어 몇 년 사이 기량이 급상승했고, 중국 축구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지만 다부지지 못한 면이 보인다.
일단 ‘한국은 축구다’는 재밌다. 축구 경기규칙을 잘 몰라도, 선수들 이름을 두루 꿰지 않아도 읽을 수 있다. 또 한국의 축구 상식과 정면 충돌하면서 밀어붙인 히딩크식 축구경영학을 배우는 것은 덤이다. 그러나 저자도 한국인인데 ‘어찌 됐든 한국이 이기는 방법’을 왜 고민하지 않았겠나. 선수들의 개인기부터 관중들의 응원까지 잔소리가 많다. 다 이기는 데 필요한 전술들이다. 책 한 권을 후딱 읽어치우고 나면 당신도 발이 근질거리는 것을 느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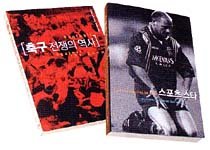
데이비드 앤드루스가 엮은 ‘스포츠 스타’는 물론 축구 이야기만은 아니다. 농구스타 마이클 조던부터 골프의 타이거 우즈, 축구의 데이비드 베컴 등 다양한 분야에서 13명의 스포츠 스타를 통해 문화담론을 만들어 가는 책이다.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먼을 흑인의 몸을 타고난 엘비스로, 테니스 스타 애거시를 보수주의에 울고 웃는 X세대의 초상으로, 타이거 우즈를 다문화주의의 명함으로 보는 식이다. 축구에서는 영국의 불운한 천재 미드필더 폴 개스코인과 잉글랜드 축구의 영웅 데이비드 베컴, 아르헨티나의 신화이며 비극인 마라도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 정도면 월드컵 관전 준비는 끝났다.
한국은 축구다/ 김화성 지음/ 지식공장소 펴냄/ 250쪽/ 7500원
축구 전쟁의 역사/ 사이먼 쿠퍼 지음/ 정병선 옮김/ 392쪽/ 1만5000원
스포츠 스타/ 데이비드 앤드루스 외 엮음/ 강현석, 박노영 옮김/ 432쪽/ 1만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