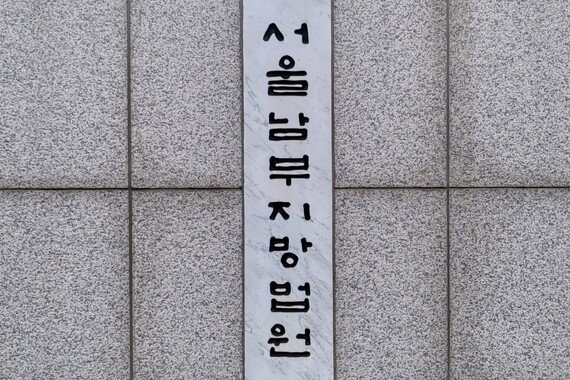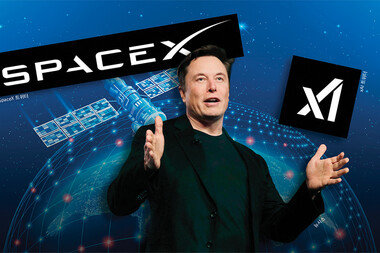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

실패를 연구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전문용어로는 human error라고 한다)인 점에 주목하고 실패의 반복을 막고, 나아가 실패를 제대로 배우면 결과적으로 실패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패를 알고, 실패를 극복하고, 실패를 통해 더 큰 성공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실패학’(失敗學)의 목적이다.
실패학 붐의 진원지는 일본이다. 일본이 실패에 눈뜬 것은 99년 9월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 우라늄 연료처리회사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나면서부터. 1945년 원폭 피해 이래 최대의 피폭사고가 안전조치 소홀과 단순 부주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일본 사회는 경악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초 일본 과학기술청 산하에 ‘21세기 과학기술간담회’를 설치하였고 ‘실패학을 구축하자’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 와중에 칸사이 지방에서 대규모 집단 식중독 사건이 벌어졌다. 식품업체인 유키지루시 유업의 저지방유에 황색 포도상구균의 독소가 스며든 것이었다. 식중독의 원인은 위생관리 소홀로 밝혀졌지만 정확한 과정은 알 수 없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 후 이 회사의 직원 가족이 한 신문에 투고를 했다.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가혹한 노동이 조잡한 위생관리의 원인이라는 지적이었다. 공장 직원은 매일 밤 10시나 11시까지 잔업을 하고 피로가 채 가시지 않은 채 다음날 출근해 다시 일하면서 자연히 위생관리가 느슨해졌다는 것이다. 아무리 사장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다짐한다 해도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유키지루시 유업의 식중독 사건은 실패의 발생구조가 그리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 일본에 ‘실패학’이라는 말을 퍼뜨린 동경대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기계공학,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의 저자)는 “실패의 원인은 대부분 무지, 부주의, 차례 미준수, 오판 등 개인에게 책임이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조직운영 불량, 기업경영 불량, 행정·정치 태만, 사회 시스템 부적합, 미지(未知)와의 조우 등 사회적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8월10일 사토 후미오 전 도시바 회장을 주축으로 한 민·관·학 합동의 ‘실패지식활용연구회’가 첫번째 ‘실패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것은 일본에서의 실패 발생 요인과 실패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한 대목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외국에서 이미 실현한 기술과 기준, 규격을 도입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산업활동을 해온 캐치업(catch up) 방식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캐치업형 경우, 기술을 확립하는 과정에서의 실패 경험까지 전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부족과 응용능력 결핍이라는 중대한 공백이 생겨 실패의 징후를 보고도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등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취약한 기술기반에 실패를 부끄러운 것으로만 여기는 체면중시의 사회적 풍토 역시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실패의 원인규명이나 재발방지보다 표면화하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엉뚱한 혐의를 받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실패에 개입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실패를 계기로 한 조직 개선이나 개인 능력 향상의 기회를 놓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이언오 상무는 실패관리에서 “실패는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삼성그룹 내에서 기술과제 진행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실패율이 5%도 안 되요. 사실 국가나 민간의 연구개발사업은 10%만 성공해도 성공이라고 봅니다. 실패율이 5%도 안 되는 것은 엄청난 결과죠. 그런데 과제들을 찬찬히 살펴보니 대부분 개량과제들입니다. 즉 소프트웨어의 경우 버전 1.0에서 1.2로 높이는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과제들이죠. 결과적으로 과제는 성공했지만 경제적 효과나 기업에 미치는 성과가 별로 없는 일에만 매달린다는 겁니다.”
시스템 전문가인 지만원 박사는 “한국인은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면서 역사의 교훈을 가장 배우지 못한 민족이다”고 개탄했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97년 IMF 외환위기를 들었다. “나라를 말아먹을 뻔한 IMF 위기도 결국은 국가 정책의 실패죠. IMF 위기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경식씨(전 경제부총리)나 김인호씨(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책임자들을 잡아넣기에 바빴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실패가 드러날까 봐 진실을 이야기 하겠습니까? 변명만 늘어놓지요.”
실패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흔히 IBM의 설립자인 톰 왓슨 회장을 꼽는다. IBM 초기 젊은 부사장이 모험적 신제품 개발사업에 1000만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도 결국 실패하자 사표를 제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때 왓슨 회장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무슨 소린가, 나는 자네에게 1000만 달러나 투자했네. 실패의 원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바로 자네일세.”
미국에서는 이미 실패를 학습대상으로 삼은 지 오래다. 특히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인기 강사로 너도나도 모셔가려 한다. 예를 들어 지난 95년, 233년 전통의 영국 베어링 은행을 파산으로 몰고 간 풋내기 은행원 닉 리슨에게 수만 달러를 제시하며 강연을 부탁하는 사람이 줄을 잇는다. 그의 실패 경험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다. 리슨은 스웨덴의 한 주식중개 전문회사의 광고에도 출연했다. 그의 광고 대사는 “사람은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하룻밤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였다. 일본에서도 실패 경험을 밑천 삼은 ‘실패학 컨설팅’과 실패학 관련 서적 출간이 붐을 이룬다.

옛말에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 했다. 한 번 정도의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니 너무 탓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서양속담에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실수에서 배운다”고 했다.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실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패학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실수에서 배우는 현명한 자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