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 사진.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은 현생인류보다 오히려 더 컸다.
네안데르탈인의 음악? 언어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네안데르탈인들이 음악을 즐겼다는 말은 일견 허황된 것처럼 들린다. 네안데르탈인들이 음악을 즐겼다는 주장을 담은 미튼 교수의 저서 ‘노래하는 네안데르탈(Singing Neanderthals)’은 2005년 영국에 이어 올해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출간됐다. 그의 책은 빙하기 지구의 지배자였던 원시인, 현 인류보다 오히려 더 큰 뇌 용량을 가지고 있던 네안데르탈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독창적인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네안데르탈인은 말을 하지 못했다. 네안데르탈인의 동굴 유적에도 그들이 의사소통을 했다는 증거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미튼 교수는 네안데르탈인이 언어 대신 아기의 옹알이 같은 ‘노래’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전달했다고 말한다. 그는 “네안데르탈인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둔한 미개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음악에 대단한 소질을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즉, 말처럼 정교한 의사소통 수단은 아니지만 네안데르탈인은 흥얼거림이나 옹알이 같은 ‘노래’를 통해 기쁨이나 슬픔, 당황, 놀람 같은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
비음 강한 ‘흠~’ 통해 감정 표현
미튼 교수의 책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의 노랫소리는 현대인들이 부르는 노래보다 비음이 더 강했을 것이라고 한다. 네안데르탈인은 현대인보다 얼굴이 더 넓적하고 코도 컸기 때문이다.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네안데르탈인의 노래는 ‘흠~~~~ Hmmmmmm’ 같은 식이었을 것이라고 그는 추측한다.
미튼 교수의 가설은 단순히 ‘네안데르탈인이 서로의 의사소통을 위해 흥얼거렸다’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들은 동굴 주거지에 모여 함께 노래했다. 새의 소리를 흉내낸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했고, 손뼉을 치거나 막대로 바닥을 두드리고 춤을 출 줄도 알았던 것 같다. 음악은 네안데르탈인의 결속력을 다지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요즘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 응원을 하거나 교회 합창단 활동에 참가하면서 서로 친밀감을 다지는 것과 비슷한 일이 네안데르탈인에게도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원시시대의 뮤지컬’이 펼쳐졌던 셈이다.
미튼 교수는 “네안데르탈인은 언어를 발명하지 못한 미개인이 아니라 언어를 발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언어보다 훨씬 더 견고한, 그리고 의사소통의 충분한 수단이 되는 ‘노래’를 발명했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이 맞다면 인류사의 수수께끼 중 하나인 ‘누가 음악을 최초로 발명했을까’라는 의문이 해결된다.
“사실 이 책은 ‘인간은 왜 음악을 만들고 들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예외없이 인간은 음악을 만들고 연주한다. 일상에 꼭 필요하지 않다면, 왜 인류는 그처럼 공통적으로 음악에 집착하는 걸까? 지금까지 학자들은 ‘음악은 인간이 타고난 성향이다’라는 식으로 설명해왔지만 이 설명은 불충분하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이 의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나는 음악과 언어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음악이 인류 진화에 미친 영향까지 찾아가게 된 것이다.”

TV 다큐멘터리에 재현된 네안데르탈인의 동굴 주거 모습.
미튼 교수는 이에 대해 “유아들이 언어를 배우면서 음악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즉,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음악과는 다른 의사소통 체계를 익히는 과정이고,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에 익숙해지면서 선천적인 의사소통 능력인 음악을 상당 부분 잊게 된다는 것이다.
음악은 초기 인류 중요한 소통수단
실제로 언어와 음악 능력은 별개다. 언어 전달이 어렵지만 음악 능력은 뛰어난 자폐아인 ‘뮤지컬 서번트(Musical Savant)’가 학회에 보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말더듬이도 노래할 때는 가사를 더듬지 않는다. 사고로 언어 능력을 잃었지만 노래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언어는 좌뇌에서, 음악은 우뇌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고로 좌뇌를 다쳐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이 노래 가사를 발음할 수 있을까? 대답은 ‘불완전하지만 할 수 있다’다. 언어장애인들은 리듬이나 가락이 없는 일상 대화보다 노래 가사를 더 수월하게 발음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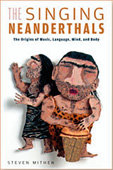
하버드대학교에서 출간된 미튼 교수의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미튼 교수는 리듬과 인간의 직립보행 능력을 연관시켜 설명한다. 사람들은 음악의 본질을 멜로디나 화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음악의 가장 기본 요소는 규칙적인 리듬이다. 규칙적인 리듬을 익히지 못하는 침팬지는 인간처럼 성큼성큼 걸을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리듬에 맞춰 직립보행을 할 수 있다. 이 역시 인류의 발달과 음악이 얽혀 있는 복잡한 관계를 시사하는 사례가 아닐까.
“결국 음악을 만들고 듣는 것은 초기 인류에게 그날의 먹거리를 구하거나 나무 위 안전한 잠자리를 찾는 것처럼 중요한 과제였다. 바흐의 미사곡이나 마일스 데이비스의 재즈는 네안데르탈인이 현재 인류에게 남겨놓은 유산이다.”
미튼 교수의 결론은 다소 엉뚱하게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아득한 옛날, 꽁꽁 얼어붙은 빙하기의 지구 한구석 동굴 안에서 막대기로 땅을 치며 노래 부르는 네안데르탈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라. 상상만으로도 머나먼 과거의 한때를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설 것 같지 않은가.













![[영상] “내년 서울 집값 우상향… <br>세금 중과 카드 나와도 하락 없다”](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48/a8/ac/6948a8ac1ee8a0a0a0a.png)


![[영상] “우리 인구의 20% 차지하는 70년대생, <br>은퇴 준비 발등의 불”](https://dimg.donga.com/a/380/253/95/1/carriage/MAGAZINE/images/weekly_main_top/6949de1604b5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