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겨울 유행하고 있는 베컴 모자(맨 윗줄)와 소지섭 모자들(맨 아랫줄).
올겨울엔 특히 일명 ‘베컴 모자’라고도 하는 울 소재의 비니 모자(챙 없이 귀를 덮는 모자)가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실제로 일본 사람보다 머리가 더 크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모자 쓰는 문화만큼은 일본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겨울이면 사라져 갖가지 모자를 쓴 멋쟁이들이 눈을 즐겁게 하니 좋다.
그런데 춥지 않은 계절에 모자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상황이 아주 재미있다. 무엇보다도 모자로 사람의 직업이나 지위를 직접 표현하거나 상징할 수가 있어서 보이는 이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게 도와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컨대 경찰관이나 군인 등의 경우 모자를 쓰지 않은 모습은 잘 상상이 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갓은 곧 선비요, 패랭이는 보부상이다. 또 선비가 과거에 장원급제하면 머리에 어사화를 장식하고 멋지게 금의환향할 수 있었다. 서양에서도 높은 실크 모자를 쓴 젠틀맨 앞에서 평민들은 납작한 모자를 벗어든 채 눈길을 내리깔아야 했던 역사가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니다.
모자의 가장 일반적 형태인 해드(hat)는 몸체(crown)와 챙(brim)으로 구성되는데, 더욱 광범위한 의미로 머리에 쓰는 것의 총칭인 헤드드레스(headdress)라고 하면 왕관부터 두건까지 훨씬 다양해진다. 지위 상징의 가장 꼭대기에 자리한 왕관은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부터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 그림까지 무수한 기록이 있다. 역사에 나타나는 왕가의 왕관 모양만 찾아봐도 현대 모자 디자이너들은 영감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중세시대를 특징짓는 저 높은 하늘을 향한 간구와 염원이, 에넹(hennin)이라는 역사에서 가장 높고 뾰족한 모자에 표현된 것은 패션의 상징 기능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춥지 않은데도 베레모나 헌팅캡을 쓴 남자들을 보면 곧바로 ‘ 저 사람은 예술가이거나, 예술가처럼 보이고 싶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곳이 사냥터가 아니라면, ‘저 모자 아래 혹시 머리숱이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무례한 상상을 하는 우리들이다. 중절모는 중후한 신사의 멋을, 밀짚모자는 주로 해변이나 정원 또는 농촌활동을, 캡은 운동이나 젊음을 상징한다.

직업과 신분, 미적 영감 등 한 사람의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모자들.
그런가 하면 예술가들은 초현실주의 미술 기법 중 ‘위치의 도치법(displacement)’에 착안하여, 엉뚱한 오브제가 머리 위에 모자로 착용되는 아이디어를 기발하게 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머리숱이 점점 줄어들어 고민하는 남편에게 겨울 동안이라도 보온용 모자(를 빙자한 ‘외모 발전 방안’)를 쓰게 하려는 수년에 걸친 노력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 지나치게 미남으로 보일까봐 맨머리를 고수한다는 남편의 변명은, 모자가 제공할 수 있는 멋스러움을 인정하는 비전문가의 경험에서 나온 확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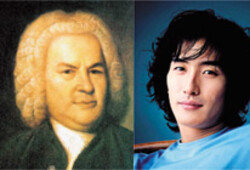












![[영상] “우리 인구의 20% 차지하는 70년대생, 은퇴 준비 발등의 불”](https://dimg.donga.com/a/570/380/95/1/carriage/MAGAZINE/images/weekly_main_top/6949de1604b5d2738e25.jpg)
![[영상] 폰을 ‘두 번’ 펼치니 ‘태블릿’이 됐습니다](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48/a9/23/6948a9231242a0a0a0a.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