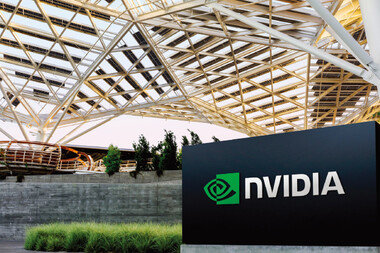일반 극영화 가운데 최고의 제작비를 들인,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결정판이라는 점이 먼저 관심을 끌었다. 제작사인 기획시대는 “총 제작기간 4년에, 92억원의 제작비가 들었다”고 밝혔다. 기획 당시 예산은 33억원이었지만 제작하면서 액수가 과다하게 초과된 것. 그러나 완성도 있는 작품만 나올 수 있다면, 사실 제작비 초과가 문제겠는가.
‘성소’가 화제작이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여주인공 임은경 때문. 광고계에서 ‘베일에 싸인 요정’으로 여겨졌던 그녀가 마침내 이 영화를 통해 대중과의 접속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만약 임은경이 없었다면 ‘성소’의 프로젝트도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이렇게 볼 때 ‘성소’는 광고와 영화 간의 경계를 허문 최초의 극영화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말하는 경계 허물기의 실례를 ‘성소’는 영화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성소’를 화제작으로 만든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장선우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는 사실이다. 공동 작업의 산물인 영화에서 감독의 존재는 이중적이다. 제작팀을 이끄는 지휘관의 임무와 작품에 영혼의 숨결을 불어넣는 예술가로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품에 영혼을 불어넣는 과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모호한 구석이 많은 이 과제를 제대로 실현해온 감독들을 우리는 특히 작가라고 부르고 있다. 나아가 한 개인의 독창성, 스타일 그리고 내면세계가 아우러진 영화를 우리는 작가주의 영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 영화판에서 이런 작가라는 이름에 걸맞은 감독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작가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몇 안 되는 감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가 장선우다..

‘성소’는 음미하는 영화가 아니라 대중의 취향에 영합해야 하는 상업영화답게 즐기는 영화가 되어야 마땅했다. 머리로 보는 생각하는 영화가 아니라 즐기는 영화여야 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현실의 세계이고 어디까지가 게임의 세계인지에 대한 명쾌한 경계는 없다. 게임이다 싶으면 현실이고 현실이다 싶으면 게임이다. 말하자면 ‘성소’는 광고와 영화 간의 경계 허물기를 넘어 게임과 영화 간의 경계마저 허물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관객은 헷갈리기 십상이다. 영화가 너무 어렵게 다가온다.

이 밖에도 게임과 영화의 본질적 차이에서 오는 괴리를 드러내는 곳이 적지 않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같은 종류의 게임을 한 번 하고 끝내지는 않는다. 처음에 서툴렀던 게임도 자꾸 하면 할수록 기술이 늘고 요령이 생겨서 더 많은 점수를 얻어내며 그 게임에 매료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는 다르다. 아무리 게임을 소재로 했다 해도 영화 속 게임은 관객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다.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단판 승부’를 해야 하는 상업영화의 속성과 반복 실행을 해야 재미가 배가되는 게임 간의 어쩔 수 없는 괴리감. 어쨌든 감독은 ‘성소’라는 게임에 관객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