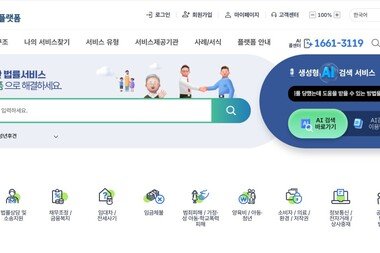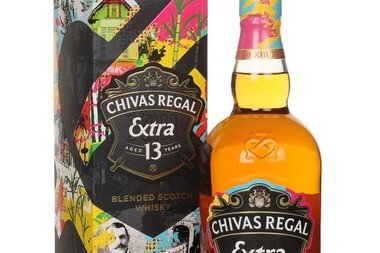그러나 미국은 옛소련이 무너진 90년대 탈냉전 구도하의 유일한 패권국가다. 테러 공격으로 패망할 나라가 아니다. 직업적 투쟁가로서 세계 정세에 밝은 빈 라덴도 그 점을 꿰뚫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빈 라덴이 설정한 9·11 테러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옥스퍼드대 연구원 톰 그랜트는 미 외교정책연구소에 발표한 글에서 “빈 라덴은 9ㆍ11 테러를 계기로 반미 이슬람 대연합을 이뤄 지도자가 되려 했다”고 분석했다. 그랜트는 1880년대 수단에서 영국 식민지배에 맞서 반란을 일으켜 이슬람교 독립국가를 세우려 했던 무하마드 아흐메드의 역사적 경험을 빈 라덴에 견준다. 120년 전 아흐메드가 이슬람권을 향해 던진 반영(反英) 메시지는 전파력이 약했지만, 21세기 미국은 그보다 훨씬 위험한 적, 곧 빈 라덴을 맞이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이스라엘 계열의 선진전략정치연구소 연구원 폴 M. 위비도 비슷한 논리를 편다. 그는 ‘빈 라덴의 은밀한 목표는 사우디 왕조를 뒤엎는 것’이란 제목의 글에서 “빈 라덴은 아라비아 반도에 이슬람 근본주의에 바탕한 신정(神政)국가를 세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9ㆍ11 테러로 미국-이슬람권 간 극한대결 구도를 이끌어내고, 그런 분위기에서 사우디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 사우디 권력을 장악한다는 야심을 가졌다는 것. 사우디 혁명이 성공할 경우 중동에선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지금의 미국-이스라엘-친미중도(이집트 요르단 사우디) 대 반미(이란 이라크 시리아 및 여러 과격 무장집단) 구도가 사우디 혁명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강점해 온 이스라엘에겐 불리한 구도가 된다.
빈 라덴이 사우디 혁명을 꿈꿨다는 게 사실인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도 논쟁적 주제다. 하지만 빈 라덴의 행적과 발언록을 살펴보면 그가 사우디 왕조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90년대 반미 이슬람 투쟁의 깃발을 올린 빈 라덴이 발표한 두 가지 문건(96년 10월 ‘빈 라덴 서한: 전쟁 선언’과 98년 2월 ‘유대인과 십자군에 저항하는 세계 이슬람 전선의 성전’)은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 율법 지도자, 정치지도자, 청년들과 병사들이 힘을 합쳐 아랍권에서 △미국과 서방 세력, 이스라엘 등 비(非)이슬람 세력 △세속적이고 부패한 이슬람 정권을 몰아내자고 주장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아프간으로 근거지를 옮긴 직후인 96년 10월 이슬람권 격월간지 ‘니다울 이슬람’(Nidaul Islam)과의 인터뷰에서도 빈 라덴은 “사우디는 부패한 왕조가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경찰국가”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사우디는 3만명의 왕족이 지배하는 전근대적 전제군주국이다. 늙고 병든 파드 국왕, 사실상의 통치권자인 압둘라 왕자(왕위 계승권자), 국방장관인 술탄 왕자, 내무장관 나에프 왕자, 정보기관인 이스타크바라트(Istakhbarat)의 우두머리 나와프 왕자를 비롯, 핵심요직은 모두 왕족이 차지했다. 사우디엔 민주국가의 기본인 국회도 없다. 집회결사의 자유나 비판의 자유도 없다. 사우디 언론은 엄격한 국가 통제 아래 있다. 테러리즘 등 민감한 주제를 보도할 경우 정부 소유 언론매체인 SPA의 보도를 그대로 베끼는 수준이다.
문제는 90년대 들어 석유 수출이 급격히 줄고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사우디 민중의 개혁 욕구가 매우 높아졌다는 점. 사우디 왕자들의 사치와 방탕, 부패에 강한 불만을 가진 젊은이들이 이슬람교 원리주의 단체에 가입, 개혁과 혁명을 논하는 분위기가 높아졌다. 이들의 이념적 바탕은 이집트의 이슬람교형제단(Muslima Brotherhood)처럼 사우디판(版) 이슬람 근본주의인 와하비즘(wahhabism)이다. 미 전략국제연구센터가 3월 초 펴낸 사우디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8000∼1만2000명의 사우디 젊은이가 이슬람교 원리주의 단체 회원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에게 빈 라덴은 영웅이다. 부시 행정부의 테러 전쟁에 사우디 왕조가 겉으로나마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는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반감과 사우디 왕조 자체에 대한 자국 내 흉흉한 분위기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빈 라덴은 그런 사우디 청년들을 사우디 이슬람 혁명의 원동력으로 여겼을 법하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뤄 보면, 사우디 왕조는 빈 라덴이 죽었다는 소식을 애타게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빈 라덴은 지난해 11월 말 아프간 동부 토라보라 산악에서 파키스탄으로 몸을 피해 잠행중일 가능성이 크다. 그가 언젠가 ‘사우디의 호메이니’로 화려하게 부활할지 여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