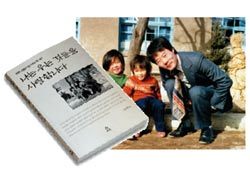
동화작가이자 시인으로 아이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고 임길택씨(사진)의 책 ‘나는 우는 것들을 사랑합니다’(보리 펴냄)가 나왔다. 이번 책의 주인공은 시골 학교의 때묻지 않은 어린이들. 임씨는 따돌림당하고 제 몸이나 정신을 스스로 가눌 줄 모르는 아이들을 특히 따뜻하게 보살폈다. 어느 해 3월 그는 6학년 담임교사가 되어 잘 울고 오줌싸개로 불리던 영심이를 만났다. 굼뜨고 몸에서 늘 지린내가 나 다른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곤 했지만 심성은 착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이였다.
“친구들이 싫어하지 않도록 머리를 잘 감고 몸가짐도 바르게 하라 일렀다. 공부 시간에도 그애 옆에 자주 갔다. 더러 등을 토닥여주면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기쁨이 그애의 몸속 깊이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임씨는 영심이가 졸업하고 떠난 뒤에도 ‘거울을 보면서 예뻐져야겠다 생각할 것’ ‘집 둘레의 풀이나 벌레, 새들을 지나쳐버리지 말 것’ 등 자잘한 조언을 담은 편지를 보내곤 했다. 그렇게 해서 영심이가 어엿한 숙녀 투로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집안 식구들은 무고한지 모르겠군요. 저도 잘 있습니다”라고 편지를 써보냈을 때야 임씨는 “그애에게서 이제는 내가 슬쩍 빠져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임씨는 강원도 탄광마을과 산골마을에서 초등학교 선생으로 재직하다 1997년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감해 지인들을 안타깝게 했던 인물. 그는 교직에 있을 당시 만난 아이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등 이웃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많은 동화와 시, 산문을 남겼다. 시집 ‘탄광마을 아이들’ ‘할아버지 요강’ ‘똥누고 가는 새’, 동화집 ‘산골마을 아이들’ ‘느릅골 아이들’ 등은 자신과 식구들만 챙기고 사는 욕심 많은 요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변산공동체학교 윤구병 교장은 추천의 글에서 “자극이 강하고 현란한 글들에 익은 사람들이 잘 삭은 배추김치같이 담백한 이 글들을 얼마나 잘 읽어낼지 모르겠다”며 “글이 곧 사람이라는 말은 이 글 같은 글을 두고 이른다. 진실 말고는 아무것도 담지 않은 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입시경쟁에 내몰려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을 교사나 부모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케 하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