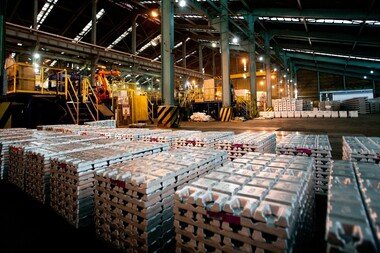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과 주입식 교육의 병폐에 관해 대화를 하던 중 한 학생이 “주입식 교육이 나쁘다는 것도 주입식으로 배워서 단점을 모르겠다”는 우스갯소리를 해 한바탕 실소를 터뜨린 적도 있다. 모두가 주입식 교육이 나쁘다고 말하면서 왜 나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야말로 주입식 교육의 병폐가 아닐까. 논술시험조차 학교나 학원에서 이렇게 쓰면 몇 점, 저렇게 쓰면 몇 점 하는 식으로 교육받아야 마음이 놓이는 학생들이 과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지 의문이다.
지금의 대학입시 논쟁은 잠시 제쳐두고,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인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인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실험을 거쳐 보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갖춘 이후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수용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의 교육과 새로운 교육을 병행시키고 차츰 우리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교육하는 제도를 제시하고 발전시키면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입시제도로 온 국민이 들썩이는 촌극은 사라질 것이다.
몇십 년 전부터 외양간이 나쁘다고 하면서 어디가 어떻게 나쁘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논하지 않고, 소 중에 어떤 소가 똑똑한지 변별력이 있어야 한다거나 똑똑한 소를 싹쓸이한다거나 하는 논쟁만을 일삼고 있다. 다 망가진 외양간에서 똑똑한 소들은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원론’은 점의 정의를 비롯한 23개의 정의로 시작해서, 누구나 맞다고 인정하는 각각 다섯 개의 공리와 공리를 바탕으로 465개의 정리를 증명하고 있다. 모든 증명이 미리 증명된 사실들만을 이용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서 결국 원하는 결론을 유도해낸다. 수학을 배울 때는 ‘원론’에서처럼 바른 단어를 사용, 정확한 정보만을 이용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 습관을 따라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유클리드를 만나고 뉴턴을 넘어 아인슈타인까지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말로 힘든 작업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기러기생활을 청산할 수 있고, 놀이터가 아이들 웃음소리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자. 더디고 힘든 길이겠지만, 왕도는 없다. 첫걸음부터 시작해서 찬찬히 다시 돌아보고 다시 확인해서 10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가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