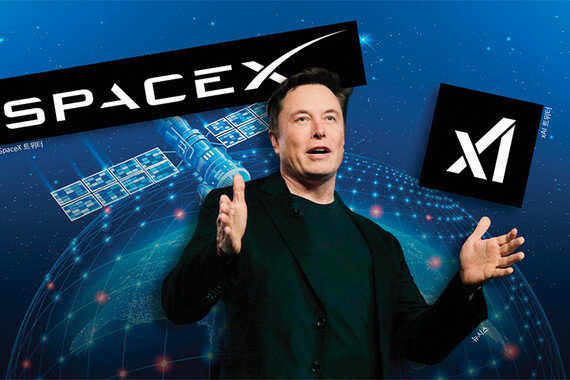황복. 국내 해양서식 어종 중 유일하게 민물에서 산란하는 어종으로, 특히 임진강 상류 파주 지역에서 잡히는 황복이 그중 최고다. 서해와 강화를 거쳐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오며 강바닥의 자갈에 단련된 그들의 육질은 사람으로 치면 근육질의 남자. 실제 알이 가득 차 불룩하게 나온 황복의 배는 성이 나면 두 쪽으로 갈라지는 ‘위용’을 선보인다.
kg당 10~12만원 ‘최고 어종’

국내 최고의 어류를 자임하는 임진강 황복이 올해 이곳 어부들에게 더욱 반가운 것은 극심한 봄 가뭄과 수질오염,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씨가 말랐다가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 20여년 전에는 연간 100톤, 10여년 전에는 50톤이었던 황복의 어획량은 5년 전부터 10톤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임진강 전체에서 잡은 황복을 모두 합해봐야 1톤도 채 되지 않았다.
3년생 한 마리가 600~700g인 것을 고려하면, 산란 시기인 4월 말에서 6월 말 두 달 동안 1700마리도 잡지 못한 셈이다. 하루로 치면 임진강 전체에서 30여 마리를 잡은 데 그친 것. 임진강 유역 파주와 문산 인근에 있는 황복잡이 배가 70척에 이르는 점을 생각하면 30척의 배는 매일 한 마리씩만 잡았고 그나마 40척은 황복 구경도 못한 셈이다. 임진강 인근에 황복 전문 식당이 50여곳에 이르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생활고가 짐작된다.
이곳에서 20여년째 황복잡이를 하고 있는 이주석씨(48)는 “정말 죽을 맛이었다. 하지만 임진강 어부들을 가장 화나게 만든 것은 양식 황복을 임진강 황복이라며 팔고 있는 서울의 복어 식당들이었다”며 일부 몰지각한 복어 식당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임진강에서는 단 한 마리도 방출한 적이 없는 자연산 황복이 서울의 식당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었던 것. 특히 이곳 어부들을 웃긴 지난해 최대 사건은 양식 황복을 먹고 자연산 황복이라며 감탄해 마지않은 서울 사람들의 모습이 모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그램에 방영된 사실이다.

경기도 내수면개발연구소 박종구씨는 “양식 황복은 보통 700~800g씩 자라지 않고 다 자라도 300g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요즘은 치어의 방류로 일부 자연산 황복의 경우도 씨알이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크기만으로는 구별이 어렵고, 회를 떠봐야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진강 황복의 최종 산란지인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의 H 황복 전문 식당 이진배 사장(43)은 “지난해의 경우 자연산 임진강 황복 한 마리의 값이 30만원을 상회하던 때도 있었다”면서 “잡히면 구경할 사이도 없이 예약된 손님에게 가기 바빴다”고 말했다.
이렇게 자취를 감추었던 황복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28일쯤부터. 처음 하루 100kg씩 잡히던 황복의 양이 요즘 차츰 늘고 있다. 봄 강수량이 많고, 수질도 깨끗해져 산란기 두 달 동안 어획량 10여톤은 무난할 것이라는 게 파주 연천 등 임진강 유역 어촌계의 예상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 현재 황복의 도매가격은 kg당 6만원. 임진강 주변 식당에서 일반인들이 회와 복지리로 먹으려면 kg당 10~12만원은 내야 가능하다. 파주 연천 어촌계 장석진 계장은 “kg당 5~6만원 선까지 떨어지려면 연간 50톤에서 100톤 정도는 어획량을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에만 모든 것을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가 파주시 어촌계에 지난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황복 부화장을 건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어촌계는 매년 200만 마리의 황복 치어를 방류해 앞으로 3~4년 안에 이중 5~10%인 10만~20만 마리(15~30톤)를 되돌아오게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파주 어민들은 배 한 척당 150만원의 치어 방류 예산을 부담했고, 벌써 이 돈이 1억원 넘게 모였다.
장석진 어촌계장은 “중국과 북한의 예성강 대동강, 금강에서 황복이 사라진 지 오래인 상황에서 일본의 자주복과 경쟁할 수 있는 황복을 왜 정부가 나서 관광상품화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치어의 방류량만 늘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주장한다.
독이 들어 처분이 곤란한 황복 알을 재활용하고 나아가 미래를 위해 재투자한다는 것을 어민들이 마다할 리는 없다. 어민들이 스스로 예산을 모아 부화와 치어의 방류에 나서기로 하자 경기도는 내년부터 치어 방류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파주 어민들은 임진강에 참게 알을 방류해 참게값을 3년 사이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뜨린 경험을 떠올리며 황복의 치어 방류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임진강 참게는 중국산 참게보다 값이 떨어져 이미 가격 경쟁력에서 우월성을 확보한 상태.
“황복 축제를 열 겁니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식구들을 데리고 와 부담 없이 황복을 즐길 수 있도록 값을 내리고, 중국과 일본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황복 관광 코스도 만들어야죠. 임진강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황복을 볼 수 있는 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철쭉과 복숭아꽃이 피는 늦봄이면 ‘황금 물고기’ 황복이 지천으로 잡히는 임진강. 그 꿈같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 임진강의 어부들은 오늘도 그물을 잡은 두 손에 힘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