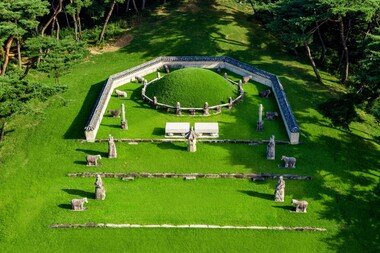‘교수장관’은 가라! ‘주간동아’ 627호는 마치 군사독재시대의 ‘군바리는 가라’를 연상시키는 타이틀로 시작했다. 세상이 바뀌기는 확실히 바뀐 듯하다. 어느 당의 국회의원 공천 내정자 20%가 변호사 출신이라고 한다. 언론종사자들도 꽤 많이 정치권을 기웃거린다. 그런데 왜 교수장관은 가라고 할까? ‘대학 찍고 권력으로 간다’ ‘줄 대고, 경쟁자 헐뜯고, TV에 얼굴 팔고’ 등의 기사와 ‘노벨상 수상자라도 장관 직행 어림없는 일’은 모두 교수 출신이 장관 되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교수 가운데 장관이 된 사람들 대부분은 제대로 학자 노릇을 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베스트 중 베스트’라고 한 것이 이상하다. 그냥 ‘베스트로 친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야 했는데….
우리 사회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에서 ‘상공농사(商工農士)’로 바뀌었다. 군사정권 이후 4명의 대통령 중 3명이 상고(商高) 출신이었다. 대학에서는 경영대가 최고의 학문으로 행세한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국가의 관심과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문사철(文史哲)의 인문학은 불치병처럼 기피 영역이다. 겨우 지난 1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다. 사(士)의 영역에 속한 인간이 느끼는 변화다. ‘교수(巧手)’ 운운한 편집장의 글은 이런 사회와 대학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장관 자리만 보았다.
‘교수장관’은 가라가 아니라 ‘정치교수’는 가라고 해야 했다. 상(商)의 시대에 ‘지식’을 통해 돈과 권력을 얻으려는 것은 전문직업군의 경력개발 행동이다. 이런 경력개발은 기자,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직업군에 속한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교수도 그중 하나다. 대중민주주의의 한 모습이다. 최고경영자(CEO), 정치인, 행정가의 역할과 전문직업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돌팔매에 교수 = 정치한량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 군사정권시대 정치군인 때문에 더 많은 군인들이 억울해한 심정이 이제 이해가 된다.
‘교수 죽이기’가 강해서인지 다른 기사는 다 죽은 것 같다. ‘새 정부 인사시스템 만신창이 출범의 속내’와 ‘직무적성 맞아야 성공한다’는 뜬금없이 장관이 된 교수들의 직무적성을 생각하게 했다. 정말 직업 성공 가능성이 ‘직무적성’에 의해 결정될까? ‘기업은 적재적소 인재 배치 후 지속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만, ‘기업’ 대신 ‘정부’로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뻔한 소리, 옳은 소리였다.
 ‘태평양전쟁 유족들 대물림 한과 통곡’ 기사는 아직도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안고 살고 있음을 알려준다. “가자! 몽골로”는 자원 확보를 위한 ‘몽골 앞으로’의 실체를 담았다. ‘앞뒤 안 가리다 큰 화를 부른다’는 뻔한 결론이었지만,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자원외교의 현재 모습을 잘 알려주었다.
‘태평양전쟁 유족들 대물림 한과 통곡’ 기사는 아직도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안고 살고 있음을 알려준다. “가자! 몽골로”는 자원 확보를 위한 ‘몽골 앞으로’의 실체를 담았다. ‘앞뒤 안 가리다 큰 화를 부른다’는 뻔한 결론이었지만,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자원외교의 현재 모습을 잘 알려주었다.
황상민 연세대 교수·심리학
우리 사회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에서 ‘상공농사(商工農士)’로 바뀌었다. 군사정권 이후 4명의 대통령 중 3명이 상고(商高) 출신이었다. 대학에서는 경영대가 최고의 학문으로 행세한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국가의 관심과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문사철(文史哲)의 인문학은 불치병처럼 기피 영역이다. 겨우 지난 1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다. 사(士)의 영역에 속한 인간이 느끼는 변화다. ‘교수(巧手)’ 운운한 편집장의 글은 이런 사회와 대학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장관 자리만 보았다.
‘교수장관’은 가라가 아니라 ‘정치교수’는 가라고 해야 했다. 상(商)의 시대에 ‘지식’을 통해 돈과 권력을 얻으려는 것은 전문직업군의 경력개발 행동이다. 이런 경력개발은 기자,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직업군에 속한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교수도 그중 하나다. 대중민주주의의 한 모습이다. 최고경영자(CEO), 정치인, 행정가의 역할과 전문직업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돌팔매에 교수 = 정치한량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 군사정권시대 정치군인 때문에 더 많은 군인들이 억울해한 심정이 이제 이해가 된다.
‘교수 죽이기’가 강해서인지 다른 기사는 다 죽은 것 같다. ‘새 정부 인사시스템 만신창이 출범의 속내’와 ‘직무적성 맞아야 성공한다’는 뜬금없이 장관이 된 교수들의 직무적성을 생각하게 했다. 정말 직업 성공 가능성이 ‘직무적성’에 의해 결정될까? ‘기업은 적재적소 인재 배치 후 지속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만, ‘기업’ 대신 ‘정부’로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뻔한 소리, 옳은 소리였다.

황상민 연세대 교수·심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