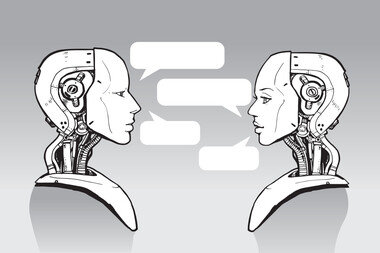비가 자주 와서 약수터의 수량이 넉넉하면 사람도 여유 있어 보인다. 그러나 어쩌다 날이 가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만 마음들이 조급해져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긴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물통을 들고 와 뒷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이도 있다. 그 욕심을 탓한 사람도 그 다음부터는 덩달아 큰 통을 들고 나타난다. 나만 손해 볼 수 없다는 심산이 맞부딪치다 보면 약수터 인심이 금세 흉흉해진다.
그러나 약수터는 머지않아 평상을 되찾는다. 틈만 나면 주변 청소를 하면서 약수터에 공을 들이는 노인들 때문이다. 이들이 나서서 염치 없는 사람을 나무라면 사태는 곧 ‘진압’된다. 무어라 대거리하고 싶어도 노인의 권위 앞에서는 버티지 못한다. 속으로만 불만을 삭인 사람도 용기를 얻는다. 노인들이 있는 한 약수터는 흔들리지 않는다. 공정한 사리판단으로 기강을 잡아주는 까닭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 분들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지 않는 것이 여간 아쉽지 않다.
약수터가 모이면 곧 사회가 된다. 크든 작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옳고 그름을 따져주는 판관(判官)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질서가 서는 것이다.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John Locke)는 사람이 왜 자연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를 만들었는지 설명하면서 법의 역할을 강조한다. 자연상태에서는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생각과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자칫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쉽다. 시시비비를 가릴 법이 없고 그 법에 따라 재정(裁定)하고 집행할 공적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이토록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는 이유도 법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법은 있으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냉소와 타기(唾棄)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오래 전 일이다. 법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곳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피할 길이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온통 갈라지고 쪼개졌다. ‘국민의 정부’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다. 쟁점이 되는 사안마다 의견이 갈리고 대립의 각이 첨예해진다. 문제를 풀어보자고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일은 오히려 악화만 될 뿐이다. 상대방을 굴복시킬 궁리만 하니 다른 주장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증오와 적대감이 증폭하니, 이래 가지고서야 같은 나라에 산다고 할 수도 없을 지경이다.
민주주의가 생각과 감정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다원주의라 해서 ‘콩가루 집안’을 연상해서는 안 된다. 무수히 많은 인간관계의 그물 속에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cross-cutting) 자신의 주장을 완화, 수정해 가는 것이 다원주의의 원리다. 낮에는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싸우더라도 밤이면 동창의 신분으로 같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언론개혁에 대한 생각이 엇갈리더라도 같은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동질성을 통해 접점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다원주의는 이 바탕 위에서 생동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사회에 대한 관점과 출신 지역, 정치적 호불호(好不好)가 서로 중첩하면서(coinciding) 양극체제로 편가름하기 때문이다. 갈등이라는 말로는 성이 안 찰 만큼 남-남 분열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법은 침묵만 하고 있다. 딴 것은 몰라도 적어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만은 법이 할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인식 공동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아니, 차라리 일이나 그르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래서 법의 공백을 메워줄 어른의 존재가 아쉬운 것이다. 공정하게 훈수할 원로가 그리운 것이다. 나무랄 것은 나무라면서 사회적 합의의 기틀을 다시 세울 ‘노인’이 나와야 한다. 약수터나 정치판이나 사람 사는 원리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