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 전경.
“운도 이런 대운(大運)이 없다. 이게 모두 조상 잘 둔 덕이다.”
10팀이 종주에 나서면 한두 팀만 볼 수 있다는, 그것도 10초 이상은 보기 어렵다는 백두산 천지를 각 봉의 꼭대기 능선을 걸으며 10시간 이상 본 동료들이 복에 겨워 내뱉은 말이다.
매해 한 곳 이상의 언론사가 백두산 천지 외륜봉을 종주하기 위해 중국 지린성(吉林省)을 찾지만 맑은 하늘의 백두산 천지를 앵글에 잡아오는 데는 거의 실패했다. 카메라를 꺼내는 순간, 천지가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안개, 구름, 비, 바람 등 시시각각 기후가 변하는 백두산에서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내려온 팀도 우리가 유일하단다. 우리는 천지 종주를 한 팀 중에서는 유일무이하게 햇빛 화상을 입은 팀으로 기록됐다. 보기에는 안 좋지만 영광스런 화상임이 틀림없다. 내년부터는 북한 쪽에서 올라가는 종주 코스도 허용된다고 하니, 이제 절반의 봉우리만 남은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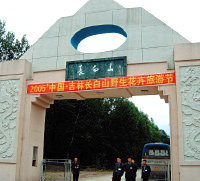
서파 산문.
백두산의 봉우리는 모두 16개로 이중 절반이 북한에 있고 나머지가 중국 쪽에 있다. 백두산을 오르는 길은 동서남북 네 갈래 길이 있지만 현재 오를 수 있는 길은 중국 쪽의 북파와 서파밖에 없다. 파(坡)는 중국말로 언덕이란 뜻. 압록강에서 올라가는 남파와 동파는 북한에 있기 때문이다. 1998년 시인 고은은 동파를 통해 천지에 올랐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중국 쪽 북파는 가장 일찍 열린 길로, 차가 해발 2670m의 천문봉 턱밑까지, 즉 천지에서 5분 거리까지 다닌다. 그에 반해 장대한 고원지대인 서파 코스는 중국 쪽 봉우리 능선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10시간 이상을 걸어 북파 쪽 장백폭포로 걸어 내려가는 코스다. 장장 14km.
조상 잘 둔 덕에 10시간 천지 구경
천지 트레킹 지도.
종주의 시작점은 덩 샤오핑이 쓴 현판이 이채로운 서파 산문. 본격적인 종주에 들어가기 전 야생화 천지인 고산화원과 만주족의 성지인 왕지, 소협곡인 쌍제자하, 골의 깊이만 100m에 달하는 금강대협곡을 거쳐 백운봉 산장에서 하루를 묵어야 한다. 1998년 산불이 나기 전까지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금강대협곡의 장대함에 압도당하고, 왕지 가는 길의 야생화가 지천인 들판에서 꽃향기에 취한다. 깜깜한 백운봉 산장에서 올려다보는 별 무더기는 ‘쏟아진다’는 표현 그대로다. 하지만 백운봉 산장의 시설은 그야말로 ‘횡포’에 가깝다. 이곳이 한국이 아니라 중국 땅임을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다.

① 마천우 가는 길. ② 금강대협곡. ③ 5호 경계비(조선 쪽).
다음 날 새벽, 컵라면으로 허기를 때운 일행은 1386개의 계단을 올라 북한과 중국의 경계지점인 5호 경계비에 도착했다. 국경 표시라고 해봐야 경계비석과 짧은 철조망뿐. 종주팀의 대부분은 북한 쪽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다. 사실상 법 위반이다. 누군가 한국에 가서 통일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떤다. 기자는 슬그머니 철조망을 중국 쪽으로 밀어놓았다. 북한 쪽 땅이 30cm 정도는 늘어난 셈이다. 그 위에서도 천지가 보인다는데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천지를 보지 못할 확률이 90%를 넘는다는 가이드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
마천우(2564m)를 향해 능선을 타고 걷기 시작하자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리고 햇볕이 한 줌, 두 줌 손에 잡힌다. 드디어 안개가 걷히고 해가 뜬 것이다. ‘와’ 하고 함성이 터진다. 오른쪽에는 시퍼런 천지가 모습을 드러내고 왼쪽으론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막 뛰어다닐 것 같은 야생화 구릉이 끝없이 펼쳐진다. 행복하다.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 그리고 천지, 꽃, 땀, 이 모든 것이 너무 좋다. “아 천지여! 천지여!” 입 안에서 탄성이 절로 나온다. 다음 봉우리인 청석봉(2662m)은 내려오는 길이 매우 가파르다.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잘 부서지는 화산석이 대부분인 이곳의 밑은 바로 절벽, 식은땀이 흐른다. 곳곳에서 “돌 조심”이라는 소리가 연달아 나온다. 부서진 돌이 앞서 내려가는 사람의 머리에 떨어져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지 서식 산천어회 최고의 맛
왕지 가는 길의 야생화 군락은 끝이 없다.
그렇게 봉을 오르고 내려오기를 몇 번 했을까. 드디어 중국 쪽 백두산에서 가장 높다는 백운봉에 도착한다. 정말 힘들었다. ‘내가 미쳤지, 여기에 왜 왔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할 수 있을까? 이곳이 ‘깔딱고개’로 불리는 이유를 그제야 이해했다. 해발 2691m의 백운봉 꼭대기, 천지의 전경이 한 앵글에 들어오는 곳이다. 사람들이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백운봉 아래로는 고산초원이 펼쳐진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초원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 야생화 천지의 구릉. 누군가 호범꼬리, 장백제비꽃 등 야생화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한다.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등산복을 밑에 깔고 썰매 타듯 내려가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꽃들에 둘러싸여 먹는 도시락의 맛이라니. ‘꿀맛’이란 표현으로도 모자란다. 거기서 그냥 살고 싶었다.

야생화 천지의 백두산 꼭대기 구릉(왼쪽)과 쌍제자하.
급경사 때문에 죽음의 코스로 알려진 달문을 통해 천지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절을 하기 시작한다. 현장소장님은 천지 물을 담으며 공사의 안전을 빌고, 누구는 또 무엇을 빌고…. 천지에 발을 담그자 바로 온몸에 쥐가 올랐다. 물이 시리도록 찼기 때문이다. “
이렇게 찬 물에 무슨 괴물이 살겠냐. 거짓말이다.” 맞는 소리다. 하지만 이곳에도 단 한 종류의 어류가 산다. 산천어가 바로 그것. 북한 쪽에서 50가지 종류의 어류를 풀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아 천지의 유일 어종이 된 녀석이다. 중국이 국제동물보호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덕에 우리 일행은 산천어 회를 먹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쇠고랑 찰 일이다. 우리나라의 그 어느 폭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장대한 장백폭포를 뒤로하고 긴 종주를 끝마치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백두산 천지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나는 왜 사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민족의 성산’이기 때문이라는 답은 어쩐지 궁색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내년 북한 땅 백두산에서 찾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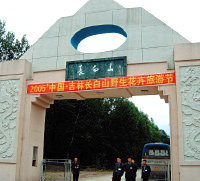




















![[영상] 새벽 5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헬멧 쓴 출근 근로자 8열 종대로 500m](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b1/2f/08/69b12f0800eaa0a0a0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