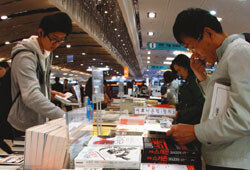사태의 전말은 이렇다. 저작자와 이에 인접하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저작권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고 허락하는 범위나 조건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사후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7일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했다(문체부 고시 제 2012-18호).
이 고시에 따르면 대학은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량을 산정해 지급하는 종량방식과 학생 1명당 연간금액을 정해 지급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해 지급할 수 있다. 종량방식의 경우 어문은 A4 용지 1쪽당 7.7원(파워포인트는 1장당 3.8원)이고, 학생 1명당 연간금액은 2011년 기준으로 일반대학 1879원, 전문대학 1704원, 원격대학 1610원이다. 영국 1만2000원, 호주 4만3000원, 프랑스 7400원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1879원은 저작권자들의 희생과 양보로 책정된 금액이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5개 대학기구 대표로 구성된 ‘수업 목적 저작물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학비대위)는 고시를 무시한 채 출판계와의 협상에서 보상금을 800원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던 대학비대위는 대학교수 5만7000명으로부터 “본인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되, 대학수업에서 고품질의 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본인은 본인의 저작물을 ‘대학에서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확보했다면서, 전국 대학에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의 보상금 지급 계약 체결을 지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출판계는 이 행위가 대학생의 불법 복사를 사실상 허용하자는 움직임으로 보고 크게 반발한 것이다.
지금은 종이책이라는 특정 미디어에서 해방돼 다양한 미디어와 창조적 조합이 가능해지고, 콘텐츠의 잠재 가능성을 무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 우위’의 시대다. 저작권은 살아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절판본’마저도 디지털기술과 네트워크기술을 잘만 활용하면 상업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기업은 이런 비즈니스를 현실화하려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방대한 양의 절판본 콘텐츠를 디지털화해 검색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1958년 출생.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학교도서관저널’ ‘기획회의’ 등 발행. 저서 ‘출판마케팅 입문’ ‘열정시대’ ‘20대, 컨셉력에 목숨 걸어라’ ‘베스트셀러 30년’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