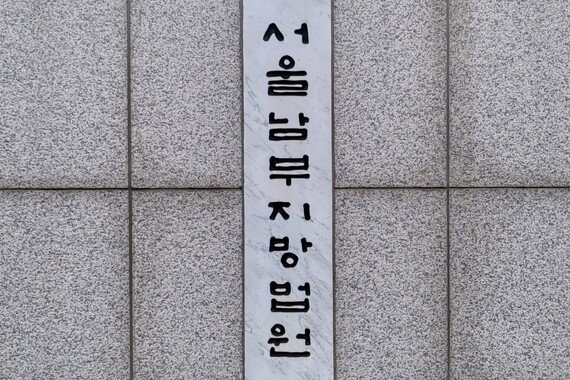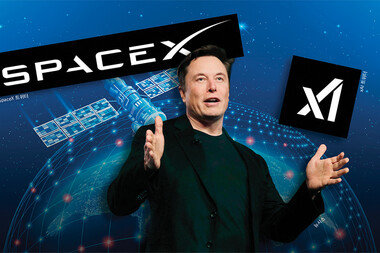쇼 비즈니스의 권력은 예로부터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 70년이 넘는 한국의 대중음악사 역시 여성 음악인들을 통속적인 연예산업의 꽃으로 대우해 왔다. ‘사의 찬미’의 윤심덕에서 지금의 핑클과 S.E.S.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남성 중심주의의 관음적 마케팅의 산물이었다.
서갑숙을 캐스팅해 화제가 된 영화 ‘봉자’(박철수 감독)의 사운드트랙을 맡은 이 키 큰 여인에게선 모딜리아니의 외롭게 깎아지른 여자, 혹은 여자가 되어 버린 ‘고도를 기다리며’의 등장인물 냄새가 난다.

소녀에서 여인으로, 엔터테이너에서 아티스트로 진화한 그의 분기점은 95년 6집 ‘공무도하가’부터였다. 그는 이 앨범에서 비(非)서구의 신비와 영감을 서구의 어법을 고용하여 독자적인 자신의 발성으로 재구성한다. 그것이 이상은, 혹은 아홉번째 앨범에서 스스로 자신에게 명명했던 이름 ‘리체’가 그리고 있는 음악 구상이다.
이 앨범은 현실을 단 한순간도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이 일련의 앨범의 존재 자체가 황폐한 시장 논리에 대한 저주이다. 그리고 시장은 이 앨범을 무시함으로써 저주할 것이 틀림없다.
이상은. 그는 80년대 들어 팽창하기 시작한 방송 매체와 스타 시스템이 만든 90년대형 여성 아이들 스타였다. 88년 강변가요제 그랑프리를 통해 대학 초년생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 껑충한 키, 재치 있고 재기 넘치는 자기 표현, 어설프지만 개성 있는 무대에서의 액션,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을 장식하는 패션 감각. 하지만 비정한 쇼 비즈니스의 세계는 곧 그를 절망시키고 표절시비로 얼룩진 두번째 앨범(1989)을 분기점으로 환호의 틈바구니에서 실종된 자아의 정체성을 찾아 기약 없는 여행을 시작한다.
1991년 이상은은 뉴욕에서 혼자만의 작업으로 세번째 앨범 ‘더딘 하루’를 완성하여 본격적인 싱어송라이터의 문을 열었고 95년 일본에서 녹음한 통산 여섯번째 앨범 ‘공무도하가’를 통해 드디어 자기 내면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이어진 97년의 ‘외롭고 웃긴 가게’는 엔터테이너에서 아티스트로 거듭난 그의 고독한 별 찾기가 이 황폐한 음반시장에 던지는 일종의 반어법과 같은 것이다. 그는 인기와 부귀의 양탄자를 잃었지만 그 자신을 되찾았고 우리는 한 명의 아이들 스타는 잊었지만 한 명의 아티스트를 얻었다. 이 이상 행복한 일이 어디 있으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