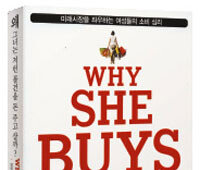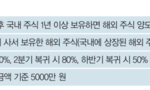그렇다면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직업군도 따로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답은 누가 뭐래도 광고인이 아닐까 한다. 고정관념이라 비판받아도 어쩔 수 없다. 격식보다는 자유로움을 추구할 듯한 이들이 광고인이다. 옷장에 정장 바지보다는 최신 유행의 청바지를 많이 갖추고 살 것 같은 사람들이 광고회사에 몸담은 이들인 것이다.
여기 자신들의 이미지와 딱 맞는 옷, 청바지에 대한 사유 보고서를 낸 광고인들이 있다. 광고계에 첫발을 내디딘 이들이 ‘청바지’라는 화두로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고 다듬어 만들어낸 책 ‘청바지 세상을 점령하다’. 책은 광고인이 가진 톡톡 튀는 발상에 더해 그들의 깊이까지 드러낸다. 노동자 계급이 입는 값싸고 편한 바지에서 반항의 상징, 나아가 미국의 상징으로 이미지를 한 겹 한 겹 쌓아 올려가는 청바지의 역사를 되짚는다. 그 안에는 패션의 역사와 이데올로기, 현대사회 읽기까지 7명 저자의 통찰이 담겨 있다.
책은 국내 광고회사 TBWA KOREA 신입사원의 직장 내 훈련에서 시작한다. 역시 광고회사답게 신입사원에게 시행한 입문 교육이 독특하다. 그것은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발표를 하는 것이었다. 그 훈련의 마지막 과제가 “청바지를 읽어라. 청바지는 어떤 점에서 크리에이티브한가?”였다. 그때부터 7명의 신입사원, 그들의 거침없는 탐구가 시작된다.
‘마인드 맵’은 광고인들의 아이디어 발상법 가운데 하나다. 하나의 생각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들. 이 책은 그것을 닮았다. 저자들의 사유는 거침없이 자유롭게 펼쳐진다. 동시에 깊이 파고든다. 이들의 작업을 따라 청바지는 프래그머티즘에서 팍스아메리카나로, 제임스 딘에서 양희은으로, 노동에서 여가로, 미국에서 세계로, 실용에서 사치로, 마초에서 페미닌으로, 반항에서 제도권으로, 해방에서 구속의 이미지로 변모해나간다. 청바지와 관련한 수많은 이미지가 역사, 이데올로기, 문화, 패션과 함께 버무려진다.
그렇다면 이들이 본 오늘날 청바지는 어떤 모습일까?
최근 할리우드 톱스타의 파파라치 사진과 함께 국내에 안착한 ‘프리미엄 진’이 유행 중이다. 이들 ‘명품 청바지’는 기존 청바지 브랜드와는 다른 차별화 전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한 땀 한 땀 직접 바느질한 세밀함과 고품질의 소재를 갖춘 이들은 브랜드로 자신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우리 현실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품목이 됐다. 너도나도 ‘프리미엄 진’을 입고자 한다. 하지만 이 ‘진’을 입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실로 눈물겹다. 이들은 21세기형 신종 코르셋이다. 남녀 구분 없이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필수다. 이 청바지가 조금이라도 더 잘 어울릴 수 있게 몸매를 가꿔야 한다. 때론 (남녀 모두) 높은 굽의 힘도 빌린다. 더 이상 청바지는 노동자가 쉽게 입는 튼튼한 바지가 아니다. 멋 부리지 않아도 그럭저럭 괜찮아서 입는 옷이 아니다. 내가 청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이제는 청바지가 자신을 입어줄 사람을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금 젊은 세대에게 청바지는 또 다른 상징이다. 청바지는 디자인만큼이나 이미지도 계속 변모한다. 새로운 시대, 청바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될까. 또 여기서 읽을 수 있는 현대사회의 코드는 무엇일까.
광고는 조금 특이한 구석이 있다. 가볍고 재미있다. 그러나 이 가벼운 결정체를 얻기 위해 광고를 만드는 이들은 치열하게 파고들며 깊이 통찰한다. 책은 저자를 닮는다. 이 책도 마찬가지다. 책은 얇고 가볍다. 그러나 시공간을 넘나들며 연구한 깊이가 눈에 보인다. 어떤 책보다 많은 정보와 사유가 담겨 있다. 이런 독서법도 가능하다. 책은 최대한 가볍게 보자. 그러나 두고두고 씹으며 나만의 사유를 확장해나가자.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 가볍게 보여주며 오래 생각나게 하는 광고를 따라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