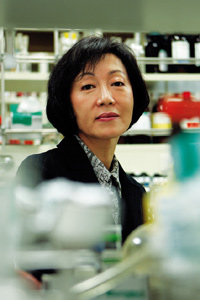
。1948 전북 전주 생<br>。1967 경기여고 졸<br> 。1971 서울대 화학과 졸(학사)<br>。1976 미국 시카고대 이학박사(화학) <br>。1977 한국과학기술원 대우교수<br>。1977~현재 서울대 교수<br>。2001 제1회 여성과학기술자상 수상(이학 부문)<br>。2004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학술연구 부문) 선정<br>。2005 국가석학 선정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는 그의 목소리는 여리면서도 단호했다. 과학자의 얼굴이 지면에 오르내리는 게 볼썽사납다는 이유였다. 그는 ‘기자를 만나지 않는다’는 다짐을 20년 넘게 지켜오고 있다고 했다.
1월17일 오후 기자는 서울대(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그의 연구실을 찾았다. 자연대 실험실은 낡고 을씨년스러웠다. 이웃한 수의대와 달리 경비원은커녕 보안 장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의 연구실은 3층 한가운데에 있었다. 대학원생들은 화학약품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화학부 백명현(58) 교수가 이 실험실의 주인. 논문을 정리하고 있던 그는 “차 한잔 하고 간다더니 사진기자까지 왔느냐”며 당혹스러워했다.
“과학자는 실험실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인터뷰를 하거나 실험실 밖을 기웃거려서는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없어요.”
백 교수는 1월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선정한 ‘국가석학’ 11명 중 홍일점으로 1977년 서울대 교수로 부임해 30년 가까이 ‘신(新)물질’을 만들어온 전이금속 분야의 권위자다. 그는 어려서는 ‘신동’, 어른이 돼서는 ‘천재’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으되, 게으르지 않았고 만족하지 않았으며 늘 새로워지려고 노력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연구는 오래된 유행가를 부르는 것과 같아요. 나는 비슷비슷한 것은 싫습니다.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자기를 단련하는 게 인생 아닌가요.”
그는 부드러움과 독기를 함께 지닌 ‘실험 중독자’다. ‘새로움’은 그의 삶을 가로지르는 키워드.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걷다 보니 연구 성과마다 ‘세계 최초’라는 수식이 따라붙는다. 그는 초분자와 실버나노입자가 어우러진 물질을 최초로 만들었으며, 공해 물질인 이산화탄소가 연료로 쓰이는 메탄가스로 바뀌도록 돕는 화합물을 처음으로 합성해냈다.
신물질 개발 끊임없는 연구 … 숱한 ‘최초’ 행진에도 여전히 ‘배고파’
이렇듯 최초 행진을 벌여왔음에도 그는 여전히 ‘배고파’ 보였다. 침을 꼴깍꼴깍 넘기며 새 연구과제를 설명하는 모습이 꼭 어린아이 같다. 자동차에 쓰일 수소 연료와 관련한 이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보안 사항’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구상돼 실험을 거쳐 새로 발견될 ‘물질’이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놓을지 자못 궁금하다.
백 교수는 피부색과 성(性)의 한계를 ‘열정’으로 뛰어넘었다. 국제 과학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높지 않다. 백 교수 역시 어렵게 완성한 논문을 외국 학자들이 믿어주지 않은 때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실험을 계속했다. 발표한 SCI(과학논문인용색인)급 논문 수가 75편으로 많지 않은 이유다. 그럼에도 SCI 논문 피인용 횟수는 1700회를 넘어선다.
“이름을 달고 나가는 논문은 ‘작품’입니다. ‘생산성’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논문 수를 늘리기 위해 성과를 부풀리는 풍토는 사라져야 합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빚듯 묵묵히 기본을 지킬 때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믿어요.”
백 교수는 22세에 결혼했다. 석사과정 첫 학기 때 아들을 낳았고, 그 아래로 쌍둥이 딸을 두었다. 남편은 서울대 화학부의 서정헌(58) 교수로, 두 사람은 67학번의 소문난 캠퍼스 커플이었다. 서 교수는 “아내는 어머니, 며느리, 과학자의 역할을 모두 훌륭히 해낸 의지가 굳은 여자”라고 평가했다.
“첫아이를 낳고서는 공부하랴, 우는 아이 다독거리랴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러나 가족과 공부 둘 중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백 교수)
결혼하자마자 미국 시카고대학으로 유학을 떠난 부부는 76년 나란히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77년 백 교수 부부의 교수 임용은 언론에 소개될 만큼 화제였다. 여성 교수가 드문 시절인 데다 부부가 함께 서울대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분위기로는 부부가 같은 학과에서 근무할 수는 없었다. 결국 백 교수는 사범대 화학교육과, 서 교수는 자연대 화학과(현 화학부)로 발령받는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백 교수가 ‘손해’를 본 것이다.
“화학교육과의 실험실은 엉망이었습니다. 학교의 지원도 거의 없었고, 기자재도 턱없이 부족했지요.”
그는 화학부로 자리를 옮긴 99년까지 6평 남짓한 작은 실험실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 대학원에 들어온 학생 3명을 가르치면서 연구했다. 그럼에도 10명 안팎의 이학석사·박사급 연구원을 둔 다른 실험실들에 밀리지 않았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연구성과를 잇따라 내놓은 것이다.
“연구실에 틀어박혀 실험만 했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열정은 누구에게도 뒤져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 때면 열정으로 나를 다 태워 불을 일으키자고 다짐하곤 했어요.”
국가석학에 선정되면서 그는 최고 과학자 반열에 올랐다. 새로움에 대한 희구와 진리에 대한 열정 덕분일 것이다. 그는 97년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과학학술지 ‘코오디네이션 케미스트리 리뷰’(Coordination Chemistry Review’s)’의 편집위원으로 일했고, 2001년엔 초분자화학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로 제1회 여성과학기술자상을 받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백 교수가 이따금 떠올리는 ‘어린왕자’의 한 구절이다. 백 교수는 이 글귀를 ‘모티프’로 오늘도 새로운 것을 찾아 모험을 떠난다. 어린왕자처럼 순수하고 맑은 이 과학자는 후학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힘 안 들이고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 힘들더라도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 인생의 가치와 행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