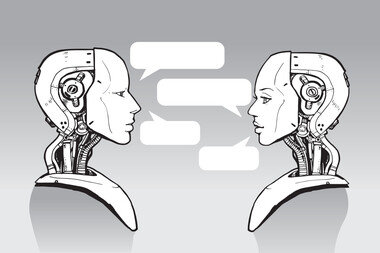빅토르 최는 화부였지
빅토르 최는 화부였지만 노래를 불렀어
빅토르 최는 화부였지만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는 시였어
우리는 모두 노래들인지도 몰라
노래를 멈추지만 않는다면 멈추지만 않는다면
나무는 가수였지
나무는 가수였지만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
나무는 가수였지만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불리지 못한 노래는 울음이었어
우리는 모두 울음들인지도 몰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칙칙폭폭 기차는 달려가네
칙칙폭폭 화부의 노래는 활활 타오르고
칙칙폭폭 나무의 울음은 전속력으로
칙칙폭폭 나무는 달려가네
칙칙폭폭 비는 내리고
중얼거리는 나무 마디마디
사나운 허무들과 싸우는 영혼들
칙칙폭폭 그 빗물로
슬픔의 수력발전소를 쉼 없이 돌리네
우리는 모두 노래들인지도 몰라
우리는 모두 울음들인지도 몰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 안현미,‘이별의 재구성’(창비, 2009)에서
인생의 무대 위, 우리는 가수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입이 헤 벌어진다. 몸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놀랍기만 하다. 거기에 목소리까지 좋으면 나는 거의 소스라친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 온 신경을 그쪽에 집중하는 것이다. 귀와 가슴을 한껏 열어젖히면 늑골이 켜켜이 내려앉는다. 소리 없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지금은 너의 무대이므로, 다름 아닌 너만의 무대이므로. 동시에 내 몸은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한다. 음의 두께를 재고 음의 명도, 음의 점성, 음의 촉감 등을 파악하려고 아득바득 안간힘을 쓴다. 그렇게 나는 노래와 하나가 된다. 가수가 노래를 ‘멈추지만 않는다면’ 언제까지고 그렇게 있을 수 있을 것만 같다.
가수가 되는 게 꿈인 친구가 있었다. 그는 종종 나를 대신해 노래를 불러주었다. 자율학습을 끝내고 터벅터벅 기숙사로 돌아갈 때, 시험이 끝나고 운동장 벤치에서 바람을 쐴 때 친구는 언제나 고맙게도 내 옆에 있어주었다. 변성기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맑디맑았다. 나는 그저 ‘나무’처럼 곁에 앉아 그의 목소리를 바람 삼아 표표히 나부끼면 됐다. 그 순간엔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나 자신이 음악 같았다. 낼 수 있는 유일한 울음 같았다. 이렇듯 잠자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번번이 전율에 사로잡혔다. 친구는 내가 없는 부위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듯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악기가 된다는 게, 나아가 음악이 된다는 게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앞날이 그지없이 불투명했던 시기,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나마 투명해질 수 있었다. 친구의 목소리와 친구의 마음은 내게 그렇게 또 하나의 부위가 됐다. 나는 그 부위에 의지한 채 십대의 마지막 시기를 간신히 견뎌냈다.
세월이 흘러 친구는 고향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다. ‘화부였지만 노래를 불렀’던 그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불을 때고 있다. 불을 때며 목청껏 노래를 부른다. 변성기를 관통했음에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디맑다. 친구의 노래가 사방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생선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헤 벌린 채 노릇노릇 익어간다.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던 친구는 생선을 구우며 주방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된다. 나는 열과 성을 다해 친구가 내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여기는 너의 터전이므로, 다름 아닌 너만의 터전이므로.
문득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음악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개개의 목소리로, 개개의 몸짓으로, 개개의 언어로. 자신의 자리에서 스스로 울음-불씨가 돼 묵묵히 ‘활활 타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칙칙폭폭 비는 내리고’ 음악은 한층 더 구슬퍼지고 그 음악은 가슴에 부딪혀 되울려 나온다. 그렇게 나이를 먹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인생이 한 곡의 노래가 돼, 하나의 음악이 돼 흐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히 말하건대, 나는 가수다. 너는 가수다. 매일매일 ‘사나운 허무들과 싸우는’ 우리는, 모두 가수다.

1982년 출생. 서울대 사회학과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졸업. 2002년 ‘현대시’로 등단. 시집으로 ‘호텔 타셀의 돼지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