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기심 많은 의사들은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이들은 1955년부터 61년까지 사망진단서와 병원 진료 기록을 검토했고, 로세토에서 1.6km 떨어진 또 다른 이탈리아 이민자 마을 방고(Bangor)와 비교도 해봤다. 방고와 로세토 주민은 똑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병원을 이용하지만 심장병 사망률 차이가 또렷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들은 서로를 신뢰했다’

김승섭 고려대 교수가 최근 펴낸 ‘아픔이 길이 되려면’(동아시아)을 읽다 한참 전에 듣고 까맣게 잊고 있던 로세토 마을 이야기를 오랜만에 접했다. 로세토 이야기의 결말은 비극이다. 1965년 이후로는 로세토와 방고 주민의 심장병 사망률 차이가 없다. 로세토 주민에게만 국한해보면, 이 지역 사람들의 심장병 사망률은 1970년이 되자 194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유는 짐작할 만하다. 1960년대 이후 로세토 마을도 이른바 ‘미국화된 것이다. 적자생존의 미국식 자본주의가 마을에 침투했고, 공동체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젊은 세대가 대학 교육을 받고자 마을을 떠났다. 앞에서 언급한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비교적 평등한 공동체가 무너지자 ‘로세토 효과’는 금세 사라졌다.
이제 로세토의 비극을 염두에 두고 스웨덴 최북단 지역 노르보텐으로 가보자. 북국의 외딴 지역인 이곳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립된 채 살아갔다. 자연재해가 닥쳐도 외부 도움을 기대할 처지가 못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세기 노르보텐에는 기근과 풍작이 번갈아 가며 이어졌다. 1800년 기근, 1801년 풍작, 1812년 기근, 1822년 풍작, 1828년 풍작, 1836년 기근 등.
이런 노르보텐에 대해 한 과학자가 흥미로운 연구 질문을 던졌다. 19세기 굶주림과 풍족함을 번갈아 겪었던 노르보텐 아이와 그 후손의 건강은 어땠을까. 마침 이곳 성당의 성직자가 16세기부터 마을 주민의 출생과 사망은 물론이고 토지 소유 관계, 작물 가격, 작황까지 세심히 기록해뒀다. 과학자는 이 자료를 토대로 1905년 태어난 아이 99명의 삶을 추적했다.
결과는 반전이었다. 9~12세 때 갑작스럽게 풍족한 해를 맞아 사춘기(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에 포만감을 누린 소년의 경우 그의 아들과 손자 수명이 비교군보다 평균 32년이나 짧았다. 이 과학자는 사춘기의 갑작스러운 폭식이 당뇨나 심장 문제를 일으켰을 개연성을 염두에 뒀다. 그런 몸의 흔적이 아들이나 손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반면 기근으로 굶주린 겨울을 겪은 소년이 그 시절 (죽지 않고) 견뎌 자식을 낳은 경우 그 후손은 건강이 좋았다. 당뇨,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비교군보다 4배 낮았고, 언급했다시피 평균 수명은 32년이나 길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소녀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단, 소녀는 기근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소년보다 더 어렸다.
이 연구 결과를 어린 소년, 소녀를 굶기면 건강이 더 좋은 후손이 태어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식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갑작스럽게 풍년이 들었을 때 폭식이 소년, 소녀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리 만무하다고 봐야 한다. 또 성장기에 평소보다 더 심한 굶주림을 버텨내고 ‘살아남은’ 소년, 소녀가 그렇지 못한 이보다 더 건강하리라고 예상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이 연구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성장기의 폭식과 굶주림 같은 경험이 자신의 건강을 넘어 후손에게까지 유전될 가능성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떤 경험이 유전자에 각인돼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환경 같은 외부 스트레스가 특정한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고 켠다면 그 영향은 좋든 나쁘든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도 미친다.
이런 접근을 ‘후성유전학’이라 부른다. 이 분야의 연구 성과는 차고 넘친다. 가장 널리 알려진 연구는 엄마를 둘러싼 환경과 자궁 속 태아의 관계다. 엄마 자궁에서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는 어른이 됐을 때 조현병, 우울증, 심장 질환 등을 겪을 위험이 커진다. 그리고 노르보텐의 경우를 염두에 두면 그런 소인이 유전될 가능성도 있다.
어린 시절 환경이 유전자에 각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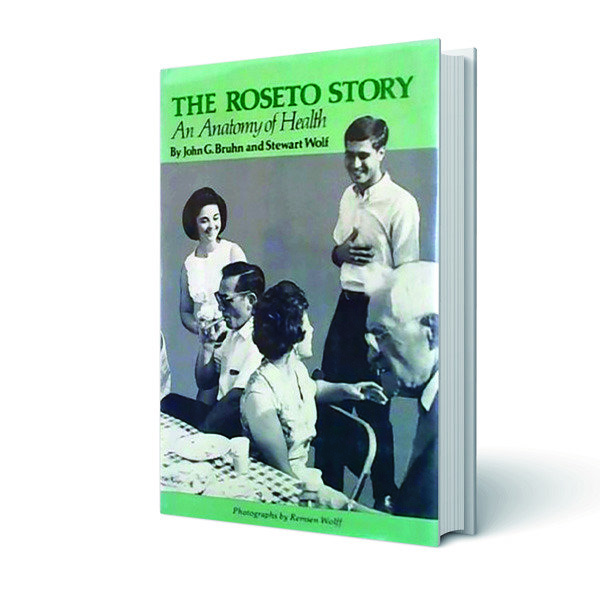
후성유전학의 연구 성과는 ‘유전이냐, 환경이냐’ 같은 이분법에 기반을 둔 논쟁이 더는 의미가 없음을 말해준다. 유전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다. 심지어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태아, 어린 시절, 10대 시절 환경은 유전자에 각인되고 그 영향은 당사자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미친다. 과학자가 분발할수록 이런 상호작용은 확실히 규명될 것이다.
이제 다시 로세토 마을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한때 로세토 주민을 심장병으로부터 지켜줬던 구체적 메커니즘은 여전히 미지수다.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평등한 공동체가 마을 사람 각자의 몸에 세포·분자 수준에서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후성유전학은 바로 이 효과의 비밀을 파헤치는 데도 어떤 통찰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꼭 그 비밀을 몰라도 된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 성과만으로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기근과 전쟁을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경쟁보다 협력, 불평등보다 평등, 성과보다 성취에 기뻐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덜한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도 로세토 마을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어쩌면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