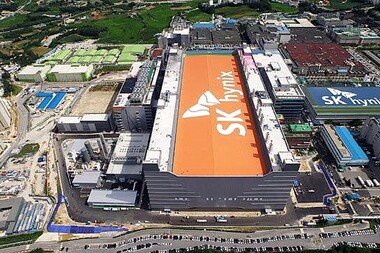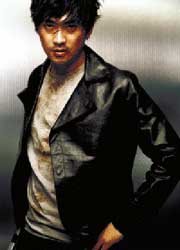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느낌에 휩싸인다. 블록버스터면 다 같은 블록버스터지 어째서 ‘한국형’인가. 블록버스터 앞에 붙는 ‘한국형’은 제아무리 국내 사상 초유의 제작비를 쏟아 붓는다고 해도 ‘매트릭스’ 시리즈에 비교하면 초라할 수밖에 없는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을 곱씹게 만드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 이만한 스케일의 영화를 만드는 곳이 드물다는 자긍심이 녹아 있기도 하다. 그래서 ‘한국형’이라는 말은 모호한 느낌을 준다.
그런데 이 모호한 느낌 때문인지 한국형 블록버스터는 오랫동안 자리를 잡지 못했다. ‘2009 로스트메모리즈’에서 ‘예스터데이’ ‘아 유 레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상당수의 한국형 블록버스터가 만들어졌지만 한결같이 흥행에 실패했다. 이들 한국형 블록버스터는 미래세계나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튜브’는 이 점에서 구별된다. ‘튜브’는 미래나 가상공간이 아니라 대중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을 배경으로 한다. 공항에서의 총격 장면으로 시작되는 ‘튜브’의 오프닝은 다소 어설픈 느낌이 들지만 일단 지하철을 타고 달리기 시작하면 빠르게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비교적 준수한 액션의 관습을 만들어내는 ‘튜브’의 시도는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에 비하면 ‘튜브’는 이루어질 수 없는 두 사람의 사랑에 꽤나 무게를 둔다. 다 이유가 있다.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이르러 눈물의 비장미를 그려내기 위해서다. 정말이지 ‘튜브’는 욕심이 많다. 복잡한 심리묘사보다는 간결한 오락성으로 더욱 밀어붙이는 것이 스피드를 올리는 데 더 적절했다. 멜로의 감성은 스피드를 오히려 반감시킨다. 과거의 실패들을 거울삼아 훨씬 더 냉정했더라면 백운학 감독에게 ‘스피드 3’를 맡아보라는 제안이 들어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칸 마켓에서 판매 성과를 올린 것을 보면 더욱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