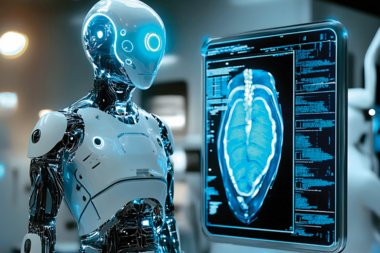백자의 그윽한 색깔에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져 있다. 선인에게 백자로 만든 향꽂이는 신선의 세계를 엿보는 통로였다. 향기로운 냄새로 속계와 선계를 구분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백자 위로 향을 피워 올렸다. 그래서 향꽂이는 의식용 향로와 달리 작은 접시의 중앙에 향을 꽂는 돌기가 있다.
중국 도교의 신선들은 향내 속에서 살아가는 일화를 남겼다. 불교도 향을 피워 부처에게 공양한다. 향로의 우뚝한 산 모양은 불가에서 숭상하는 천상의 수미산을 상징한다.
조선 선비는 불교를 배척하면서도 선승이 차를 마시고 향을 피우던 운치를 이어받았다. 늦은 밤 제사를 올릴 때 향을 피워 경건하게 의식을 지냈으며, 마음 맞는 벗이 오면 향을 피우고 차를 마셨다. 독서할 때도 향을 피워 정신을 맑게 했다. 그래서 선비 방에는 정갈한 모습의 향꽂이가 자리를 잡았다.
조선 백자로 만든 향꽂이는 선비의 기품을 보여준다.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2층 수정 박병래 선생 기증실에 전시된 백자 향꽂이는 몸을 돌리는 도롱뇽 머리 부분에 향을 꽂는 구멍이 있다. 향꽂이를 한참 보면 선계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정갈한 백자 색깔과 점점이 표현된 물방울이 도드라진 그릇은 안정감을 준다(사진 2).
동원 이홍근 선생 기증실에도 백자 표면의 투명한 질감에 푸른빛이 감도는 향꽂이가 전시돼 있다. 중앙 수미산과 그 아래 맞배지붕의 누각이 튀어나왔다. 그 주위를 반쯤 감싼 도롱뇽의 선처리가 유연하다(사진 5).
국립중앙박물관 3층 백자실에 있는 다양한 향꽂이는 새삼 잠자고 있던 상상력을 불러낸다. 푸른 용 두 마리가 난간을 이룬 그릇 위에 작은 향로가 있고, 그 속에 화병이 올려 있는데 화병 입구가 바로 향을 꽂는 구멍이다(사진 4). 또 다듬지 않은 막사발 같은 투박한 그릇에 수미산을 상징하는 봉우리가 솟아 있고, 그 정상 부분에 향을 꽂을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었다. 현대적 감각이다(사진 1). 가장 튀는 향꽂이는 향(香)이란 글자를 4개나 새겨 사방에 붙여놓은 청화백자다. 위에는 향을 꽂는 구멍이 5개나 있어 성격 급한 주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사진 3).
백자 향꽂이는 조선 예술의 명품이다. 실용과 검소를 중시해 간결하고 절제된 미감을 선호하던 선비의 고상한 취향을 잘 보여준다.














![[영상] “달러 수급 불균형 더 심화… <br>대비 안 하면 자신만 손해”](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52/0d/26/69520d26165ea0a0a0a.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