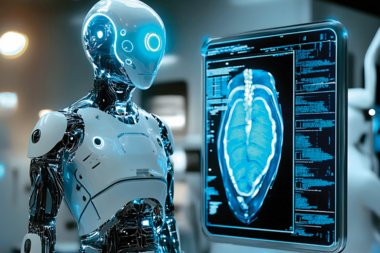<B>박경철</B><BR>의사
‘도덕경’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후학들의 한문 실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노자가 ‘도덕경’을 쓴 시점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던 시대였고, 후학들이 선 세상은 자연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아 자연으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된 곳이다. 따라서 하나의 노자를 두고 중구난방의 해석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에덴동산에서 사과를 따먹던 인간이 자연의 일부였다면, 에덴을 떠나 잎으로 몸을 가리고 수치를 인식하는 순간 인간의 이성은 자연을 인식하는 주체가 돼버렸고, 이렇게 자연에서 분리된 인간과 자연의 괴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졌다. 그 결과 자연과 인간은 긴장과 갈등관계를 넘어,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은 인간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다. 노자는 수천 년 전에 이런 긴장과 갈등의 구조를 간파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다. 노자가 말한 자연은 자연 그 자체이지 인식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다.
한데 후대의 인간은 노자의 자연을 언설(言說)로 이해하고 머리로 해석하려 들었기에 노자의 본질에 제대로 다가가지 못한 셈이다. 사실 노자가 ‘도덕경’ 제1장에서 ‘도가도비상도’를 선언한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른다. 그 선언은 내 말을 머리로 이해하려 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였다. 그러다 보니 노자를 다룬 책은 많지만 어느 것도 ‘텍스트’로 꼽기가 어렵다. 중국이나 대만, 일본에서 나온 책부터 서구 학자들이 번역한 책,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쏟아낸 책까지 노자 관련 저작만 국립도서관 서고 하나를 채우고도 남을 정도인데, 우리는 여전히 노자의 옷자락조차 만져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고민에서 고른 책이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삼인 펴냄)다. 장일순은 노자만큼이나 규정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아직도 많은 이는 그를 지학순 주교와 함께한 민주화 투쟁의 투사로 기억한다. 하지만 다른 이는 지역 교육을 위해 헌신한 교육자로, 또 다른 누군가는 ‘한살림운동’을 시작한 생명운동가로, 또 한편에선 고전에 능하고 글씨와 그림에 조예가 깊은 선비로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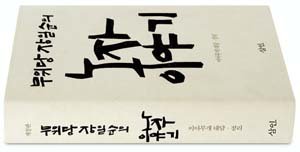
그는 자연을 대상이나 객체로 보지 않고 스스로 자연의 일부로 자연과 한 몸이 되어 살다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이다. 그래서 무위당의 노자는 그 의미가 무겁고 새롭다. 이런 강점이 있는데도 이 책이 지닐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무위당이 직접 쓴 책이 아니라는 점이 그것이다. 이 책은 사적으로 그에게 노자를 사사한 이현주 목사가 그와의 대화를 기록한 책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장일순과 이현주가 노자 도덕경을 두고 대담하다’ 정도가 맞다. 이 책은 장일순이 이 목사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을 빌렸는데, 이 부분이 좀거슬린다. 이 책을 정리한 이 목사의 한학 공부가 예사롭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장일순의 이야기보다 이 목사의 색깔이 더 짙게 입혀져 있다. 이 목사가 ‘이런 것은 이런 것이지요’라고 말하면 장일순이 ‘그렇지’라고 대답하는 식이다.
편찬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의도에 충실하려면 책의 분량을 줄이고 장일순의 이야기로만 구성했어야 했다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편저자인 이 목사의 공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거나 그 덕분에 독자들은 장일순의 노자에 대한 지혜와 해석, 그리고 철학과 사상을 엿볼 수 있게 됐으니 그 점에는 이래저래 감사드릴 일이다.
http://blog.naver.com/donodonsu














![[영상] “달러 수급 불균형 더 심화… <br>대비 안 하면 자신만 손해”](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52/0d/26/69520d26165ea0a0a0a.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