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알라 코뿔소 코끼리 한 칸 한 칸
텔레비전의 채널은 자정으로 돌아간다
태양을 삼킨 열기구가 공중부양 하듯
몸속의 부장품들과 함께 밤사이 증발하는
코끼리 코알라 코뿔소 코가 시큰한 채널들
재가 되기 직전 맹렬히 타오르는
초원의 희뿌연 텔레비전을 보고
코를 훌쩍이며 울어도 될까 한 꺼풀 한 꺼풀
매일 각막을 벗겨내는 재의 시간에
사각의 화면들이 점점 더 네모내지고
차갑게 식은 숯과 피어오르는 매캐한 안개
새들이 잿빛 초원 위를 모빌처럼 맴돈다
살육의 물웅덩이 속에 꾸벅꾸벅 고개를 처박는다
수도꼭지처럼
틀어놓고 잠든 채널 깊숙이
코뿔소 코끼리 코알라 그리고 텔레비전
코알라 코뿔소 코끼리 차갑게 식은 숯처럼
죽은 듯 얌전하게도 죽어 있는
아득한 흙먼지 같은 얼굴들 뿌옇게 일으키는
잠의 주문을 외며 한 칸 한 칸
나는 안에서 잠기고 있다
― 김중일 ‘재의 텔레비전’
(‘아무튼 씨 미안해요’ 창비, 2012)에서
TV를 수도꼭지처럼 틀어놓고…
어릴 때부터 나는 불면과 친했다. 쓸데없는 고민이 많았냐고? 아니다. 스탠드 아래에 엎드려 밤새 책을 읽었냐고? 아니다. 나는 그저 시간이 아까웠을 뿐이다. 그것이 앞으로 가기만 한다는 사실이, 아무리 태엽을 감아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슬펐던 것이다. 기쁜 날에도 시간은 갔고 슬픈 날에도 시간은 갔다. 어김없었다. 틀림없었다. 시간은 정직했고, 정직해서 아깝게 느껴졌다. 딱히 무슨 일이 있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게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잠을 자지 않았던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멍하니 TV를 보았다. 식구들이 깰까봐 볼륨은 최대한 줄인 상태였다. 애국가를 듣고 아니, 보고 나서야 눈을 감는 날이 많아졌다.
몇 시간째 브라운관을 바라보노라면 정말이지 기분이 묘했다. “열기구가 공중부양 하듯” 허공에 붕 떠 있는 것만 같았다. 눈앞에 뭔가가 자꾸 아른거렸다. 손을 뻗어 그것을 잡아보려 했지만 번번이 허방을 쳤다.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는 없는 “희뿌연” 형상이 나를 놀리기라도 하듯 둥둥 떠다녔다. 그것은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바꾸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증발”해버렸다. 또 다른 형상이 눈앞에 나타나 “모빌처럼 맴”돌았다. 어지러웠다. 눈이 피로해지자 이내 귀울림이 시작됐다. 그 소리는 TV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었다. 나는 별을 헤듯, 머릿속으로 구구법을 외웠다. “사각의 화면들이 점점 더 네모내지고” 있었다. 정규방송이 다 끝난 것이다.
한동안 나는 사각의 화면을 지켜보았다.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채널을 건너뛰어도 사각의 화면은 그대로 이어졌다. 아주 잠깐, 눈을 깜박할 뿐이었다. 반쯤 잠든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리모컨을 눌러 “한 칸 한 칸” 채널을 건너뛰면 “한 꺼풀 한 꺼풀” 새벽의 껍질이 벗겨졌다. 서서히 날이 밝고 있었다. 잠자는 것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오은 1982년 출생. 서울대 사회학과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졸업. 2002년 ‘현대시’로 등단. 시집으로 ‘호텔 타셀의 돼지들’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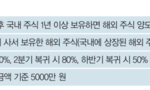











![[영상] 멸종위기 야생 독수리에게 밥을… <br>파주 ‘독수리 식당’](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5c/75/cc/695c75cc0d36a0a0a0a.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