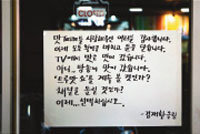
다큐영화 ‘트루맛쇼’는 한국의 많은 맛집이 조작됐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고도 자신의 미각을 의심하는 관객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 다큐영화가 공개됐을 때 관객과의 대화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시청자 수준이 그러니 저런 방송을 보는 것이고, 한국 소비자 입맛 수준이 그러니 저 쓰레기 같은 음식을 맛있다고 줄서서 먹는 것입니다.”
트루맛쇼가 아니어도 나는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녔으며 틈나는 대로 글로 쓰곤 했다. 그러나 자신의 수준이 낮다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늘 조심스러웠다. 트루맛쇼를 보며 말의 강도를 조금 올려도 되겠다 싶었다. 마침내 요즘엔 속내를 다 드러낸다. “한국인의 미각 수준은 미개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으니 미개한 것이다.”
많은 한국인은 6·25전쟁 이후 피폐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50~70년대에는 끼니를 때우는 데 급급했다. 맛있는 무엇을 챙겨 먹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먹을거리 생산과 유통 여건도 열악했다. 1980년대 경제가 급속히 성장 했지만 먹을거리 양을 늘렸을 뿐 질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당시 유행했던 고기 뷔페를 떠올리면 한국인의 미식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그즈음 한국의 식품산업도 급성장했는데, 도시 노동자의 경제 수준에 맞춘 저급한 식재료가 시장을 점령했다. 산분해 간장과 대두박 된장, 빙초산 등이 이를 상징하는 식재료다. 1990년대 들어 비로소 질 좋은 음식에 대한 기호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질 낮은 식재료에 길들여진 입맛은 쉽게 ‘세탁’되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음식, 특히 외식업소 음식이 지금까지 짜고 맵고 달고 신 양념 맛에 기대는 이유는 개발 시대의 그 입맛 ‘전통’(?)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맛을 모르니 약삭빠른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온갖 장난을 친다. 트루맛쇼에서는 대표적 인물로 방송 제작자와 브로커를 보여준다. 이 다큐영화에 캐비아 삼겹살이 나온다. 차게 먹어야 할 캐비아를 삼겹살에 발라 구워 먹으며 최고의 맛이라고 엄지를 치켜세운다. 화면에 이런 자막이 뜬다. ‘한식 세계화 가능성 확인’ 물론 그 캐비아는 싸구려 가짜다. 떡볶이에 푸아그라를 올리면 10만 원에도 팔 수 있는 고급 떡볶이가 된다고 강변하는 요리사가 한식 세계화의 전도사라며 설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음식을 두고 벌이는 장난은 방송에만 있지 않다. 음식 앞에 사회적 권위가 느껴지는 누군가를 세우기만 하면 대단한 음식으로 변한다. 그 권위 입히기에 연예인, 대학교수, 문필가, 정치인, 경제인, 요리사 등이 동원된다. 그들이 무엇을 먹었다 하면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 그 식당으로 득달같이 달려간다. 서울에서 제일 잘나가는 식당들은 입구에 ‘대통령의 맛집’이라는 간판을 달아놨다. 한국의 으뜸 권위자는 대통령일 테니 그들이 다녀간 식당이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트루맛쇼가 개봉하면 맛집 지형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한번 버린 입맛은 쉽게 되돌려지지 않는다. 특히 한국인 열에 아홉은 자신의 입맛이 절대미각 수준인 듯 착각한다.

















![[영상] 새벽 5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헬멧 쓴 출근 근로자 8열 종대로 500m](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b1/2f/08/69b12f0800eaa0a0a0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