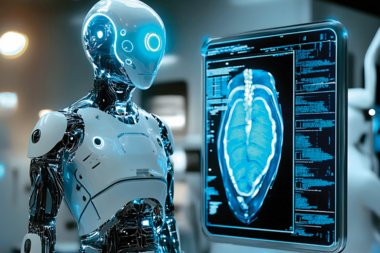기자는 퉁명스럽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의 영어교육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다” “어째서 알 만한 경영인이 또 하나의 영어상품이냐” 하고 쏘아붙였다. 그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영어선생이 아닌 건 맞지만, 평생 꿈꿔온 일을 실천하는 거다. 한국 어린이를 세계의 리더로 만들고 싶다. 영어가 아닌 ‘글로벌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다. 교재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가 중심이다….”
서울서 15년 거주…영어교재 출간
솔직하고 독특한 설명에 역시 그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그는 꽤나 과격(?)한 컨설팅으로 명성이 높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프랑스계 캐나다인이다. 1986년 처음 컨설턴트로 한국에 발을 내디뎠다. 주로 한국 기업에 투자를 타진하는 외국기업이 그의 고객이었다. 외자에 무지한 한국 기업의 빗장을 여는 구실. 당연히 갈등이 있었고, 힘 빠지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홀로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를 만들다시피하며 한국을 활동 근거지로 삼았다.
그는 이제 한국인이나 다름없다. 누구라도 그의 ‘체험적 한국론’에 반박하려 들면 “지난 25년 가운데 15년을 서울에서 ‘실거주’했다”며 ‘짬밥’부터 내세울 정도다. 2~5년 차인 주한 외국인은 그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 2010년 출간한 ‘글로벌 비즈니스 마인드세트’란 책이 ‘히트’한 뒤로는 인기강사 대열에 올라섰다. 윤용로 외환은행장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그가 ‘인기강사’라는 점은 한국의 글로벌화가 얼마나 빨라졌는지를 입증하는 사례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어를 안 쓴다. 실제 한국어가 유창하지도 않다. 하지만 어떤 영어가 한국인에게 편한지는 잘 안다. 순도 100% 영어 강의가 통역 없이 전달된다는 점은 그 자신도 놀라는 대목이다. 그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와 비교하면 한국인의 영어 실력은 상전벽해 수준이라고 한다.
그의 인생 전환점은 2000년 전후해서다. 해외자본과 일했던 그를 해외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이 고용하는 일이 잦아졌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그를 자주 찾았다. 지금도 그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50%, 전체 고용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수호자를 자임한다. 그런데 당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은 참혹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고충을 겪었다.
“어설픈 글로벌화를 목격하면서 안타깝다고 생각했죠. 실력이 좋은 기업이 외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겪는 손실이 막대했어요. 결국은 영어 실력이 관건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문제라고 관점을 바꾼 뒤에야 진전을 보았죠.”
언어란 급하면 다 통하게 돼 있다. 그런데 타(他)문화 수용력이 부족하면 언어도 늘지 않는다. 어째서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 한국인이 끼리끼리 어울리는가. 해외시장을 노리는 기업이 어쩌자고 한국식 사고만 고집할까.
그가 내놓은 해답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선후배 의식을 버리라”는 것이다. 직접 ‘동배’라는 단어를 만들어 알리기도 했다. 선후배 같은 서열의식을 버리지 못하니까 해외까지 나가서도 제대로 된 동지 하나 못 만들고 한국 인맥만 늘려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어휴, 한국인의 DNA엔 선후배가 각인돼 있을 거예요. 그 때문에 글로벌화가 방해를 받아요. ‘동배’란 한국식으로 설명하면 ‘같은 배를 탄 사람’이에요. 구실에 따라 기여할 수 있는 게 달라요. 하지만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갖죠. 이런 동배의식을 확립 못 한 한국인은 절대 해외에서 리더가 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이 밖에도 ‘차이 인정’ ‘독립적 사고’ ‘양방향성’이 한국인에게 필요하지만, 선후배 의식을 없애지 않고는 공염불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동등한 관계다. 문화 차이를 이해 못 하는 ‘에티켓 문맹’까지도 그는 상당 부분 서열의식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다.
“서열의식에 모든 문제가 녹아 있어요. 이를 타파할 글로벌 마인드를 직장인이 돼서가 아니라 어릴 적에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한국의 도덕 교과서를 보니 그런 내용이 아주 빈약하던걸요.”
‘차이에 대한 인식’을 가르쳐야
듣다 보니 그의 영어교육론도 설득력 있었다. 영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 ‘파닉스(phonics)’에 목숨 걸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낯선 문화를 교류하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과 지혜를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혹시 지나치게 서구화한 어린이 교양교육은 아닌지 찔러봤다.
“글쎄, 서구적인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먼저 교류해봤기 때문에 ‘차이에 대한 인식’은 확실하죠. 한국인의 본질을 흔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에선 금연이 상식이잖아요. 그 정도만 이해해도 훌륭한 글로벌 시민이 될 수 있어요. 비즈니스할 때만큼은 더욱 그렇죠. 한국의 전통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훌륭한 건 잘 알아요.”
그는 비즈니스계통에서 일한 전문가답게 통계에 기초해 결론을 내렸다.
“한국은 GDP의 42%를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코 1위죠. 세계는 한국이 없어도 되지만 한국은 절대적으로 세계시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이끌어나갈 한국인 리더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일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도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 한국의 미래를 걱정한다. 기자는 외국인의 이런 태도를 가식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한국이 잘돼야 그들도 한국에서 청춘을 보낸 보람이 생기고, 또 한국에서 살면서 어렵게 터득한 노하우도 사장되지 않는다. 그들과 우리, 그들과 우리나라가 상호의존적 관계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이해한 것이다.
물론 그는 열혈 캐나다 예찬론자다.

미국인도, 프랑스인도 아닌 캐나다인인 그는 ‘현실적 지한파(知韓派)’라고 불릴 만하다. 그는 “캐나다나 한국 같은 미들파워가 연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이런 소망은 어떤 식으로 꽃을 피울까.














![[영상] “달러 수급 불균형 더 심화… <br>대비 안 하면 자신만 손해”](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52/0d/26/69520d26165ea0a0a0a.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