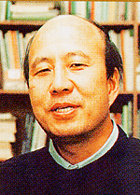
카르도조는 국회의 반대와 거리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정부`-`금융`-`연금`-`농지`-`의료 분야의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전화`-`전력`-`철강`-`가스`-`철도`-`은행 등 주요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단행했다. 그래서 그는 좌파로부터 다국적기업의 앞잡이, 우파로부터는 사회주의의 대변인이라는 상반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카르도조가 한국을 국빈방문한다.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구경제로의 통합을 강조하는 그의 시장친화적 정책처방이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분배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해 왔다.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와 다른 점이다. 그럼에도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그의 신자유주의로의 변신은 종속이론가로서 신식민주의와 타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카르도조의 고민은 그의 반대자들에 비해 지지자들이 조직화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그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민주적이다. 브라질의 정치는 인기영합적인 무책임한 민중주의(populism)와 엘리트 중심의 강압적인 권위주의 사이를 넘나들어왔다.
민주적인 국정운영·진솔한 리더십 ‘벤치 마킹’ 해야
그러나 그는 두 가지를 다 거부한다. 대체로 중남미 정치가 대통령의 힘이 과대하게 작용하는 위임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통상이라면 카르도조의 브라질은 예외다. 그는 카리스마에 의존하여 대중선전과 인기몰이를 하는 여느 대통령과는 확실히 다르다.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다른 열광적 후보들을 제치고 두 차례나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거짓과 위선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두 번에 걸쳐 민간정부를 경험했지만 우리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과신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를 위해 심신을 바친 투사의 이력치고는 국정운영 방식이 권위주의적이다. 법치는 인치에 가려 있고 통치가 협치(協治)를 누르고 있다. 여야가 뒤바뀌었다지만 꼼수와 숫자에 의한 정치는 변화없이 윤회(輪回)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독재자’가 나오게 된 까닭이 나라의 구조 탓인지, 민도와 문화가 낮아서 그런지, 아니면 지도자의 본성 때문인지 헷갈린다.
한국사회는 신뢰가 약한 사회다. 대통령이 원칙과 절차를 겉으로 말하면서 속으로 파행과 술수를 부리면 국민의 믿음은 깨지게 되어 있다. 카르도조가 제국주의 투항자라는 모욕을 받으면서도 브라질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성공한 것은 ‘강한 정부’가 아니라 그의 진솔한 리더십에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영상] “달러 투자는 가격 예측 빗나가도 이득… <br>달러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방어 효과”](https://dimg.donga.com/a/380/253/95/1/carriage/MAGAZINE/images/weekly_main_top/699bae1b11add2738e25.jpg)

![[영상] AI 반려로봇 88만 원… <br>마트에서 스마트폰 사듯 로봇 쇼핑한다](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8e/b9/cf/698eb9cf1c04a0a0a0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