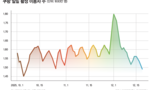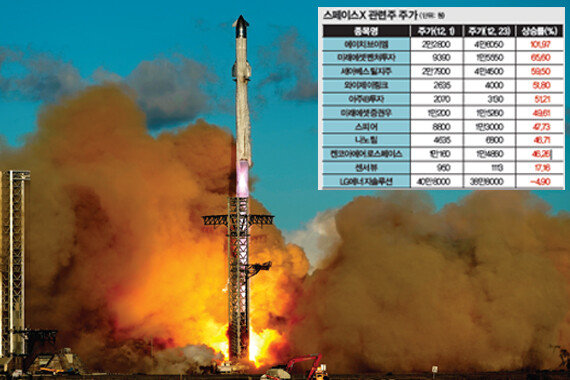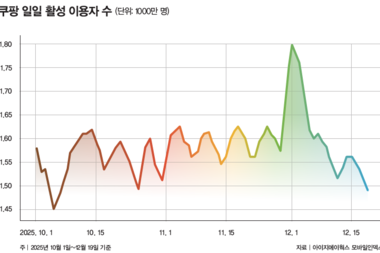‘백제화원’이라는 제목이 7세기경 고대 일본이 백제의 꽃밭이었다는 의미인 것처럼 ‘신라화원’도 백제에 이어 신라의 영향권에 있던 일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특히 ‘백제화원’은 각종 문물의 도래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언어와 일본어의 관계를 유추해 학계에서도 큰 반응을 일으킨 작품. 우다 씨는 ‘백제화원’의 후편 격인 ‘신라화원’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받던 신라인들이 백제를 극복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을 그렸다고 귀띔했다.
일본 전후세대인 우다 씨가 일본 속의 한국에 눈뜬 것은 고등학교 때 재일동포 친구를 사귀면서부터. 나라공대를 졸업한 후 소니사에 입사한 우다 씨는 평범한 엔지니어로 살아가던 중 재일 한국인 역사학자 김달수씨의 ‘일본 속의 한국문화’(한국어판 ‘일본 열도에 흐르는 한국혼’)를 읽고 자신이 배운 일본사가 엉터리였음을 깨닫는다. 그 후 일본고대사를 뒤집을 수많은 사료를 모으고 분석해 논문 대신 소설을 집필했다. 우다 씨는 일본인들이 애써 감추고 싶어하는 백제 도래설을 주장해 눈총받기도 했지만, 예상 밖으로 일본 중-장년층이 대부분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고 힘을 얻기도 했다. 그는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 마사코 왕세자비의 임신 발표와 맞물려 일본인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왜곡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역사 왜곡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예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사 부분에서요. 저는 창씨개명이나 명성황후 시해사건 등 한-일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이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