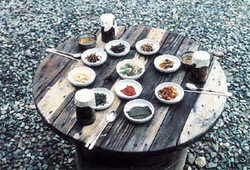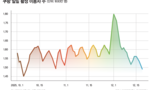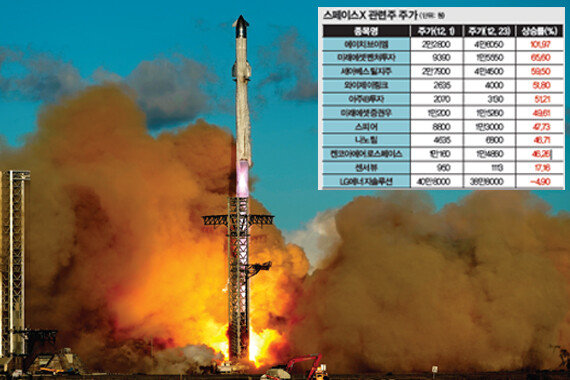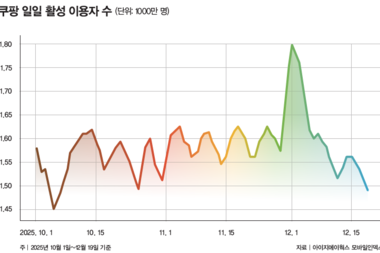음력 윤사월이면 이제 솔바람이 뜨기 시작할 때다. 대숲바람은 쇄락 청명하나 솔바람은 장중 은일하다. 산골짜기 천년송이 쳐보내는 솔바람이야말로 지지고 볶는 산해진미의 그 돼먹지 못한 음식상을 일격에 뒤엎고도 남는다. 벽곡( 穀:곡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밥짓는 굴뚝의 연기와는 일찍이 인연을 끊었던 신선(神仙)의 양식이었다.
이른바 선식(仙食)이요 생식(生食)이다. 그 대표적인 식이요법이 솔잎, 녹각운모 등이다. 이는 동양 최고의 의선(醫仙)이던 팽조(彭祖)의 식이요법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는 멀리 예를 들것도 없이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 따르면, 의병장 망우당(忘憂堂) 곽재우도 곡식을 완전히 끊고 하루에 송화 한 조각을 먹었을 뿐이다. 그러자 몸은 오히려 가벼워지고 기운이 펄펄 솟았다. 이는 연기(嚥氣)의 법을 얻은 때문인데 도가(道家)에서 전하는 음양의 양생법 중 하나다. 그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또 나도향은 ‘벽파상(碧波上)에 일엽주(一葉舟)’에 이렇게 썼다. 우주율을 타고 노는 낙랑장송의 ‘솔바람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태교 음악의 영약이 아닐 수 없다.
‘소나무에는 바람이 있어야 그 소나무의 값을 나타낸다. 허리가 굽은 늙은 솔이 우두커니 서 있을때는 마치 그 위엄이 능히 눈서리를 무서워하지 않지마는 서늘한 바람이 ‘쏴아’하고 지나면 마디마디 가지가지가 휘늘어져 춤을 추는 것은 마치 칡물 장삼의 소매를 이리 툭 치고 저리 툭 치며 신나게 춤추는 노승과 같아 몸에 넘치는 흥을 느끼게 한다’.
나는 2001년 5월9일 솔바람이 뜨는 좋은 일진을 골라 드디어 해발 8백 고지에 있는 그 마을의 천년송 아래서 태교의 솔바람을 맞았다. 그리고 와운산장(장판석)에서 아내와 함께 ‘송어회’를 먹으며 이런 농담도 했다. ‘오늘 솔바람 태교를 했으니, 용비늘을 뒤집어쓴 솔바람 같은 아이 하나 낳았으면 좋겠네요’. 히멀뜩 늙은 웃음결에도 그 천년송의 가지가 쳐보내는 솔바람이 ‘쏴아’ 쏟아졌다. 실제로 아내는 그 용비늘 한 조각을 뜯어와 냉수에 타 마시기까지 했다. 그 효험은 두고 볼 밖에.
다섯 아름이 넘는 이 천년송에 누워 있는 구름을 쳐다보며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송어(松魚)가 제 격이 아닐까. 그것도 무지갯빛 송어가 솔향이 돌고, 그 청랭한 붉은 살점과 푸른 솔바람은 멋과 맛과 메시지에서도 3합의 풍류가 딱 맞는 음식이다. 더구나 천년송의 솔바람을 타는 난향유곡(蘭香幽谷)임에랴! 또한 참취쌈에 곁들이는 고추냉이 알싸한 맛까지 혀 끝에 잦아드니 일품(一品)의 음식으로는 최상이다.
들통나면 단 한 그루밖에 없는 이 태교송(胎敎松)의 용비늘이 그날로 거덜날까 두려워 그 현장을 공개할 수 없음은 서운한 일이다. 삼척군 가곡면 동활리의 단 한 그루밖에 없는 황금사목송(黃金蛇目松 : 뱀눈솔-필자의 저서 ‘태산풍류와 섬진강’ 중 한국의 솔밭 참조)도 관광객들이 관상수용으로 꺾어가 죽고 말았음을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