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은 사람들이 인생의 황금기에 큰 배움을 얻고자 오는 곳이다. 대학이 대학다우려면 캠퍼스도 캠퍼스다워야 한다. 사람을 배려하고 자연과 역사를 존중하면서 따뜻하고 열린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바르게 배우고 참하게 자랄 것이다.
두근두근 설레는 서울여행, 이번에는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보자. 애인과 함께하는 데이트 코스로도, 입시를 앞둔 자녀와 걷는 가족 나들이 코스로도 좋다. 대학에 자녀를 보낸 부모라면 꼭 한 번은 그 학교에 가보자. 오늘은 요즘 보기 드물게 참한 캠퍼스 모습을 보여주는 서울시립대로 안내하고자 한다.
차보다 사람을 섬기는 캠퍼스
서울시립대 캠퍼스는 차보다 사람을 더 배려한다. 차는 바깥쪽 일방통행 차로로만 다닐 수 있고 안쪽에 자리한 교정 대부분은 보행 전용구역이다. 일방통행 차로는 폭이 좁고 휘어져 과속할 수 없다. 일방통행이니 학교를 빙 돌아야 다시 교문으로 나올 수 있어 차에겐 좀 불편하지만, 사람은 편안하고 쾌적한 캠퍼스를 맘껏 누릴 수 있다. 교문에서부터 제일 안쪽 기숙사까지 캠퍼스의 중심축과 주변 공간은 모두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천국이다. 보행자는 오가는 차 때문에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자동차 소음이나 매연 피해 없는 청정구역에서 편안히 걷고 쉴 수 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가운데, 아니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이처럼 사람을 깍듯이 섬기는 캠퍼스를 가진 곳이 또 있을까.
서울시립대 캠퍼스의 또 다른 매력은 역사와 기억을 잘 유지하면서 자연미를 살려 만든 풍경이 아주 빼어나다는 점이다. 1918년 경성공립농업학교로 시작해 서울농업대, 서울산업대 시대를 거쳐 81년부터 서울시립대라는 명칭으로 역사를 이어온 대학답게, 오래된 건물과 아름드리나무들, 옛 풍경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에 지은 경농관과 자작마루(옛 강당)는 옛 모습을 유지한 채 리모델링돼 서울학연구소와 박물관, 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서울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회가 잇따라 열리는데, 요즘에는 광복 직후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울, 1945’ 전시회가 한창이다.
농업학교로 시작해서인지 캠퍼스 안에 크고 멋진 나무가 많은 것도 볼거리다. 학생회관 앞 커다란 튤립나무 옆에는 캠퍼스의 아름다운 나무를 탐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게시판이 있다. 정문 안쪽 영산홍 무리에서 시작해 계수나무, 개잎갈나무, 메타세쿼이아, 살구나무, 낙우송, 수양벚나무, 백송 등 수령이 오래되고 수형 또한 아름다운 나무를 찾아보는 건 서울시립대 캠퍼스 투어의 별미다.

서울시립대 캠퍼스는 첫인상부터 여느 대학들과 달리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완만한 경사의 평지에 자리 잡아 산 아래나 언덕 위에 위치한 대학들과는 풍경이 사뭇 다르다. 고층건물보다 나지막한 건물이 많고, 붉은 벽돌을 담쟁이덩굴이 뒤덮은 정감 있는 옛 건물이 많은 점도 정취를 더한다. 조형관이나 21세기관처럼 새로 지은 고층건물도 저층부를 열어둬 시야를 가리지 않고 멀리까지 볼 수 있게 배려했다. 그래서인지 서울시립대 캠퍼스는 요즘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소로 애용된다. 드라마 ‘사랑하는 은동아’, 영화 ‘스물’ 등에서 배경으로 등장했다.
소풍 삼아 서울시립대 캠퍼스를 찾는 마을 주민도 많다. 이른 아침 줄지어 순환도로를 걷는 이들, 캠퍼스 잔디 위에서 뛰노는 아이들, 대강당 앞 꼬마자전거 행렬,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와 산책하며 쉬는 젊은 엄마들, 그리고 학교 건물 옥상정원까지 올라와 둘러보고 가는 어르신까지 캠퍼스 곳곳에서 이웃들을 만날 수 있다.
나는 이런 풍경이 참 좋다. 참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란 게 뭘까. 눈에 보이는 형태뿐 아니라 그 형태를 만든 마음의 아름다움도 있다. 같은 시설이나 공간이라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장소가 되고 미추가 바뀌기도 한다. 주민과 아이들이 편안히 오가는 캠퍼스 안에서 참아름다움을 새롭게 본다.
지역사회를 향해 활짝 문을 연 대학, 주민이 언제든 찾아와 공원처럼 이용하는 캠퍼스, 대학 구성원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는 대학, 그리고 그러한 대학을 내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키우는 지역사회, 이것이 곧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까.
서울시립대에서 올해로 3년째 이어지는 ‘따뜻한 서울 만들기’는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서로 다른 학과 학생 세 명 이상이 팀을 꾸려 제안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는 10개 팀을 선정해 각각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돈으로 학생들은 마을주민들과 함께 여행하고, 이웃을 위해 반찬을 만들며, 자존감을 잃기 쉬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나눔 실천을 한다.
서울시립대여도 좋고 다른 대학이어도 좋다. 대학 캠퍼스를 거닐면서 우리 마을 및 도시의 문제들과 희망을 새로운 눈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때 또 하나의 마을이자 도시의 축소판인 대학 캠퍼스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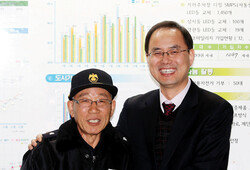












![[영상] “40년 반도체 인생에서 이런 호황은 처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내년 물량까지 거의 완판”](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9e/c9/f1/699ec9f112fd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