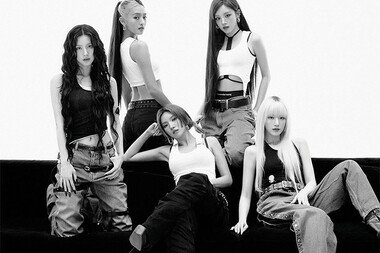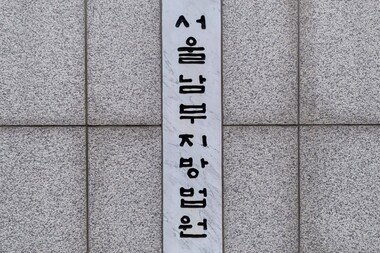4월15일까지 성곡미술관에서 열리는 ‘재현의 재현전’은 기존의 미술사(美術史)에 인용되었던 ‘패러디’개념을 통해 우리 시대 시각문화 속 재현의 문제를 논의한 전시다. 나아가 그저 작품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전시 자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간주하여, 동시대의 역사`-`이데올로기-미학적 담론 등을 재현하는 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을 모은다.
사실 미술사에 있어 조형적 재현과 언어 요소를 섞은 파울 클레나 유사와 재현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보고자 했던 칸딘스키 등 재현과 그것을 해석하는 언어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전시는 재현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온 미술사를 디지털시대의 재현의 관점으로 다시 보길 요구한다는 점에서 시대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게다가 이미 결정된 구조로 고착되었던 미술사를 지금도 끊임없이 운동하는 대상으로 간주하여 미술을 ‘읽고 쓰는’과정을 겸비해야 하는 하나의 텍스트로 본다는 점도 파격적이다.

영화와 드라마의 주인공을 자신과 교묘히 대체시켜왔던 강홍구는 흑백 모노톤의 풍경사진에 귤과 물고기 사진을 오버랩한 디지털 합성사진을 선보이고, 배준성 역시 사진 이미지와 그 위에 놓인 유리판에 그려진 이미지 사이의 간격을 보여준다. 서상아는 미술사로부터 알레고리를 차용한 뒤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알레고리를 중첩해 제3의 알레고리를 창출해내고, 우중근도 동일하게 미술사에서 나르시스(자기애)의 이미지를 발견한 뒤 또다른 나르시스를 이끌어낸다.
아톰과 미키마우스를 혼성한 아토마우스로 익숙한 이동기는 허구에 불과한 캐릭터가 사실을 압도하는 현실을 통해 혼성 문화의 시대를 재치 있게 반영하며, 종교화의 이콘을 매장에 진열된 상품 이미지와 겹치게 한 홍지연 역시 같은 맥락을 견지한다.
정주영은 김홍도와 정선의 작품 일부분을 차용한 뒤 확대-해체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작품을 선보이고, 김재웅 역시 김홍도와 신윤복의 전통 풍속화를 20세기 초 독일의 표현주의 작품과 오버랩시켜 제3의 리얼리티를 조작해낸다. 이 외에도 주문 제작된 조각상이 갖는 이미지의 저작권에 의문을 제기한 김창겸, 앵그르의 ‘욕녀’, 마르셀 뒤샹의 ‘샘’ 등 서양미술사를 풍미한 유명한 작품을 차용해 자신만의 퍼포먼스로 엮은 박혜성의 작품도 재현의 다양한 방식을 참신하게 선보이고 있다(문의 02-737-7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