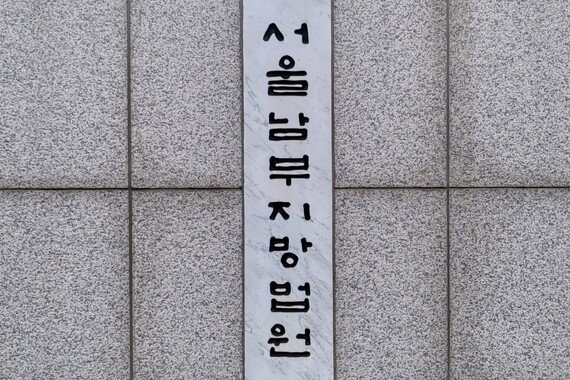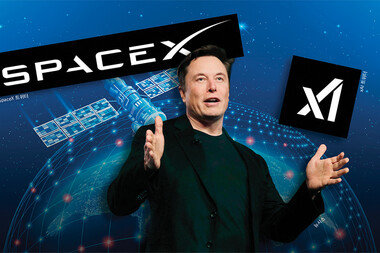1939년 9월 1일 독일은 전격적으로 폴란드를 침공했다. 그 얼마 후를 배경으로 양국의 축구경기를 그린 만화를 본 적이 있다. 만화의 내용은 이렇다. 1938년 프랑스월드컵 때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혼자 4골을 넣은 에르네스트 빌리코프스키(1916~97)를 비롯한 폴란드 용사들은 독일군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은 채 조국에 떳떳한 마음을 가지려고 경기에 최선을 다한다. 온갖 악조건에도 승리를 거두지만 선수 전원 총살당하는 비극을 맞이한다.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만화 내용이 말해주듯, 폴란드와 독일의 국가 대항전은 이런 역사적 아픔 때문에 한일전을 연상시킨다.
1871년 발표한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은 교과서에 오랫동안 수록된 탓에 우리나라 사람도 잘 아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프로이센-프랑스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하면서 주인이 바뀌는 알자스로렌 지방이 무대다.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시간에 “나는 프랑스 사람이다”를 독일어로 말하면 “나는 독일 사람이다”가 된다고 말하는 장면은 무척 인상적이다.
이렇듯 유럽 국가의 접경 지역은 주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양국의 정치·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속 국가가 종종 바뀌곤 했다. 폴란드는 독일과 국경이 맞닿아 있고 민족의 분포와 국경이 서로 부합하지 않아 예로부터 독일이나 폴란드로 소속 국가가 바뀌는 지역이 여럿 있었다. 그러다 보니 독일계 폴란드인, 폴란드계 독일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상당수 생겼다.
위에서 언급한 빌리코프스키도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는 폴란드 국적을 지닌 독일계 폴란드인이었다. 집에서는 독일어를, 학교에서는 폴란드어를 사용했다. 전쟁 나흘 전까지도 폴란드 축구 국가대표로 활약했지만, 독일 점령 하인 1940년부터 43년까지는 독일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양국 접경 지역의 복잡한 역사와 그 역사가 만들어낸 집안 내력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국적 문제를 둘러싼 빌리코프스키의 아픈 계보는 독일 국가대표인 미로슬라프 클로제(SS라치오)와 루카스 포돌스키(FC쾰른)에게로 이어진다. 우리는 독일 국가대표 포돌스키가 유로2008 B조 폴란드전에서 2골이나 넣고도 고개를 숙이던 모습을 기억한다. 두 사람은 폴란드와 독일의 접경 지역인 오베르슐레지엔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독일로 이주했다. 세상 사람의 입에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폴란드는 그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고민 끝에 폴란드의 제안을 거절했다.
우리는 폴란드계 독일인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다. 특정 국가의 관점에서 그들을 비애국적인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충성(リタダナリ·산프레체 히로시마) 선수가 호주에서 열린 2011 AFC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연장결승골을 넣어 일본에 우승컵을 안겨줬던 장면이 떠오른다.
 재일교포 4세인 이충성은 2004년 U-19 대표선수로 파주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유도의 추성훈 선수처럼 고국에 대한 실망만 안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폴란드계 독일인인 클로제와 포돌스키의 활약을 두고 폴란드 언론에선 “폴란드가 없었으면 독일 대표팀은 대단하지 않았다”고 평했다는데, 한국 언론에선 제발 이런 소아병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재일교포 4세인 이충성은 2004년 U-19 대표선수로 파주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유도의 추성훈 선수처럼 고국에 대한 실망만 안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폴란드계 독일인인 클로제와 포돌스키의 활약을 두고 폴란드 언론에선 “폴란드가 없었으면 독일 대표팀은 대단하지 않았다”고 평했다는데, 한국 언론에선 제발 이런 소아병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 황승경 단장은 이탈리아 노베 방송국에서 축구 전문 리포터로 활약한 축구 마니아다.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만화 내용이 말해주듯, 폴란드와 독일의 국가 대항전은 이런 역사적 아픔 때문에 한일전을 연상시킨다.
1871년 발표한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은 교과서에 오랫동안 수록된 탓에 우리나라 사람도 잘 아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프로이센-프랑스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하면서 주인이 바뀌는 알자스로렌 지방이 무대다.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시간에 “나는 프랑스 사람이다”를 독일어로 말하면 “나는 독일 사람이다”가 된다고 말하는 장면은 무척 인상적이다.
이렇듯 유럽 국가의 접경 지역은 주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양국의 정치·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속 국가가 종종 바뀌곤 했다. 폴란드는 독일과 국경이 맞닿아 있고 민족의 분포와 국경이 서로 부합하지 않아 예로부터 독일이나 폴란드로 소속 국가가 바뀌는 지역이 여럿 있었다. 그러다 보니 독일계 폴란드인, 폴란드계 독일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상당수 생겼다.
위에서 언급한 빌리코프스키도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는 폴란드 국적을 지닌 독일계 폴란드인이었다. 집에서는 독일어를, 학교에서는 폴란드어를 사용했다. 전쟁 나흘 전까지도 폴란드 축구 국가대표로 활약했지만, 독일 점령 하인 1940년부터 43년까지는 독일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양국 접경 지역의 복잡한 역사와 그 역사가 만들어낸 집안 내력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국적 문제를 둘러싼 빌리코프스키의 아픈 계보는 독일 국가대표인 미로슬라프 클로제(SS라치오)와 루카스 포돌스키(FC쾰른)에게로 이어진다. 우리는 독일 국가대표 포돌스키가 유로2008 B조 폴란드전에서 2골이나 넣고도 고개를 숙이던 모습을 기억한다. 두 사람은 폴란드와 독일의 접경 지역인 오베르슐레지엔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독일로 이주했다. 세상 사람의 입에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폴란드는 그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고민 끝에 폴란드의 제안을 거절했다.
우리는 폴란드계 독일인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다. 특정 국가의 관점에서 그들을 비애국적인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충성(リタダナリ·산프레체 히로시마) 선수가 호주에서 열린 2011 AFC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연장결승골을 넣어 일본에 우승컵을 안겨줬던 장면이 떠오른다.

* 황승경 단장은 이탈리아 노베 방송국에서 축구 전문 리포터로 활약한 축구 마니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