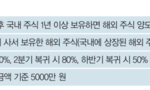해발 3500m 정상 람주라에서 필름을 교체하려 해도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손이 곱았다.
산행 시작 네 시간 20분 만에 해발 3500m의 람주라(Lamjura)에 도달했다. 땅은 얼어 있었고 반팔로 출발한 나의 팔도 붉게 얼어버렸다. 그러나 체력 소모로 무기력해진 나는 꽁꽁 언 고지를 반팔 차림 그대로 넘어버렸다. 배낭 속에서 긴팔 옷을 꺼내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정상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고도 필름을 교체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까. 조금이라도 빨리 아래의 따뜻한 곳으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정상을 벗어나자 기온은 다시 포근해졌다. 그리고 이후 준베시까지의 구간은 이번 트레킹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가운데 하나였다. 먼저 나타난 구간은 하늘이 보이지 않는 울창한 숲이었다. 단순히 나무만 울창한 숲이 아니라 흐르는 물 때문에 생동감이 넘치고 신선함이 가득한 숲이었다. 마치 촉촉함을 강조하는 화장품 광고에 등장하는 숲의 모습과 흡사했다. 사실 에베레스트로 향하는 길에서 숲을 만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 황량함이 느껴지는 민둥산이며, 나무가 있는 구간을 걷는다 해도 11월의 에베레스트는 건조하기 이를 데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숲을 지날 때는 다른 세계로 들어선 느낌이었다.
숲을 벗어나자 다시 민둥산이 나타났지만 사흘 동안 오르막과 내리막만 있었던 것과 달리 처음으로 능선을 따라 걷는 코스였다. 건너에도 산이 있었고, 멀리 앞에도 산이 자리잡고 있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높이를 가늠할 수는 없었지만 세상 모든 것을 다 품겠다는 듯 장엄하고 평화로웠다. 산을 오를 때는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 힘들고, 내려갈 때는 발길을 살피느라 다른 곳에 눈 돌릴 여유가 없었다. 평지와 다름없는 능선을 걷는 순간에야 비로소 히말라야의 깊은 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길게 이어진 능선은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라도 되는 듯 이쪽 산허리에서 저쪽 산허리까지 꼬리를 물고 있었다.
아무 걱정 없이 사는 행복한 모습 어디서 오는가
그 순간이 무척 소중해서 두세 평 크기의 너럭바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마르지 않은 채 배낭에 들어 있던 빨래를 바위에 널고, 신선처럼 누워 비상식량으로 준비한 크래커와 육포를 뜯어먹었다. 하늘을 닮은 바람과 동쪽에서 몰려와 앞산 머리에서 흩어지는 구름. 조금씩 말라가는 빨래와 길게 이어진 능선. 이 넓은 세상을 혼자서 소유한 느낌이었다.
그 모든 정적을 깬 것은 한 마리의 말이었다. 어디선가 말 울음소리가 들려와 뒤를 돌아보니, 머리 위 언덕에서 말 한 마리가 내려오다 나를 발견하고는 주춤했다. 내가 움직이자 놀란 녀석이 어디론가 숨어버렸지만, 잠시 후 다시 나타난 놈은 내가 갈 길을 먼저 걸어가서는 저만치 아래로 사라졌다. 당연히 야생은 아닐 것이고 방목 중인 말이 길을 잃었거나 저 혼자 너무 멀리 나온 것일 터다.

구김없이 밝은 미소를 짓는 한 소녀의 모습에서 잠시나마 아늑한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
집에는 늙은 부부와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함께 살고 있었다. 아이가 손녀인지 늦게 얻은 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노부부의 모습은 인자했고 아이는 밝고 구김이 없었다. 방을 구하고 식사를 주문했다. 아이는 노부부를 돕기 위해 뒷마당에서 한아름의 장작을 가져왔다. 화덕에 불이 지펴졌고 장작 난로도 따뜻하게 실내를 달궈주었다. 창밖 화단의 꽃들도 늦은 오후의 빛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과 몸짓, 한가롭고 소박한 주변 풍경은 아름다운 동화나 다름없었다.
마음 같아서는 하루 더 묵고 싶은 집이었지만 갈 길이 바빠 다음 날 아침 배낭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다. 언덕을 내려가고 다시 언덕을 오른 뒤 문득 뒤를 돌아봤다. 건너편 산등성이에서 작은 집 한 채가 아침 빛을 받으며 밝게 빛나고 있었다. 멀리서 보아도 아름다운 집이다. 나는 그들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궁금했다. 버스가 닿는 곳으로는 가장 깊숙한 산속에서 시작한 트레킹이 나흘이 넘었다. 설령 그들의 발걸음이 나보다 빠르다 한들 그들 역시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나흘은 걸어야 한다.
컴퓨터는 고사하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도 없으며, 세탁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다. 만약 급한 환자라도 생긴다면 버스를 타기 위해 꼬박 사나흘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 아무리 봐도 모자람투성이인 그들이다.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과 풍요로워도 부족한 사람들. 행복이 소유와 무관하다고 말한다면 거짓일 것이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비례한다고 믿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제 먼지를 털듯 미련과 욕심을 벗고 내 길을 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