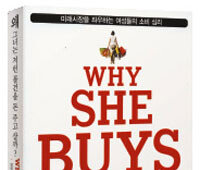J. 스콧 버거슨과 친구들 지음/ 은행나무 펴냄/ 433쪽/ 1만5000원
J. 스콧 버거슨. ‘발칙한 한국학’을 비롯, 국내에서만 벌써 3권의 베스트셀러를 낸 미국인이다. 이번에 출간한 ‘더 발칙한 한국학’은 자신의 목소리뿐 아니라 재미있는 경험과 프로필을 가진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독특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냈다. 한국에서 그들이 겪은 유쾌한 모험담부터 저자와 마찬가지로 10년 넘게 이곳에서 지내며 한국인보다 한국을 잘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외국인들의 파란만장한 인생사 인터뷰, 한국에 독특한 발자취를 남긴 외국인들의 특별기고문, 그리고 ‘발칙한 문화비평가’ J. 스콧 버거슨의 신랄하지만 애정 어린 비판이 담긴 에세이 등이 펼쳐진다. 참고로 ‘엑스팻’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expatriate)을 부르는 말. 한국에 온 뒤 이 땅의 이상하고 독특한 매력에 사로잡혀 떠나지 못하고, 혹은 떠났다가도 되돌아오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내 생각에 정말로 글로벌화한 한국이란, 모든 한국인이 영어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 정반대로 그것은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택하고 여기서 삶을 꾸려감을 뜻하며, 결과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욕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진정한 세계화란 두 갈래 길이다. 안 그런가? 실제로 오랫동안 이방인으로 산 내 처지에서는, 확실히 내가 동네 가게나 식당에 들어갔을 때 직원들이 자동적으로 영어로 말 거는 것이나 자기네들이 멋대로 바꾼 영어, 그러니까 반말이라기보다는 예의 없는 말투로 말 거는 것 둘 다 주제 넘는 일이고 피곤한 일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물어본다. (물론 한국어로) ‘왜 영어로 말해요? 여기 어느 나라예요? 영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여기 한국 아니에요?’”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외국인들은 더 이상 익명의 존재나 외국인으로 취급받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웃사이더가 아닌,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적 삶을 택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불필요한 구분을 만드는 ‘외국인’보다는 이 땅의 ‘엑스팻’으로 불리길 바라며,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외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전해질 때마다 그들의 존재는 더 낯설고 위협적으로 변질된다.
그래서 이 책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한국인들의 이해와 사랑이다. 서로 다른 생김새, 언어와 문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관용(tolerance)을 원한다. 우리를 갈라놓는 벽보다는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 좋은 세상이란 무엇일까. 이 책을 통해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한국 땅에 국적을 넘어선 진정한 세계화와 다문화가 완성되는 것이다. 저자 스콧은 스스로를 ‘문화혁명가’ ‘문화건달’로 부른다. 누구보다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하는 그는 다양한 문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 진정한 휴머니즘이 뿌리내리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강조하는 문화는 주류나 대중보다 얼터너티브(alternative) 문화를 의미한다. 홍대를 중심으로 한 펑크음악이나 살사댄스처럼 대중적 관심과 거리가 있는 예술과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함께 즐김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는 한층 가까운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
“처음에 나는 이 나라를 떠나기 전 ‘한국의 외국인들’에 대한 마지막 책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저 내가 한국에 조금도 ‘악감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즐겁고’ ‘즐길 수 있는’ 책으로 만들고 싶었고, ‘좋은 감정’과 ‘더 나은 이해’를 곳곳에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랐다. (중략) 이 책은 인간이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쓴 책이다. 이 책은 내가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내 삶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많은 외국인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말한다.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지라도 남의 눈에 내가, 남들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치는지 이 책을 통해 들어보고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