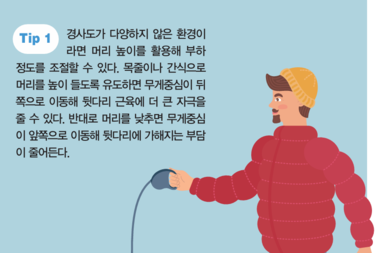나는 어느 편인가. 왜 이리 성급하냐면, 요즘 문화계 안팎의 논란에 참여할 경우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이분법 논리에 설 수밖에 없는 탓이다. 회색의 중립지대는 도무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 나도 시류를 좇아 선명한(?) 입장을 과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날 친일파 청산을 강하게 앞세우는 주의·주장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 넘는 실력 갖추면 ‘친일파 청산’ 저절로
그럼, 나는 친일파 옹호자인가. 과거 청산에 반대하는 이른바 보수반동인가. 글쎄, 내 입으로 ‘아니다’라고 말해봤자 상호 적대감이 팽배한 논쟁 풍토에서는 별로 신뢰가 안 갈 터. 아예 나를 포함해 집안 내력을 샅샅이 검증, 조사해보시라. 이런저런 청문회에 불려갈 만큼 잘난 집안도 아니니 별문제는 없으렷다.
최근에 나는 일본을 다녀왔다. 개인적으로 일본 학계의 동향을 가늠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경술국치일을 하필이면 일본에서 맞이했으니 나의 ‘민족의식’이 그리 단단하지 못했던가 보다. 어쨌거나 도쿄 시내의 책방을 둘러보는 게 주된 일과였는데, 하루는 일본 신문의 책 소개란에서 김완섭씨의 문제작 ‘친일파를 위한 변명’(草思社)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음을 발견했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긍정적인 면을 바로 보자’라고 역설하는 그 책의 저자가 한국 젊은이, 그것도 익히 알 만한 친구였음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한국에서 2월에 출간된 책이 불과 5개월도 안 되어 일본말로 번역되었다? 일본의 속 좁은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던 차에 다른 신간이 눈길을 끌었는데, 최길성씨(히로시마대학 교수)의 ‘친일과 반일의 문화인류학’(明石書店)이 그것. 그는 한국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간 인류학자다. 그의 책 서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 학계의 풍토에서는 일본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어렵다, 우리 국민의 강한 반일감정은 해방 이후 교육과정에서 재구성, 강화된 면이 크다, 그간의 친일 논쟁은 다분히 국내용이다 등등.’
‘우리 학계에서는 일본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어렵다’는 술회는 한갓 변명으로 치부해도 좋으리라. 하지만 내가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느낌이 든 것은 바로 ‘친일 논쟁은 국내용’이라는 대목에서였다. 그토록 일제 시대의 지배세력이 절대 악이라면, 그 주체인 일본에 대해서는 왜 직접 칼날을 겨누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 내부에서만 ‘너, 친일파였지, 친일파의 후예지’라고 다그칠 뿐인가라고 그는 묻고 있었다.
그렇다. 작금의 친일파 청산 논쟁은 다분히 우리네 현실정치의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탓에 생산적인 결론을 얻기 힘들다. 청산론자든 그에 반대하는 보수반동 세력이든 한마디로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것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당분간 친일파 청산 문제는 역사학계 내부의 학문적 과제로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일반 사회는 그네들의 역사적 평가를 좀더 느긋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과거 청산이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럼, 묵묵히 기다리면 만사형통이란 말인가. 물론 아니다. 일본의 힘과 문화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른바 극일의 실력과 내공을 갖추는 일, 이것만도 만만한 일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실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의 친일파 청산’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