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는 대성공. 새삼 ‘나눔의 미학’이 칭송되는가 하면,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재산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교육철학이 회자되기도 했다. 정부는 강씨의 아름다운 기부를 계기로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현재 기업법인세 5% 감면, 개인소득세 10% 감면)을 두 배로 늘리고 기부자에 대한 정부 훈·포장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단국대 이용우 총장은 “부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다”며 강씨에게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어떻게 쓸지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갑작스러운 거액 기탁 제의에 당황한 쪽은 KBS였다. 강씨가 처음 ‘사랑의 리퀘스트’팀에 전화를 걸어온 후 기탁 절차를 준비한 KBS 예능국 이문태 주간은 “너무 큰 액수여서 듣고도 긴가민가했다. 실례를 무릅쓰고 직접 강씨가 요양중인 제주도로 날아가 200억원을 예치한 은행에 전화를 걸어 녹취하기까지 했다”고 말한다. “강선생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순수한 뜻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쪼개 써버리는 대신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기금을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부문화는 돈을 내놓기에 바빴지 어떻게 기부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사실 척박한 한국의 기부문화에 토대를 만든 것은 평범한 할머니들이었다. 12년 전 한국 기부문화의 이정표가 됐던 ‘김밥 할머니’ 고 이복순씨(1992년 11월 타계). 그는 39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김밥 행상을 하며 번 돈으로 조금씩 땅을 사둔 것이 부동산 개발 붐을 타고 50억원 상당의 큰 재산이 되자 외아들에게 상속하는 대신 충남대에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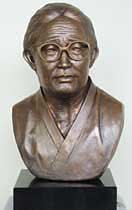
그러나 이제 일회성 기부보다 정기적인 기부로, 즉흥적 기부 대신 계획적인 기부로 기부문화를 한단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름다운 재단’의 공미정 모금부장은 “음성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즉석 소액 기부가 널리 퍼지면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일시적이고 감정적 차원의 기부를 하고 있다”면서 “기부의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꾸준히 기부하는 쪽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는 말이다.
‘기부정보가이드(상자기사 참조)’를 운영하고 있는 정선희씨는 기부를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했다. 첫째 걸인에게 적선하는 것처럼 단순히 주는 행위, 둘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동정적이고 감정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자선 행위, 셋째 깊은 인간애에서 비롯된 계획적인 박애활동이 그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수준을 넘지 못하는 한국의 기부문화는 여전히 단순 기부나 자선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7월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은 한국과학기술원에 사재 300억원을 출연하면서 향후 2개월 안에 보유주식 등을 팔아 3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IT, BT 분야를 지원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 달 남짓 정회장의 출연을 준비했던 손광운 변호사는 “기부라는 ‘액션’에 들어가기 전에 재산관리 방식, 재산관리의 주체, 출연 절차, 기부 목적 등을 분명히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아름다운 재단(www.beautifulfund.org)은 현재 완전적립형기금, 부분적립형기금, 사용 후 소멸기금 등 세 가지 분야에서 30여 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다양한 기금들은 당장 나누어 쓰기보다 일정 액수까지 모금한 뒤 그 수익을 가지고 배분하는 경우가 많아 기금 조성에서 배분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상외로 길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재단은 “돈을 쌓아두고 나눠주는 데 인색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공미정 부장은 “왜 재단이 수재민돕기에 나서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목적 기탁의 경우 재단 임의로 사용처를 정할 수 없다. 앞으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할 때 즉시 전달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기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돈은 벌기보다 쓰기가 어렵다고 말들 하지만, 기부 역시 결심하기보다 제대로 기부하는 일이 더 어렵다.
기부라는 아름다운 행위를 위해서도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기부할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충동 기부보다 계획적 기부가 더 큰 힘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