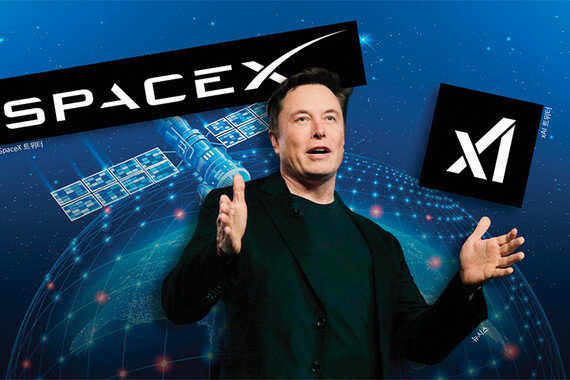옛 어른들은 새해의 덕담을 언제나 현재완료형으로 했다. 내일의 좋은 일을 미리 짐작해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는 “아이구, 득녀를 축하하네”라 하고, 혼기가 된 미혼의 선남선녀들에게는 “그래, 결혼을 축하하네”라고 기정사실화했다. 말하자면 시간 초월의 덕담과 더불어 기분 좋게 새해를 맞이한 것이다.
나도 앞마당의 겨울 매화나무에게 다가가 속삭이듯 덕담을 해본다. “매화나무야, 축하해. 네가 북풍한설을 이기고 꽃을 피우니, 온 마당이 흰빛의 향기로 환하구나.” 이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봄바람이 불어와 매화 나뭇가지를 흔들고 내 마음속의 청매·백매·홍매의 꽃망울들이 사르르 눈을 뜬다. 주문 같은 덕담 한마디에 봄이 성큼 다가서는 것이다.
매실주 담그는 마음으로 세상 보면 사람 향기 솔솔
섬진강의 황어떼를 따라 지리산에 봄이 오면 나는 미점마을로 간다. 매화마을보다 더 고적한 이 마을의 매화나무 꽃 그늘에 앉아 굽이굽이 섬진강을 내려다본다. 바람에 흩날리는 매화향에 온몸을 내주고 있으면 어느새 매실주에 취한 듯 몽롱해지며, 평사리 들녘을 선회하는 솔개나 패러글라이더가 된다. 꽃을 보며 매실을 생각하고, 급기야 매실주가 익을 무렵을 생각하면 또 한 해가 시큼해지고 넉넉해진다.
술을 담근다는 것은 한 포기의 꽃을 심거나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기다릴 줄 아는 마음 때문일까. 기다림의 여유를 깨우치고 나면 나날이 서두를 게 없고, 마음의 병도 생기지 않는다. 술이 익는 동안 그토록 격하던 마음마저 서서히 발효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몇 가지 과실주를 담갔다. 봄에는 매실주를 담그고, 여름엔 비파주를 담그며 술병에다 날짜와 이름을 써넣었다. 매실주엔 지리산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주 얼굴이 어른거리는 그리운 이들의 이름을 써넣고, 지리산에 단 한 그루밖에 없는 매암 차문화 박물관의 비파를 따다가 담근 술에는 해가 바뀌기 전에 꼭 만나고픈 이들의 이름을 써넣었다.
물론 그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다. 그들에게 한 번도 알리지 않고 나 혼자 그리운 이름을 써넣으며 좋은 기억들로 술을 담그기 때문이다.
추석 직후에는 빨치산 총수 이현상이 사살된 빗점골에 가서 다래를 따와 술을 담그고, 섬진강변 마고실의 옛집 마당에 파라솔처럼 자란 어름나무에서 열일곱 개의 어름으로 술을 담갔다. 그때도 술병에 날짜와 이름들을 써넣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원로 시인의 이름도 써넣고, 만나지 않아도 언제나 마음이 훈훈해지는 선배 문인과 서울에서의 술 친구 이름도 써넣었다. 동시대의 한 하늘 아래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사람들의 이름 사이에 이승의 악연이랄 수밖에 없었던 이름들도 슬며시 끼워넣었다.
그 누구도 나의 술병에 자신들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또 알 필요도 없다. 단지 술이 익어가는 동안 굳이 만나지는 않더라도 나와의 관계 또한 술처럼 발효될 것이기 때문이다. 애써 초청하지 않더라도 술은 익어가고, 행여 내가 그들을 까맣게 잊은 날도 술은 익어갈 것이며, 나 혼자 그리움에 절절 매더라도 술은 익어갈 것이다.
아직 매화는 피지 않았지만, 새해에도 매실주를 담글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술을 담그는 마음으로 살 것이다. 그 술을 누가 마신들 무슨 상관인가. 살다보면 악연마저도 오래 묵은 발효된 술이 되어 숙명적인 인연이 될 수 있으리라.
술병 속에서 과실주가 발효되듯이 우리의 인간사도 우주의 아주 작은 병 속에서 발효되고 있다. 우리는 모두 걸어다니는 매실주요, 모과주요, 머루주다. 세상을 둘러보면 발효의 시간 속에서 나날이 향기 그윽해지는 사람들이 새해 아침을 맞고 있다.